-

-
인문학의 미래 - 비전을 만드는 인문학, 가르치고 배우기
월터 카우프만 지음, 박중서 옮김 / 반비 / 2022년 2월
평점 :



“만약 인문학 분야의 사람들이 목표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해야 한단 말인가?”
“미국에서는 그 전환점은 2차 대전 이후 매카시 시대와 겹쳤는데, 그 시기에는 합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학술적이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해졌다. 슬픈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심한 타협주의자였다. (...) 하지만 현학주의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런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차 대전 이후에 고등 교육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에게 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즉 고등 교육은 더 이상 소수만이 누리던 특권이 아니었으며, 무척이나 경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오히려 갑자기 다수의 새로운 교사가 필요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는 무한히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고 반-소크라테스적이 되었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해서, 교수들은 간행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둘 중 어느 쪽도 소크라테스적 질문을 위해 남겨둘 시간이 많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시험 준비를 시키지 않은 것은, 그리고 아무것도 간행하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독일의 박사 논문이 학술지의 모범이 되었다. 즉 지식에 기여해야 한다고만 했지 소크라테스적이어야 한다고는 간주하지 않았다. 교수 대부분은 큰 기여를 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현미경주의가 크게 늘어났다.”
“우리는 반드시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해야 하며, 텍스트의 남다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려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텍스트가 우리에게 도전을 제기하도록, 충격을 주도록, 거스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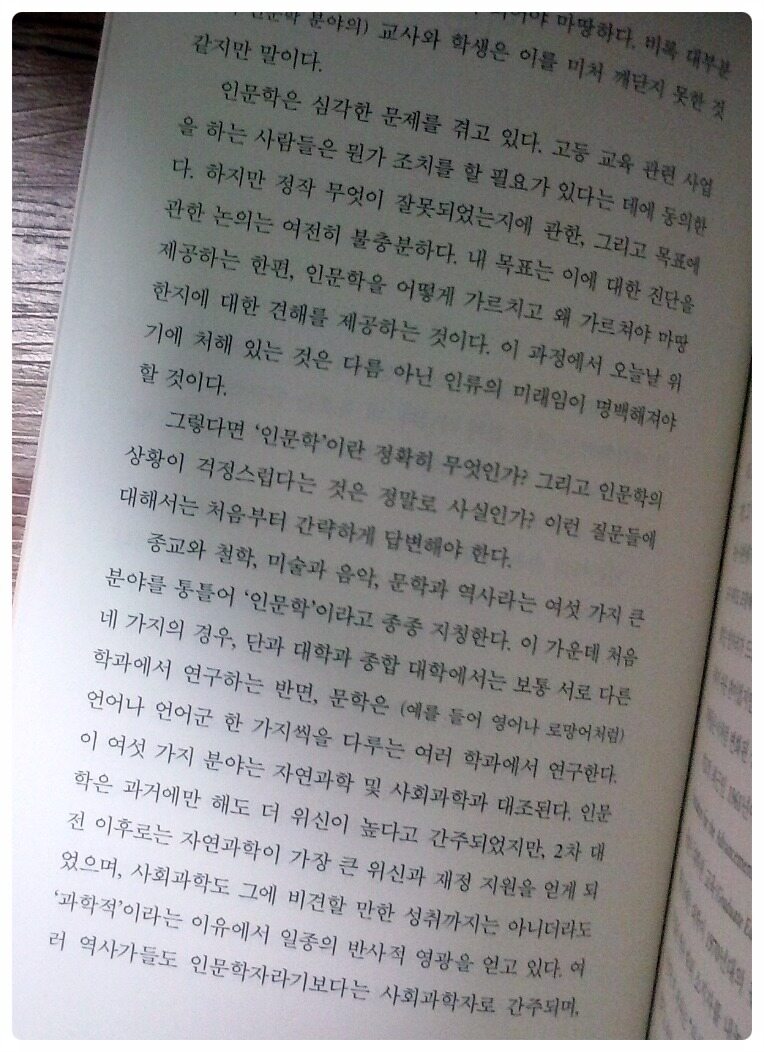
존립이 불안할 때는 당위를 강조하게 마련이다. 어느 분야이든 대상이든 마찬가지이다. 인문학에 대한 논의가... 내가 기억하는 것만 몇십 년째 위기와 의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인문학은 몹시 위태로움이 분명하다.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란 구절을 보고 인문학은 언제 왜 길을 잃었을까... 심각하게 궁금해졌다. 내 연구 분야도 아니고 밥벌이도 아니니 태연히 거대담론을 주억거리며 수긍하며 지켜보는 것 말곤 한 게 없다.
지금 누가 우주공학과 산업 공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있다 해도 세부논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공학이 아닌 기초과학을 전공한 나는 얼마간은 인문학과 관련된 고민에 공감할 수 있다.
저자의 담론의 신선함은 인문학, 인간성, 삶, 미래 구원 등등의 익숙한 관계들로 인문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 그런 근사하고 공허한 이야기는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한국의 철학관으로 축소될 수 없듯 인문학도 효용성으로 평가되어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 글의 매력은 대중서이면서도 학술서로서 저자가 독자를 인문학 전공 학생, 인문학자, 인문학 독자들로 규정한다는 점에도 있다. 논문 읽기에 익숙해서인지 논리적 맥락을 긴장되게 유지하는 글이 무척 매력적이다. 완결적 구성이 집중과 몰입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완독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선견자, 현학자, 소크라테스, 언론인 유형으로 분류된 교수들
! 한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 전작들, 그가 속한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
! 진실을 담기 어려운 서평
! 읽기 능력 부족으로 왜곡된 번역과 편집
! 종교의 의미
일독 후 21세기의 독자로서 20세기 작가의 질문에 자신의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읽기를 점검해본다.
“그래서 인문학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