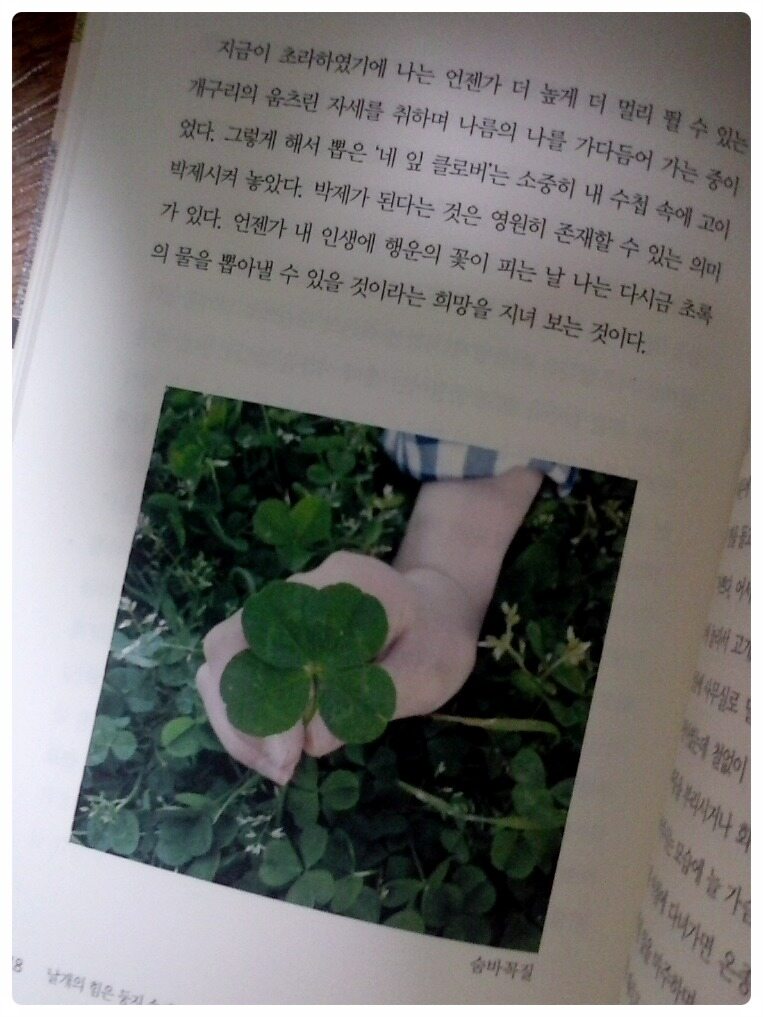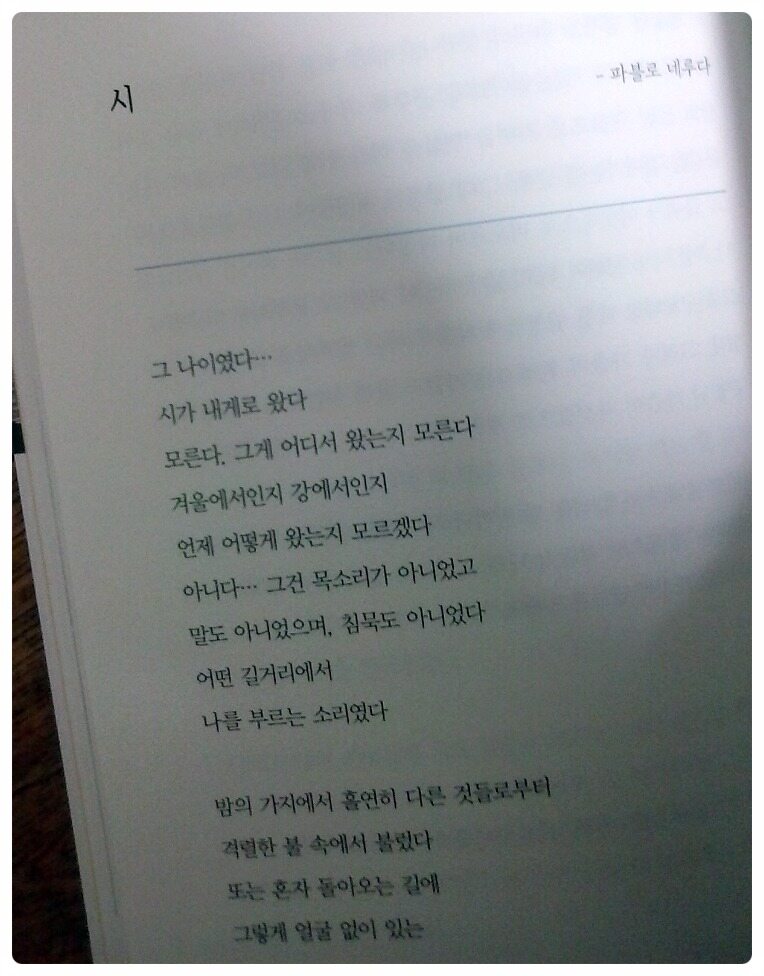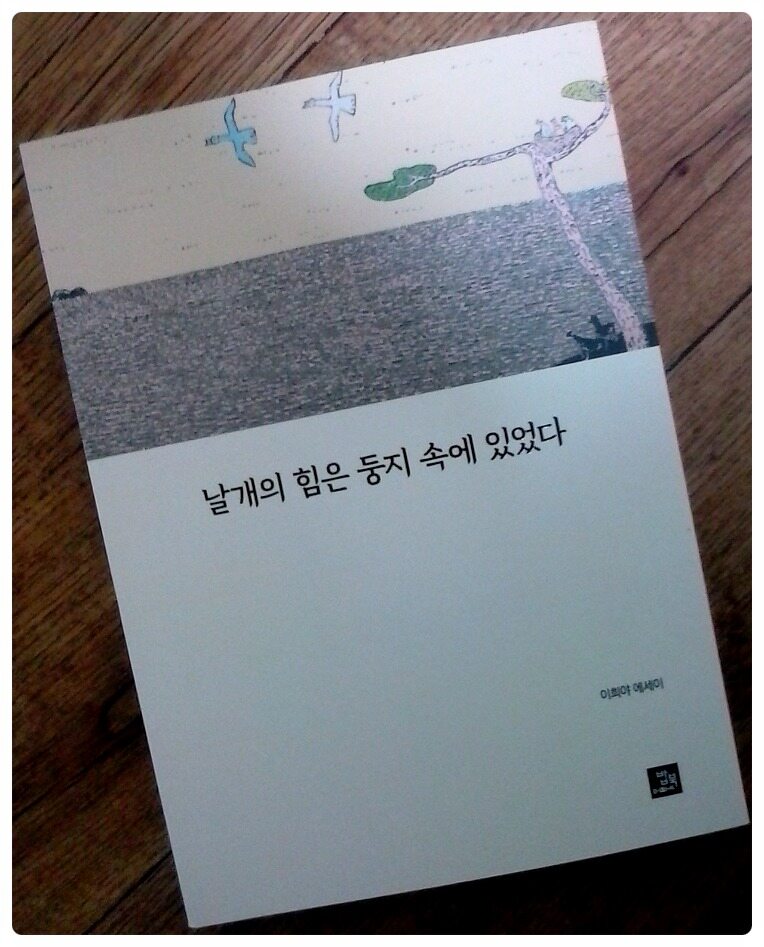-

-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이희야 지음 / 밥북 / 2022년 4월
평점 :



별세계의 시집을 보고 난 후 펼친 에세이에 별천지가 있다. 이런 우연은 즐겁다. 책을 뒤적거리며 조용히 보내는 주말이 좋다. 이희야 저자가 자신의 삶을 연대기도 아니고 사건 중심도 아닌 잔잔한 이야기들로 펼쳐서 참 편안하게 읽었다.
눈에 띈 아름다운 것들의 사진들도 반가웠다. 의도한 것인지 많은 것들이 봄의 풍경들이라 며칠 전 산책에서 내가 만난 고양이, 민들레 홀씨, 클로버, 개구리, 숲의 모습이 떠올랐다. 산책과 독서로 채워지는 일상이 갖고 싶다. 누가 줄 것도 아니니 원하면 내가 마련해야겠지.
한편으로는 내 일상의 풍경과 여러 접점이 있는 듯도 한 글 속에는, 전혀 모르는 시절처럼 만나는 삶의 면면들도 많다. 깜짝 놀라서 저자의 연배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도 했다. 숫자로 보자면 작은 나라, 적은 인구인데 각자의 삶의 풍경은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과의 만남, 사랑, 이별이 교감이 강한 이야기로 담겨 있어, 그런 것들이 간절한 나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릴 적 만난 소나무에게 뒤늦게 전하는 인사는 아련하고 그리웠다. 생각만 해도 그리운 나무들이 내게도 있다.
어릴 적 본가는 집성촌에 위치한 오래 된 기와집이었음에도 나는 우물에 대한 기억은 없다.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가장 오래된 그 집에서의 물에 대한 기억은 펌프니까. 그래서 까치발을 세워 우물 속 달을 구경했다는 얘기에 부러웠다. 어떤 반가움일까.
동네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물을 일 년에 한 번씩 치우고 청소하는 이야기도 신기했다. 저자는 ‘우물 속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내려앉아 있었다’라고 신비감을 더한다. 문장만 보고도 나는 무척 두근거렸다. 도르레, 두레박, 물앵두나무...
어릴 적에 어른들께 이야기를 조르는 아이였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 사라진 서사들이 궁금하여 그립기만 하다. ‘소리 나는 것과 칼은 시어머니가 사 주어야 한다’는 속설도 처음 들었다. 신혼 시절의 도마를 아직 사용하신다니 무척 단단한 나무였나 보다 그것도 부럽다.
떠나신 분들이 챙기고 먹인 이야기를 읽을 때면 채우지 못할 허기가 진다. 맛있는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이 거의 없어진 지가 여러 해인데, 어릴 적 받아먹던 것들을 생각하면 침이 고인다. 챙겨 주시던 분들이 떠나시고 나니 아무도 다시 챙겨주지 않는 것들은 더 그렇다.
통통통 소리와 함께 퍼지던 음식향, 주방으로 길게 들어오던 오후의 빛, 창문으로 들어오던 솔솔 가벼운 바람, 책을 들고 소파에서 느긋하던 나... 기억은 거듭할수록 미화되고 조작된다고 하지만 간혹 나는 왜 그런 시공간을 만들지 못하는지, 왜 그때처럼 모두 다 채워지는 행복감은 없는 것인지 스스로의 무능력을 애통해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일상을 일구고 가족을 돌보전 저자가 시인들과 시의 세계에 빠져 글을 쓰기 시작한 마무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참 행복한 삶의 풍경들이다. 내내 그러시길 응원한다.
“시가 있어 나는 더없이 행복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