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걸로 살아요
무레 요코 지음, 이지수 옮김 / 더블북 / 2022년 4월
평점 :



영화를 먼저 만나 아주 좋아하게 된 작품 <카모메 식당>의 작가 무레 요코의 책이다. 영화는 아름다웠고 원작은 더 유쾌했다. 소소한 행복이라고 일상과 현실을 피하면서 애써 다른 가치를 찾는 노력은 불편하다. 그렇지 않고도 기분 좋게 가볍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여성들 이야기라는 점도 아주 중요하다.
등장하는 작가의 취향들, 물건들을 몰라서 찾아가며 읽었다. 국가도 사회도 문화도 다르고 개인 취향이란 천차만별인 법이고 그래서 흥미롭고 재밌는 것이다.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마저 크게 웃을 이유가 되어 즐거웠다.
연필을 좋아하고 연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 연필 이야기는 반갑고 간질거리고 행복했다. 손글씨를 잘 안 쓰니 내게도 몽당연필이 많아지질 않는다. 새 연필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해 벌써 새로 산(그리고 선물 받은) 연필들이 얼마인가...
만년필도 좋아하는데 활용도가 더 줄어들었다. 작년 말에 만년필 몇 개를 나눠 주고 구매는 그만! 이라고 결심했는데 책상에는 만년필 세 상자가 있다. 내가 산 게 아니야... 예전 선물 받은 걸 이제 찾았을 뿐이야. 변명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진다. 자기합리화란 무섭고 강력한 거짓이다.
나는 물건에 관해서는 못 말리는 고집쟁이다. 내 물건에 한한 것이니 강요는 없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데 너무 큰 고통이 따른다. 평생 같이 살 물건!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구매할 수 없다. 예전에 그냥 샀다가 볼 때마다 억지결혼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그렇다고 취향이 고급스럽다거나 예술적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오해는 마시길. 작가의 취향도 가만 읽다 보면 온통 모순, 일관성 결여, 설명 불가인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웃었다. 그게 취향이지 싶으면서도 나는 내 취향이 합리성도 윤리성도 갖추기를 원하니까 조금은 복잡한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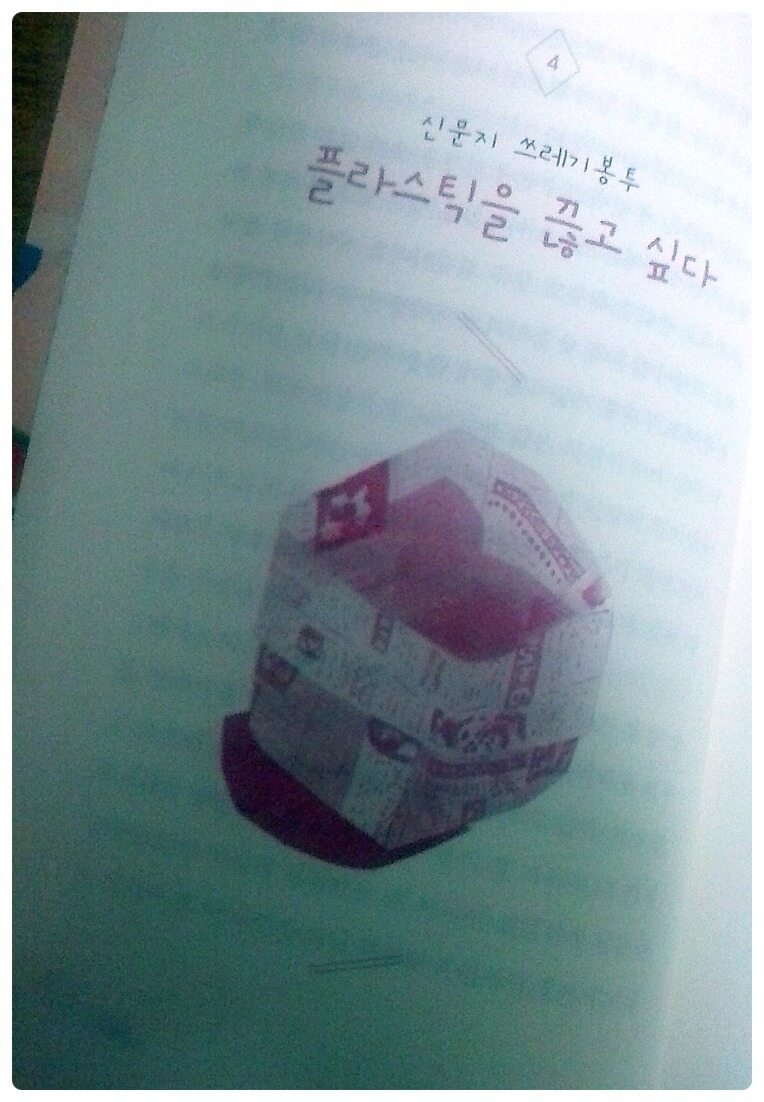
파친코(드라마)를 본 분들은 선자 엄마가 쌀을 구해 밥을 지어 딸에게 먹이는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흰 쌀밥이 주식이 아님에도 그 드라마 탓에(?) 벌써 몇 번째나 쌀밥을 지어 먹는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스토리 자체의 힘도 있지만, 그 밥이 탐나는 이유는 가마솥 밥이기 때문이다.



돌솥을 샀다가 손목이 부러질 듯해서 포기한 옛 기억도 나고 한동안 성황을 누리던 가마솥 밥을 하던 식당도 생각난다. 그 식당의 다른 반찬과 요리는 기억이 안 나고 가마솥 안의 밥만 내내 기억난다. 이 책이 냄비 밥을 지어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 읽고도 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일한 탈출법은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을 텐데.
파친코의 밥도 저자의 밥 짓는 이야기도 ‘정성’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토록 강력해졌다. 결혼해서 떠날 딸의 마지막 식사로 꼭 해먹이고 싶은 밥과, 냄비를 만난 과정부터 최고의 디테일로 쓴 밥 지어 먹는 이야기. 정성도 진심은 역시 힘이 세다.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바람직한 일들이 굳건한 내 취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회용은 단 한번이라도 참을 수 없이 싫어지고, 오늘 새벽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며 자가운전을 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일도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라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얼굴을 굳히는 일도 취향상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면 좋겠다. 기억도 다 못하는... 글로 다짐한 모든 결심이 살아갈 삶의 확고한 취향이 되면 좋겠다. 내 취향들이 내가 살아 갈 이유가 되어 주면 좋겠다.
.
.
.
“집에서 요리해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냉장고는 거대해지고 전기밥솥은 비싸진다.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기업도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음식을 만든다는 행위도 양극화되고 있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부터 우리 집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플라스틱투성이라 고민인 건 문구류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닷속 생물들의 비참한 상황을 안 이상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가 플라스틱을 내려놓지 못하니 이것이 문제였다. 문득 책상 위를 둘러보자 클리어 파일, 클립 케이스, 펜대, 그리고 지우개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테인리스 거름망을 썼는데, 일일이 씻는데 귀찮아서 플라스틱 거름망을 그때그때 교체해가며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재활용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당시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환경오염이 일어난 거겠지. 유명한 가게에서 뭔가를 살 때면 그 가게의 종이봉투를 들고 걷는 게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