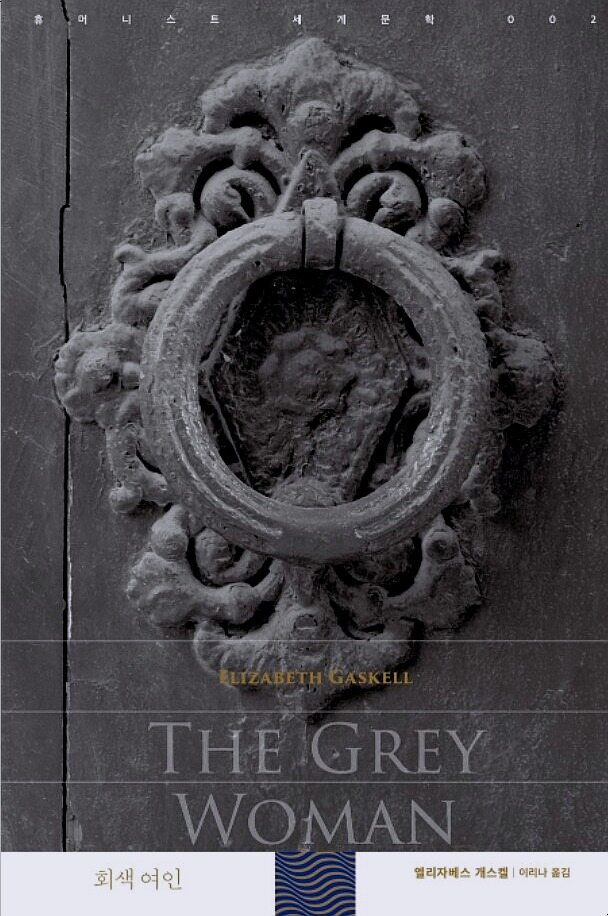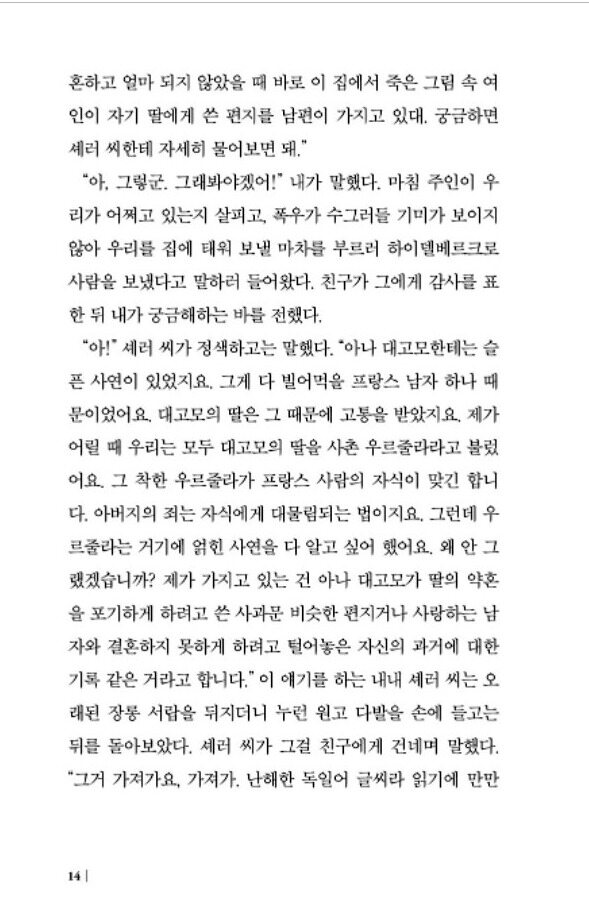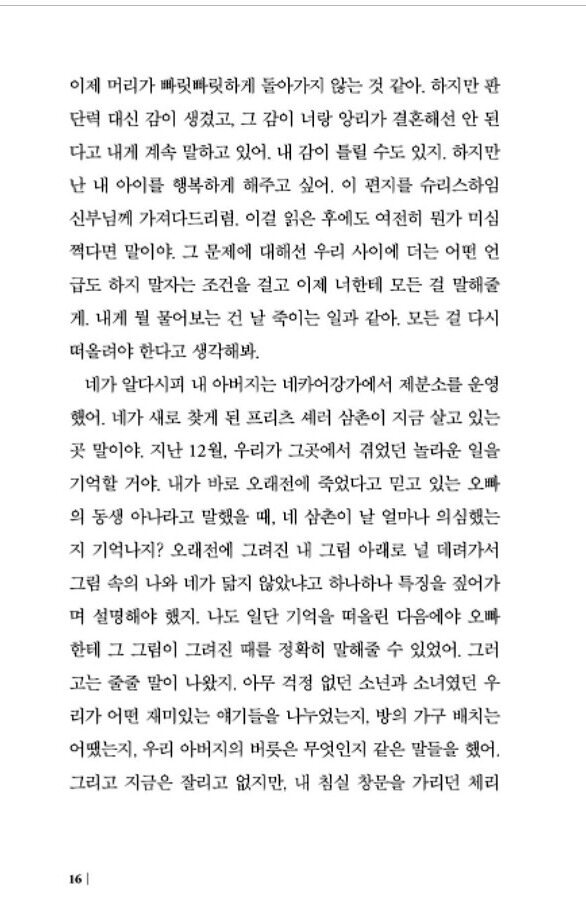-

-
회색 여인 ㅣ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2
엘리자베스 개스켈 지음, 이리나 옮김 / 휴머니스트 / 2022년 2월
평점 :



메리 셸리의 팬이라 <프랑켄슈타인>을 한 번 더 읽을까 했는데 이 시리즈를 계속 읽고 있다. ‘고딕gothic’한 분위기를 무섭지만 궁금해 하는 독자에게도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을 찾는 이에게도 중독성이 강한 장르이다. <회색 여인>은 단편 소설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편 <회색 여인>은 꼼짝없이 붙들려 끝까지 다 읽게 되는 흡인력 있는 작품이었다. 어째서 회색인지가 무척 궁금했는데 짐작에서처럼 두려운 이유가 있었다. 목가적으로 다채로운 색들로 표현되는 풍경과 상징적 대비가 멋지다.
“셰러 부인이 그러는데, 이 백합 같고 장미 같은 예쁜 여인이 공포로 얼굴색을 완전히 잃어서 '회색 여인'이라 불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대.”
거대한 비밀은 말로 전하기 어려운 법이다. 딸에게 남긴 편지를 액자식으로 구성한 것도 아주 좋다. 이런 구성의 영화에서 장면이 전환되는 순간 내 심장이 유독 빨리 뛴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자신의 침묵으로 격리시켰다가 그 침묵을 깨면 시공간도 연결되는 전개는 최고다.
어제 북클럽에서 PTSD 관련 대화를 나누다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질환에 대해 무심코 회화하거나 말버릇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재결심했다. 아나 셰러에게 과거의 공포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을 들추는 일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까.
아나가 탈출을 결정한 순간부터 나는 더 두려워졌다. 남아도 해결되는 것은 없겠지만 탈출 후 안전해질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활동을 제약하고 축소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슬프고 화가 났다. 여성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위협하는 야비한 전략은 여전히 활용 중이다.
“내 아내가 내 일에 관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날이 아내의 제삿날이 될 거야.”
여자는 딸은 해지기 전에 집에 오라는 말도, 밤늦게 다니니 그런 일을 당하지, 라는 말에도 19세기와 다를 바 없는 공포의 전략이 깔려 있다. 이런 유의 위협을 한 개인이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아나는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두 번째 작품 <마녀 로이스>의 배경과 소재는 1962년 실제 마녀사냥을 했건 세일럼이다. 묘하게도 북클럽의 질문과 다시 겹친다. 누가 마녀인가. 즉 우리는 누구를 손쉬운 비난과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는가.
원주민의 땅을 빼앗은 이방인인 자들이 종교를 이유로 손쉬운 다른 제물들을 찾아 죽인다. 진짜 이유는 두 목사 간의 세력 싸움일 뿐이다. 싸우고 싶은 이들끼리 싸우는 대신 관련 없는 이들을 죽임으로써 제 힘을 보이려 한다. 욕망과 악의는 아주 쉽게 협력한다.
“상상력은 변질되었다. 공포심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피하게 했고, 누가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인간이 저지른 악행들은 중단되고 역사 기록만 남았으면 좋겠으나 2022년에는 더 천박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근거가 너무 저질스러워 전의를 세우기도 힘이 든다. 목적은 19세기와 다를 바 없는 제가 챙길 계산된 이익이다. 돈과 권력.
그때도 지금도 제 욕심에 휘둘리는 인간들 말고 다른 이들은 모두 제정신으로 그들을 비웃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절망스럽게도 집단을 이룬 무지한 자들의 광기가 전염병처럼 날뛰고 있다. 2022년에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 스포츠의 주제는 거짓과 혐오이다.
2세기가 아무 것도 아닌 듯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전한 공포와 두려움에 싸늘한 분노가 인다. 여성작가의 작품 속 여성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희생양이나 도움을 요청만 하는 캐릭터들이었다면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척 재미있지만 마냥 즐기면서 빠르게 읽고 말 책이 아니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하는 소리를 들을 지도, 분노와 공감으로 눈물이 핑 돌 수도, 계속 떠오르는 예전 영화*를 찾아 다시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 Thelma & Lou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