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절
링 마 지음, 양미래 옮김 / 황금가지 / 2021년 11월
평점 :



이 작품은 무엇일까. 재밌는 장르문학일 거란 생각에 읽기 시작했는데 심장을 조이듯 차분하게 농도가 진해지는 불안과 무섬증이 여러 번 스치고 지나가던 참 이상한(?) 작품이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읽은 것도 같고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아찔한 느낌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내용을 가리기도 하다. 작가가 소위 혼신을 담은 데뷔작에 꾹꾹 눌러 담은 삶과 앎의 진한 맛을 본 것 같다.
작가 자신의 에세이처럼 느껴지는 내용들과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이 당연한 듯 어우러져 있고, 정교한 솜씨로 창작된 세계임에도 여려 겹의 현실이 촘촘히 언급되고 있다.
단절로 변역된 severance는 퇴직연금 항목에서 보던 단어이다. 모든 끝은 이전의 삶과의 단절이라 의미가 전혀 다른 것도 아니지만, 단절이 싹둑! 소리가 나는 급작스럽고 단호한 결별이라고 느껴온 나는 그보다는 무사히 퇴직하기까지의 성실한 루틴이 연상되는지라 조용하게 흘러갈 퇴직의 그날이 더 서늘하다.
현실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더 놀라고 더 화내고 더 떠들썩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지, 그 고요함이 괴이할 때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태연하게 건조하게 살아가는 낮은 볼륨의 풍경들에서 확실히 죽어가는 끝을 향해 걸어가는 불가피한 종말이 보인다. 무섭다.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나 역시 내 삶의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반응한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너무나 무관한 듯 편안하게 위기의 한 가운데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격렬한 반동의 저항보다 더 무시무시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내가 두려워하던 어쩌면 정확히 알고 싶지 않던 확인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그런 부조리함에 현미경을 들여댄 작품이기도 하다. 렌즈에 눈을 대고 본 풍경이 소스라칠 듯하다.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지난 수년, 수십 년 동안 내재화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오래된 루틴과 몸짓을 그대로 모방하는 습관의 노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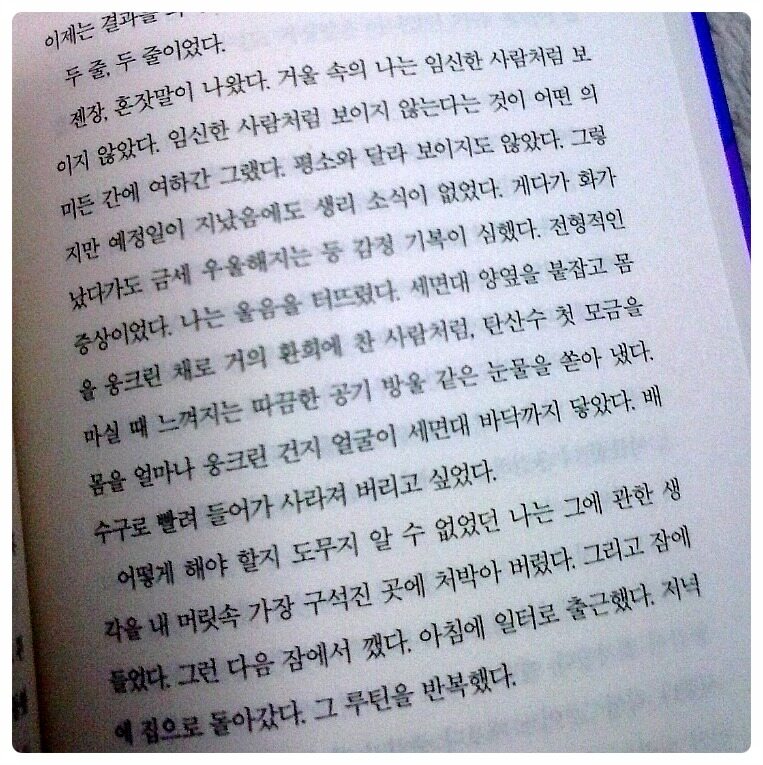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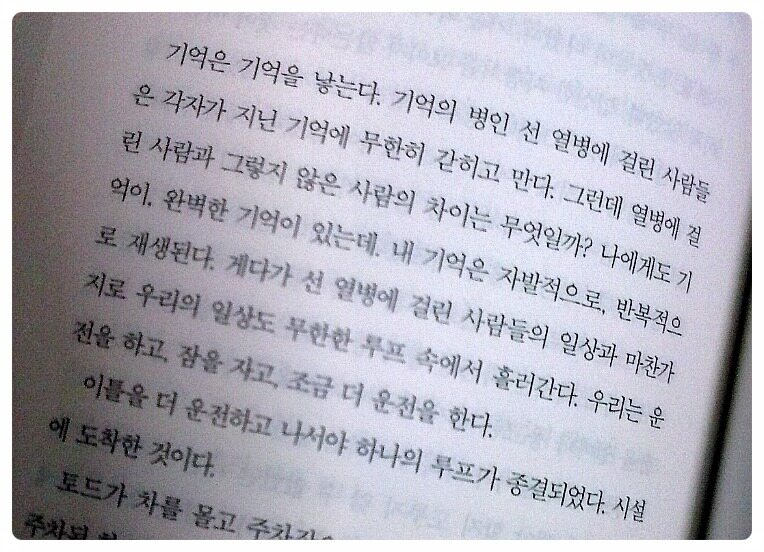
선 열병(Shen Fever)에 걸렸지만 무증상 환자들처럼 살던 대로 하던 대로의 행동을 습관을 반복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은 삶을 쓰고 만다. 주인공 캔디스 역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던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한다.
“궁극적으로 선 열병이 초래하는 결과는 치명적인 의식 상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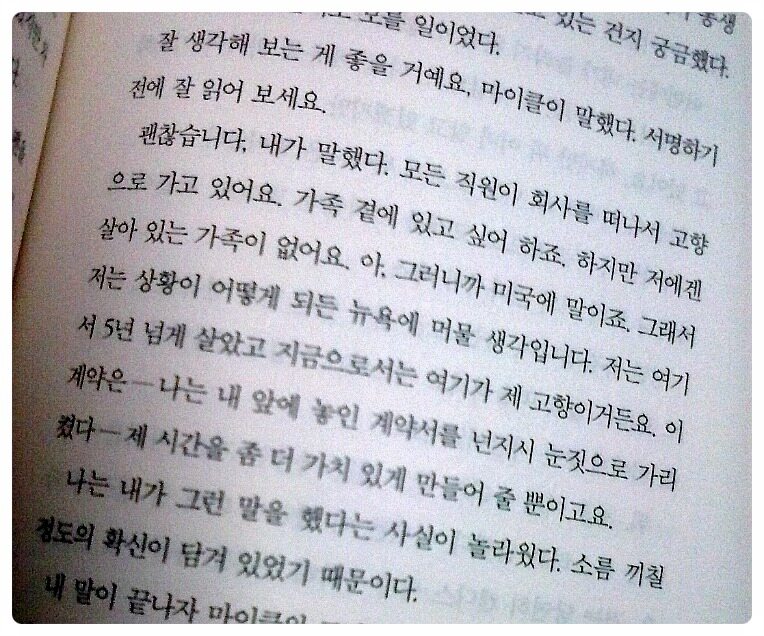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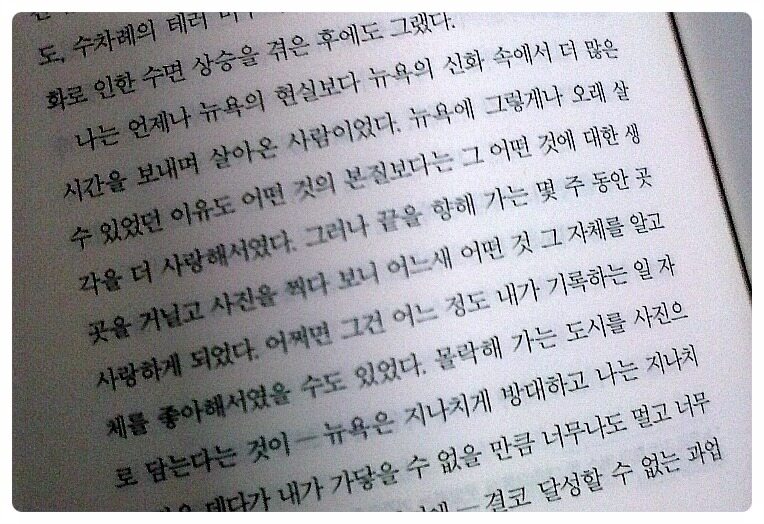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런 선택을 유도한 시간은 환영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부모의 삶과 맞닿아 있다. 선 열병이라는 재난이 닥치기 전의 삶에서도 목표를 찾지 못해 할 수 있는 루틴을 반복하던 부모의 삶이 있었다.
“너는 우리의 유일한 자식이야. 그러니 넌 아빠보다, 적어도 아빠만큼은 잘 해야 해. (...)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네 아빠가 바랐던 것과 같단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네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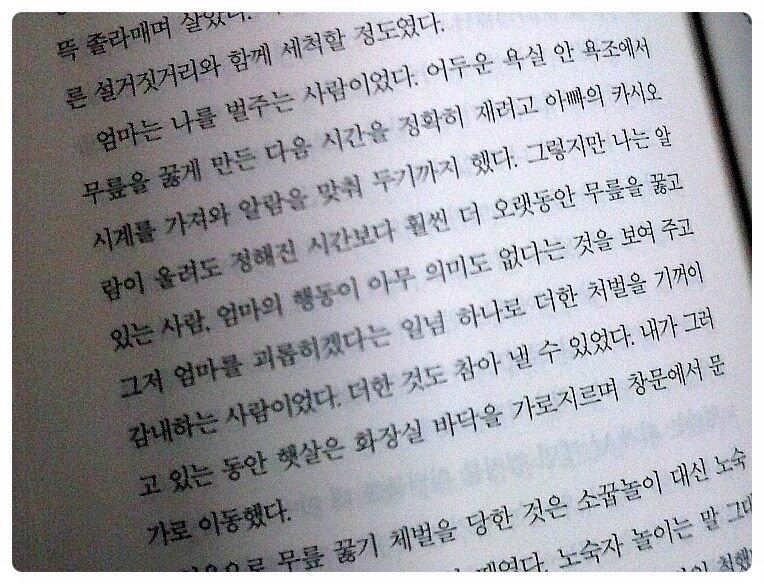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과 맞바꾼 현실의 잔인함이 풍경으로 드러나는 역작이다.
“무한히 돌고 돌며 반복되는 지극히도 무료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그렇게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법이다. 이 열병은 반복의 열병, 루틴의 열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틴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다양한 차이를 포착하게 된다. (...) 내가 넋을 놓게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차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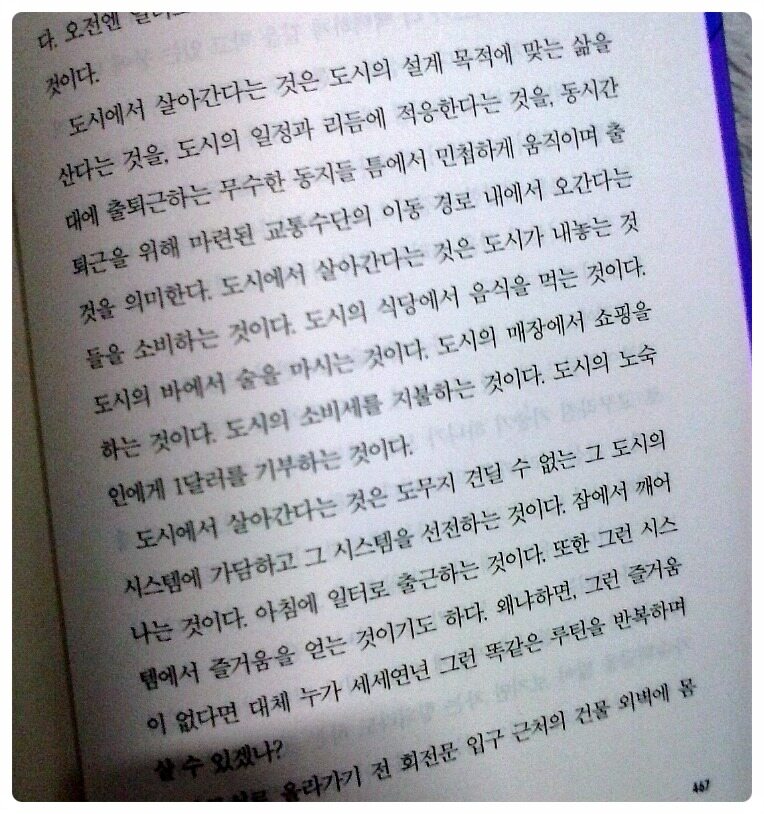
주말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위가 있다. 주중에는 법 제정을 위한 얘기들을 종종 하다가 주말이면 편히 쉬고 즐겁게 보낼 아이템들을 떠올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피곤한 하루의 저녁, 지친 한 주의 주말, 헛헛한 한 해의 연말이 주는 잠시의 위안마저 뿌리쳐야 하는 건가.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36.5도로 잔잔히 타면서 소진되는 인간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내재적 열병을 모두가 앓으며 살아온 것이라면 이런 잠시의 위안만이 실재하는 전부일까. 경고만이 아니라 작가적 예언을 만나 습격당한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