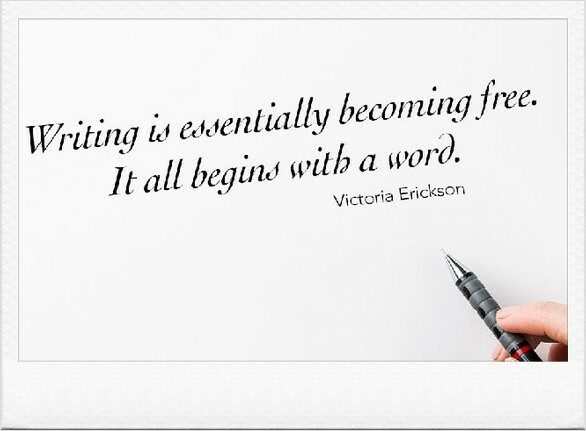-

-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
오덕렬 지음 / 풍백미디어 / 2020년 10월
평점 :



서정시의 정서를 품었고,
소설 구성과 닮은 데가 있으며,
희곡처럼 대화적 요소도 좋아하고
동시·동화와도 잘 통하는,
비평적 인자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 장르의 경계를 허문 이것
오덕렬 수필가의 의견처럼, 문학의 형태 중에 작가와 독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독자가 작가를 가장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는 수필이라고 생각한다. 수필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그 작가와 특별한 사적인 관계를 나눈 것도 같고, 사정을 잘 아는 친구를 가진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책과 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책속에서 길을 찾고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지 않던가? 삶에 영향을 주었던 책을 다시 들춰 보면 갖가지 상념들이 함박눈처럼 내리기도 한다. 이럴 때면 울컥울컥 울음이라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 되도록 이면 이런 책을 많이 간직하고 싶다.
작가에게도 역시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내밀한 깨달음, 그리운 이(것)들에 대해 천천히 담담히 써볼 수가 있는 장르로서, 자신의 문체와 정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학이 수필이 아닐까 한다.
내 이름은 엣세(Essais)야. ‘시험하다’라는 뜻을 이름에 담았대. 나는 몽테뉴에 의해서 탄생한 1580년생이네. 몽테뉴는 불혹의 나이에 서재에 묻혀서 독서와 명상에 잠겼대. 나의 정체가 알고 싶다고? 터놓고 말하자면 나는 3권 107장의 책이면서 문학의 한 장르이긴 해.
유난히 힘겨운 올 하반기, 우울증에 더해 비염이 심해져 잠도 못자고 깨어있을 때도 고통스러운 나날의 어느 시간, 이 작가의 수필은 어떤 힐링이 되어줄까, 모든 가능한 힐링에 대한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기대를 품고 읽었다.
“수필의 변화와 역사를 이 한 권에 다 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이들에게 좋은 휴식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엮었죠.” 오덕렬 수필가
4부 45편의 넉넉한 구성이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정말 끝까지 못 읽겠다 싶은 책이 아니고서야 나는 마지막 장이 빨리 나타나는 순간이 늘 아쉽다. 꼭 페이지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또한 재미난다.
마지막 한 장은 왠지 허전하다. 자, 친구와 술 한 잔 나누는 여유를 갖자. 술잔 속에 일상의 기쁨을 담고 말없이 마주하고 있어도 부자가 된다. 그득한 풍만함에 싸인다. 이때다. “어이, 끝이 없다면 어쩌것는가?” 환청같이 다가온 소리다. 끝이 없다면 삶은 얼마나 팍팍할까, 숨이 막히겠지.
모르는, 처음 들어 보는 단어들이 나온다. 아마도 수필가의 향토어, 고향어일 것이다. 그렇다고 읽기에 불편하진 않다. 그 또한 즐겁다.
삶은 이상을 향한 까배미의 과정이 아닐까. 나는 마음밭을 일구는 까배미는 이어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한다. 마음의 까배미의 의미를 빼고는 나의 삶은 짚을 잃어 희미해질 것만 같다.
작가가 하루 한 편만 읽으라 했는데, 너무 많이 들춰보았다. 역시 남의 말 잘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이 과하다,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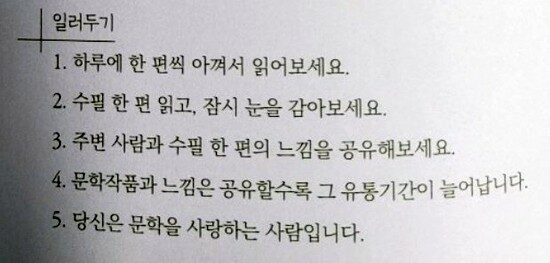
어린 시절 추억이 이렇게 가득하고 생생한 이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글을 쓰나보다, 이미 알고 있었던 듯도 하고, 다시 확인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다시 든다. 그렇다고 드라이한 내 추억을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채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면 자제력도 상하는 것인지, 꿀꺽 삼킬 여유도 없이 가끔 독설이 튀어 나온다. 속도 안 시원하고 오래 후회된다. 그러지 말자, 부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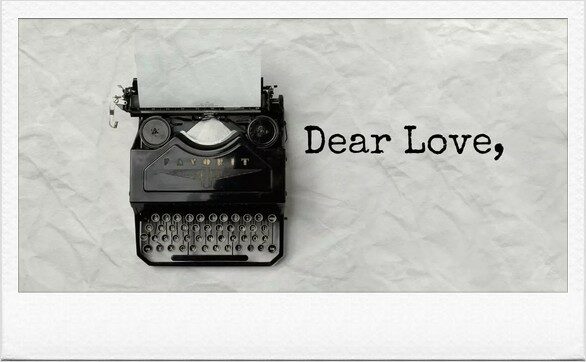
말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도 한다. 생각을 모두 더해 놓으면 인격이요, 사람마다 인격이 다 다른 것도 품고 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씨 또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