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섬돌에 쉬었다 가는 햇볕 한 자락
장오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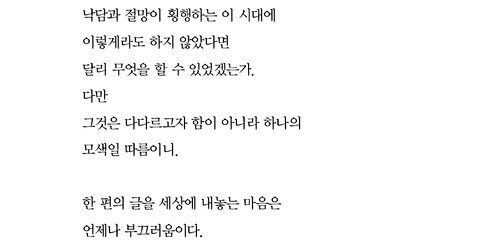
창작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창작품이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작품들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일상의 애환들이 진하게 묻어 있는 글들이 있다. 때론 이런 글이 좋고 때론 저런 글이 좋은 것은 늘 그 때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 감상이란 언제나 상황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일상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유보했거나 아님 그저 낯선 다른 일상을 살 뿐이지만, 어쨌든 병리적 이유와 과정으로 맞닥뜨린 시간에는 ‘평범했던 일상’이라는 것이 그리워서 울컥 마음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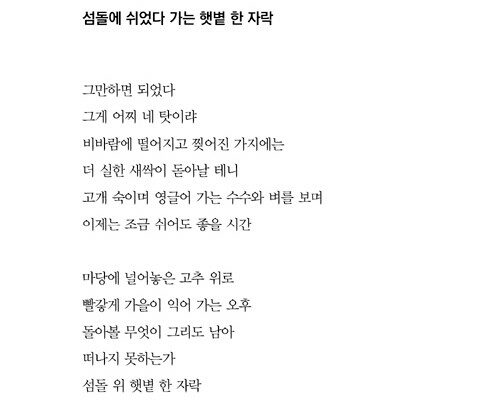
특히 장오수 시인의 일상이 스며든 시어들을 많이 등장시키는데 이는 현재의 내 일상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은 일상도 불러들인다. ‘섬돌’은 조부모님이 계실 때 본가의 고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기억 속엔 늘 햇볕에 따뜻하게 달궈진 반짝이는 모습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밖에 기억 못하던 그 장면이 시인의 언어로 시집의 제목으로 나타나 반가운 마음으로 책장을 펼쳐보았다.
인간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이마다 자연의 모습들이 끼어든다. 그 중에는 부부싸움도 있다. 마치 새벽 찬바람이 싸움을 화해로 바꾸는 역할인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개가 포근하다. 다른 작품에선 작가의 경륜이 느껴지는 시선이 드러나 있고, 때로 그 시선은 시의 형식이지만 지나온 세월과 고단함과 감정과 일상과 미래에 대한 준열하고도 객관적인 독백으로 흐른다.
62편의 적지 않은 3부작 시집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군더더기도 화려함도 없이 짧았다는 느낌이 드는 시집이기도 하다. 부분적으로는 시인의 깊이와 층층을 다 이해하지 못한 나의 독자로서의 얕음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에 다시 읽으면 다른 이야기가 들리기도 할 것이다.
하루 만에 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 하루 밤에 수백명씩 사망하는 나라, 그리고 끝없는 격리, 격리…….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고 하루만 겪는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점이 오늘도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두렵고 화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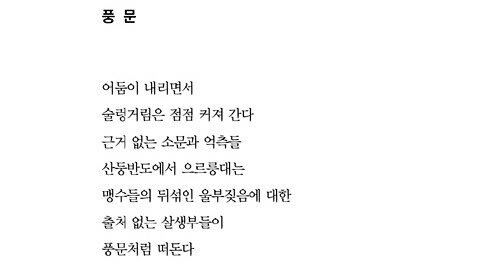
내 일상도 남의 일상도 귀하디귀한 그리운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시인이 겪어온 일상도 내가 지나쳐 온 모든 시시한 일상도 참을 수 없이 아깝고 간절했다,는 기분으로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읽었다.
* 포스팅에 올린 시들은 전문이 아니라 모두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