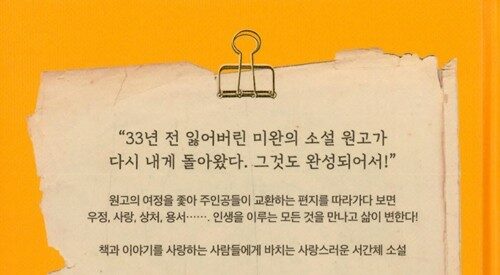-

-
128호실의 원고
카티 보니당 지음, 안은주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0년 3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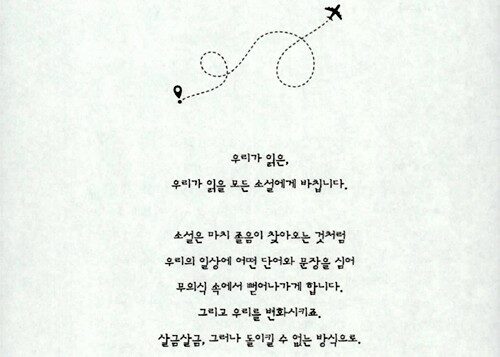
우리는 다른 이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몰두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지. 그래서 그들과 멀어지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고. 70
그런데 저는 알고 있답니다. 이 작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소설은 제가 다시 길을 되찾고 좀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그 해변까지 온 거예요. 때때로 서로 만날 수 밖에 없는 책과 독자가 존재하잖아요. 84
우연히 머문 호텔방에서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설의 원고가 발견되다니. 그리고 이토록 낭만적인 소재가 실화라니. 유럽에서 내가 머문 모든 곳의 서랍에는 성경이 들어있거나 텅 비어 있었다. 뭔가 억울하고 부러워 속이 살짝 상하는 기분이다. 심지어 프랑스 남쪽 해안 땅끝마을은 내가 가주 가던 영국의 땅끝(Land's end)과 명칭도 유사하다. 그리고 보니 나는 한국의 땅끝마을도 방문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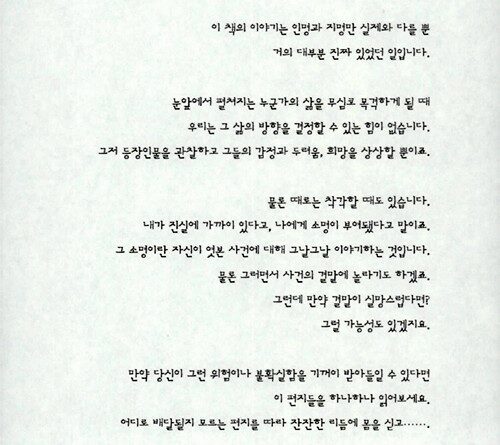
문득 든 생각 하나, 한국에서 이런 원고가 발견되었다면 원고가 원작자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온갖 이들을 거치며 사연이 쌓이고 세월을 보내고 결국엔 기적처럼 도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진 않을 것 같다. 세계 누구 못지않게 남의 일이라도 도와 줄 여력이 조금만 있다면 열심히 돕고 우편제도 또한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온라인 네트워킹으로 범죄도 고발하고 추적하는 1인 탐정들과 맞먹는 재능과 호기심을 가진 한국인들이라면……. 발견된 다음날 원작자에게 연락이 닿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상상을 하니 그 또한 유쾌해서 웃음이 났다.
다행히(?) 이 일은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라 무려 33년 동안 시간을 충분히 들여 훈훈하고 인간미 있는 사연들이 쌓일 동안 원고는 각지를 여행하게 된다. 물론 그 오랜 세월 동안 원고에 쓰인 이야기에 감동하고 원작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이어가며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들의 모든 참여가 사랑스럽다.
소설이 당신 손에 들어간 걸로 보아 아무래도 그녀의 과거의 흔적을 청산하고 살아가는 모양이군요.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난다며, 우리의 논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독서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제게까지 전염됐다고 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는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바위에 붙어 있는 고둥처럼 이곳 수감자들에게 들러붙은 만성적인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0
사방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격리되면 그 안의 사람들은 바깥세상을 잊고 말죠. 세상에서 추방된 것처럼 느낀답니다. 이러한 단절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되어 보이는 그림자만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를 대면할 때마다 자기성찰을 하며 결점을 지닌 낙오자의 기괴한 모습을 끄집어내고 말죠. 그러니 어두운 좌절이 자신에게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서관에 가는 것. 236-237
도서관을 가는 일도 삼가야하는 일상이 된 현재, 나는 매일 무엇인가를 읽고 쓰고 있다. 며칠 되진 않았지만 오전 중에 새로운 책을 읽고 있지 않으면 오후가 되어 무척 초조해진다. 새로운 중독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집착이 꼭 옳은 일이 아닌 것도 같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어쩌면 눈 돌릴 길 없는 불안한 현실에서 적어도 책을 들여다보는 순간은 잠시나마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몰입도가 뛰어난 이야기를 읽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진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서 다시 금방은 해결되지 않을 지극히 비현실적인 현 상황 속에서 불안과 우울이 차오르긴 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들을 편지봉투들과 함께 모아 두었다. 내가 써 보낸 편지들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받은 편지들을 통해 일부의 내용을 기억해 낼 수도 있다. 손글씨라는 건 확실히 실체감이 생생해서 문서 폰트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 분위기, 성격 등등을 다시 떠올리게도 만든다. 오래 만나지 못한 이들은 내가 변했듯이 그들도 기억하는 그 모습은 아니겠지만.
시절이 이러니 염려와 그리움이 증폭되는 이들도 있다. 그 중 주소지가 아직도 일치하는 이들에게 오랜만에 다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띄워 볼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나에게도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들을 보내달라고 졸라보고 싶기도 하다. 비록 그 편지들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일상을 되돌려 받진 못해도 이 책의 편지글들처럼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사소한 구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저녁 따뜻한 불빛 아래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펴고 펜을 뜨겁게 잡고 아픈 마음을 펼쳐서 편지를 받는 이들이 다치지 않을 말들을 골라내어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