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보는 몇 개의 드라마가 있다. 언제나 심심할 때 틀면 좋은 Band of Br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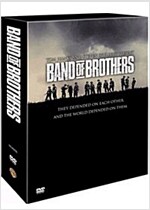


책 한 권 펼쳐놓고 맥주 한잔하면서 보면 좋은 고독한 미식가, 그리고 역시 같은 분위기로 보면 좋은 심야식당. 이 심야식당은 만화가 원작인데, 드라마로만 접한 작품이다. 현재 시즌 1 까지 DVD로 나와있고, 시즌 2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 - 라고 썼는데, 방금 검색하니 이번 달에 나왔다. 이건 기회가 되면 구해야한다.



심야식당 시즌 1의 에피소드 1을 보면 식당 일대를 '지역기반'으로하는 야쿠자 '류'라는 케릭터가 있다. 맨 처음 식당을 찾은 날부터 줄창 칼집을 내어 문어모양으로 볶아낸 빨간 비엔나 소세지만 시켜 먹는데, 이는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음식이기 때문. 이 사연은 시즌 2의 에피소드 1에서 '다시 빨간 비엔나 소세지'라는 제목으로 밝혀진다.
주구장창 쓸데없는 사설을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 나도 왠지 모르게 이번 글의 제목을 '다시 하루키'라고 쓰고 싶어졌기 때문이고, 무엇인가 거창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루키를 접한 것도 남들보다 늦은 주제에, 그의 주요작품 뿐만 아니라 전작을 결심한 것도 겨우 한 두어달 전이니까, '다시 하루키'에는 '다시 빨간 비엔나 소세지'와 같은 심오한(?), 그리고 가슴아픈 사연도 없다. 그냥 제목만 차용했을 뿐이다.
최근에 붙잡은 하루키의 작품들은 비교적 초기의 작품군인데, 모두 하나의 배경으로 이어져 있다. 물론 중간중간 다른 장-단편과 에세이를 기웃거렸지만, 무엇인가 이어진 하나의 세계, 나아가서 추후 그의 유명작품들의 테마와 셋팅이 습작되었음을 볼 수 있는 건 이들이다.

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이 작품은 하루키의 처녀작이면서, 재즈카페사장이던 그를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어느 날, 무엇인가 갑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싶어진 그는 이 글을 썼고, 군조신인상을 받았다. 시대적 배경은 1970 7월부터 8월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현 대선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하는 공주의 아버지가 한국을 10년째 '다스리던' 때.
주인공과 친구 '쥐'는 해변의 bar - J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 에서 술을 마시고, 낮에는 해변에서 논다. 그러면서 두서없이 인생과 기타 등등을 논하고, 기회가 되면, 여자와 잔다.
복잡한 문학이론적인 의미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그냥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던, 그리고 모든 것이 심드렁하던 20대 중반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그 거리를 떠난다. 70년대를 reference하기에 음악은 역시 pop이고, 가장 흔한 기기는 phono record player다. 미국에서는 vinyle (비닐) record로 흔히 부르는데, 나도 중학교때까지 모은 걸로 한 30-40장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물론 CD세대지만, LP판이 훨씬 좋다. 치직거리는 아날로그 사운드와 한 면이 다 돌아가면 바꾸어 주어야하는 불편함까지도. 무엇인가 낭만적이랄까. 예를 들면 - '비오는 이른 아침, 판을 올려놓고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와 '비오는 이른 아침, CD Player를 켜고 커피를 내린다'의 차이?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 1970년의 어느 해변, 그리고 bar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눈 앞에 아른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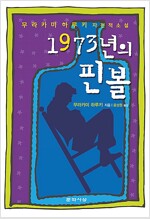
제목처럼 1973년의 어느 시점이 시간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노르웨이늬 숲 ('상실의 시대')의 '나오코'가 처음, 도입부에 나온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지, background가 같은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녀는 '그녀'가 맞는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공과 '쥐'가 찾아다닌 핀볼머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핀볼은 흔히 외국의 전자오락실, 볼링장, 또는 bar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아날로그 오락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PC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마치 slot machine을 PC로 돌리는 것처럼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 없는 특이한 게임이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원 코인으로 오래 살아남아 점수를 높여 가는 것이다. 전자오락처럼 기승전결이 있거나, 스테이지가 지날수록 어려워지거나, boss character가 매 스테이지마다 나온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쇠구슬을 튕겨 점수를 내는 것, 그리고 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게임의 거의 모든 것이다.
주인공이 자신이 가지고 놀던 어느 특정 핀볼 기계를 찾아 헤메인다. 이 핀볼 기계는 그의 과거이며,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그 무엇이다. 노르웨이의 숲의 나오코 같은 존재일까?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한다. 첫 사랑처럼. 김제동이 그랬던가? 첫 사랑이 그리운 것은 그녀가 그리운게 아니라, 그 시절의 '우리'가 그리운 거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 또 누구는 '사람은 추억에서 만날 때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읽을 당시에는 꽤 멋지다고 느껴지는 말을 남기기도 했나부다 (르네상스라는 순정만화 잡지의 단편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결론적으로 과거를 현재에 다시 마주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허탈하고 허무할 수 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역시 추억은 추억속에 남겨두는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facebook이나 cyworld는 가끔 너무도 먹고싶게 포장된, 그러나 결과가 두려운, 변비약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쥐'는 멀리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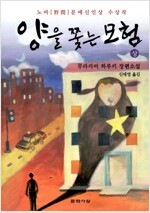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난해해진다. 굳이 문학적인 고찰이 궁금하다면 역자 후기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는 아직도 곰곰히 생각하는 중이니까.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이 역시 수십 년 후 1Q84를 출산하기 위한 시작이었을까?
도대체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역시 좀더 발전된 형태의 1Q84 prototype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 꼬마 여자애, 겹쳐진, 그리고 굴절되고 왜곡된 시공간. 이루카 호텔이라는 겹치고 닫힌, 그리고 연결된 공간. 주인공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호한 케릭터들. 그리고 아버지-후견인. 이 아버지-후견인의 gay서생 Friday. 정리가 덜 된 1Q84의 모티브를 볼 수 있다.
문학적인 후기가 궁금하다면 또 다시 역자 후기를 추천할 수 밖에 없다.
하루키의, 그리고 주인공의 13년간의 삶을 본다. 1970년 부터 1983년까지. 호오. 그 다음은 1Q84가 아닌가? 1984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카프카와 노르웨이의 숲.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재미있지만,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내려면, 나 같은 둔재는 전작을 한 열 번 정도는 하고, 나이도 한 열 살은 더 먹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잘 읽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흐리게나마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빨간 비엔나 소세지를 사다가 칼집을 내고, 문어모양으로 볶아서 양배추를 곁들여 아사히 맥주와 먹을지도 모르겠다. '류'짱의 그 대사가 떠오른다. '늘 하던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