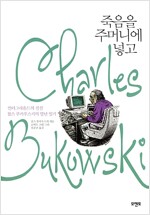
1, 가족이긴 하되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죽었다. 향년 90세이니 적게 산 것은 아니다.
그는 생전에 굉장히 괴팍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라도 애정을 주어야 했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혈족에게는 도타운 정을 가졌던 반면에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겐 아주 차갑게 대했다. 그가 평생토록 유지했던 이러한 단점은 결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는 한 점 혈육인 딸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2.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나 기업가만큼 저질인 부류들은 다수의 종교인들이다.
살찐 중 두 명이 한 시간 동안 불경을 외우고는 오십만 원씩 가지고 갔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나로서는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불교 신자인 친척과 가족들은 그들이 가져간 돈을 (아깝게 여기기는 했어도)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 생각한 듯하다. 최저임금 6000원(정확히 말하면 6030원) 시대에 목탁 두드리며 경 읽는 행위로 시급 50만원을 버는(그리고 당연히 바라는) 부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처먹고 살이 쪘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반들거니는 중이 이렇게 말했다.
'정성을 다해서 고인의 혼을 달랬으니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이제는 집 안에 복락과 행운이 가득할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봐요 스님, 당신의 요설을 믿느니 차라리 돈 백만 원의 권위(?)를 믿겠소.
3. 사흘 동안 밤샘을 했다.
상주의 나이가 적지 않아서, 내가 상주 대신 서 있을 때가 많았다. 새벽에 상주가 부속실에 가서 눈을 붙일 때면 빳빳한 방석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가져온 책들은 네 권이었지만 유일하게 반복해 읽었던 책은 찰스 부코스키의 일기집인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였다.
새벽에 누가 왔을 때도 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머리가 센 노인이었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 절을 마치고 그가 볼멘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요지는 상주다운 예의를 지키라는 거였다.
하지만 영감님, 그런 말은 남에게 하기 전에 자식에게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죽는 날, 당신의 아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지도 모른답니다.
4. 만일 죽게 된다면, 아주 조용히 죽고 싶다.
장례식에서 치르는 허다한 의식들과,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적잖은 이들을 볼 때면 그 갸륵한(?) 정성보다는 먼저 한숨부터 나온다. 위대한 인간이건 하찮은 소인이건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 조용히 죽자. 시체는 다들 병원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고, 의식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굳이 추모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 조용한 공간을 빌려서 천막 하나 치고, 향불을 피울 화로와 꽃 몇 송이만 준비하면 된다. 이 이상 준비하는 것은 치레이자 호사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담백하고 간소하게 죽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페이퍼는 찰스 부코스키의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를 읽고 작성한 글이다. 부코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니미럴, 한 인간이 평생 동안 오줌을 얼마나 누어대는지 궁금하게 여겨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먹고 싸지르는지는? 수 톤 될 거다. 끔찍하다. 우린 얼른 뒈져서 여길 떠나주는 게 제일 좋다. 우리 몸에서 뽑아내는 걸로 세상 모든 걸 오염시키고 있으니까"(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