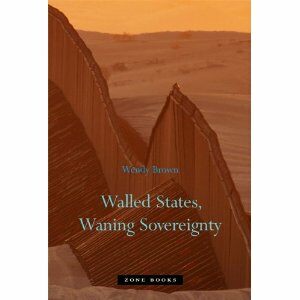

우리에겐 <관용>으로 잘 알려진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의 신간이 미국에서 곧 발간될 예정인 듯하다. 찾아보니 미국 일자로 10월 31일로 잡혀 있었다. 웬디 브라운의 책은 제목들이 다 좋은데, 이번 책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무엇보다 그녀의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좋다) 이번 책 제목은 뜬금없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위키의 힘을 빌려보니 2008년 그녀가 이 책의 제목과 유사한 제목의 강연을 했다는 걸 발견했다.
그 강연의 제목은 Porous Sovereignty, Walled Democracy 이었다. porous의 뜻을 찾아보니 '다공의' 즉 구멍이 많다였는데, waning (시들해진, 약해진)과 무엇과 통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아마 그녀는 푸코의'통치성' 논의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감벤 냄새도 난다.) 책에 대한 정보가 아마존에 몇 줄 나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내가 생각해본 그녀의 관심사와 초점을 표시한 것이다)
Why do walls marking national boundaries proliferate amid widespread proclamations of global connectedness and despite anticipation of a world without borders? Why are barricades built of concrete, steel, and barbed wire when threats to the nation today are so often miniaturized, vaporous, clandestine, dispersed, or networked?
In Walled States, Waning Sovereignty, Wendy Brown considers the recent spate of wall building in contrast to the erosion of nation-state sovereignty. Drawing on classical and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of state sovereignty in order to understand how state power and national identity persist amid its decline, Brown considers both the need of the state for legitimacy and the popular desires that incite the contemporary building of walls. The new walls—dividing Texas from Mexico, Israel from Palestine, South Africa from Zimbabwe—consecrate the broken boundaries they would seem to contest and signify the ungovernability of a range of forces unleashed by globalization. Yet these same walls often amount to little more than theatrical props, frequently breached, and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lawlessness that they are intended to represent. But if today's walls fail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globalization and national identity, they nonetheless project a stark image of sovereign power. Walls, Brown argues, address human desires for containment and protection in a world increasingly without these provisions. Walls respond to the wish for horizons even as horizons are vanquished.
이론의 수입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내가 요즘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세계 문제'에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나도 아마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각성중이다) 한국의 언론만큼 '내 나라 소식 전하기'에만 골몰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세계에 대한 소식을 괜히 끄트머리에 부착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세계로 인해 연결된 하나의 망으로써, 우리의 삶이 곧 세계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음을 언론종사자들은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용>에 이어 이번에도 언급되는 외국의 사례들은, 비단 '내 나라 밖의' 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웬디 브라운이 강조하는 저 '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세계를 바라보려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아, 그래서 이 말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는 조급한 문제 제기 대신, 우리는 그녀가 든 사례들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그것에 연유한 고민의 다발들을 챙겨보게 될지도.
이 책의 내용을 예고한 강의의 프리뷰를 잠시 보려면
http://depts.washington.edu/uwch/katz/20072008/wendy_brow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