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야기한 것은 모두 사르트르에게 배운 것들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많다. 예컨대 철학 학파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미국의 실용주의자들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는 앞의 메모에서 내가 난삽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몸의 존재론적 의의를 밝힌 것은 사르트르의 독창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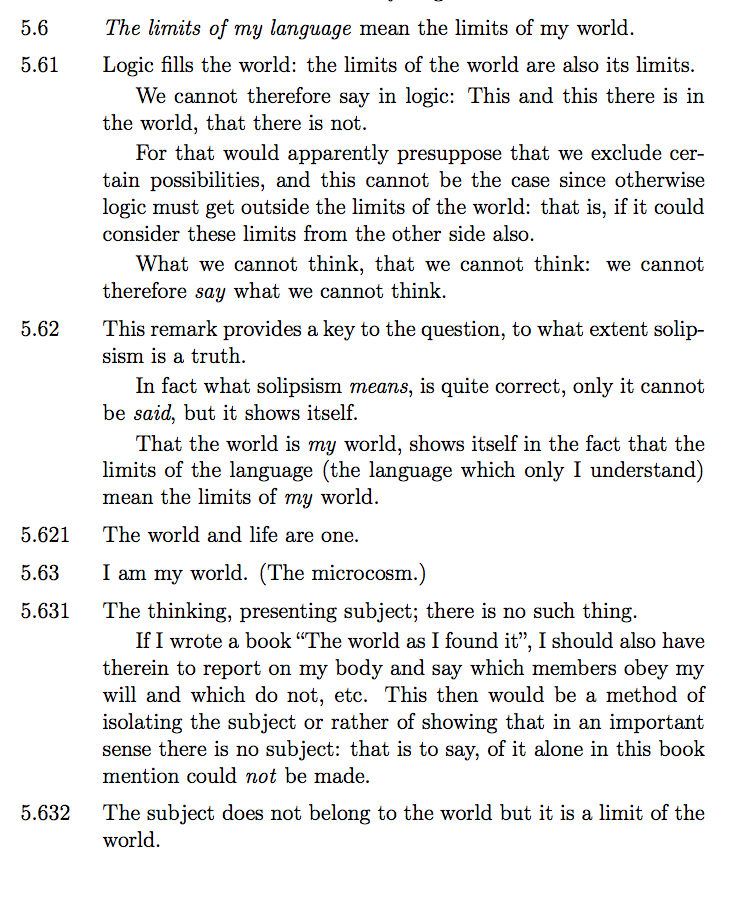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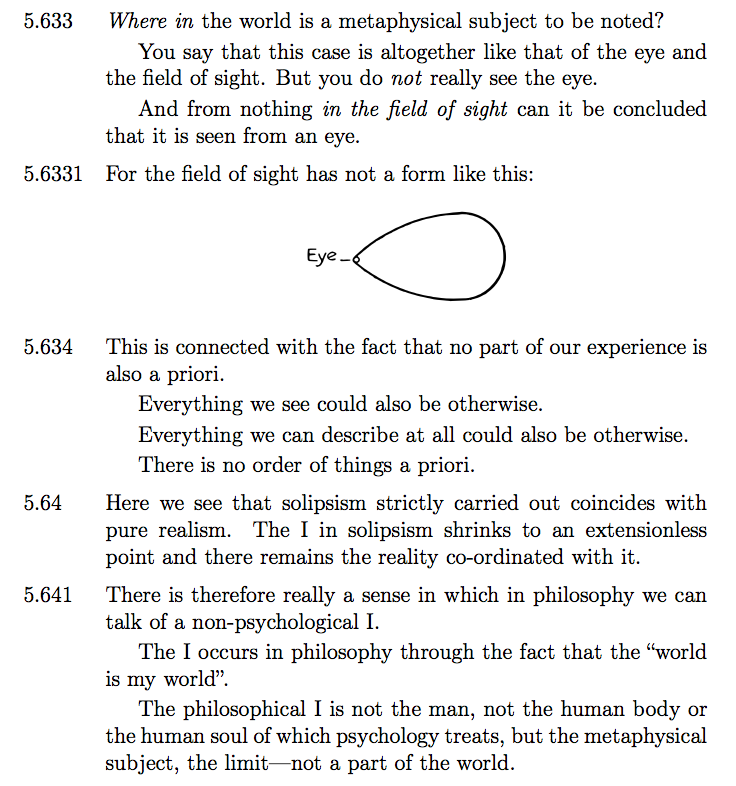
물론 두 철학자들 사이에 완전한 일치란 있을 수 없고, 사르트르 혹은 사르트르적 관점에 서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비트겐슈타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 저러한 사항에 관해서 간단히 코멘트해 보자.
1). 5.6, 그러니까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라는 말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 '나'의 언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후자. 비트겐슈타인 등은 인식론적 방법의 궁지를 깨닫고 이른바 언어적 전회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 전회가 유일한 대안이었을까?
2). 5.64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고찰된 유아론이 순수 실재론과 통한다고 말한다. 이때 주체는 외연이 없는 한 점이 될 것이다. 사르트르라면 이 말에 100% 동의할 것이다. 즉, 단적으로 사르트르의 기획은 순수 실재론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순수 실재론이란, 예컨대 이 커피잔의 하양은 커피잔에 속하는 것이지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뜻한다. 또 하나, 주관성이 외연이 없는 점이라는 것은 주관성이 내부 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주관성을 세계의 한계로 보는 한에서 주관성은 말해질 수 없는 것에 속한다는 것을, 그것은 스스로 드러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르트르는 주관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내부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사르트르는 주관성의 형식적 차원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실질을 해명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근대 철학의 커다란 특질 중의 하나는, 칸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주관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분명히 근대 철학의 연속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근대 철학의 붕괴가 일찌감치 선언된 지금, 사르트르 역시 그 잔해 밑에 깔려 있는 죽은 철학 아니겠는가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사르트르의 철학을 주체의 철학이니 의식의 철학이니 하면서. 그러나 삶에서든 학에서든 똑같은 격언이 적용된다. 여기가 에덴이 아닌 한 이름이 실체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근대 철학이란 무엇인지? 당신이 말하는 그 주체의 철학이란 무엇인지?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리 예의바른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숙고이고, 숙고는 항상 구체적인 것을 향해 흐른다고 믿는다.
다시 정리하자면 문제는 주관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때 주관성은 주관-대상 이원론에서의 그 주관이 아니라 세계의 한계로서의 주관성이다. 이런 형식적 관점에 섰을 때 주관성의 실질에 대해, 그러므로 세계의 실질에 대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