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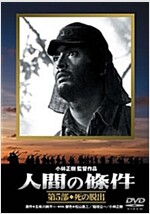
8월 14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樹) 감독의 <인간의 조건(人間の條件)> 6부작을 한꺼번에 봤다. 2부작씩 묶어서 총 3회에 걸쳐 상영했고, 1, 2부 206분, 3, 4부 177분, 5, 6부 189분, 총 9시간 32분의 말 그대로 대작이었다. 아침 10시 30분에 상영을 시작해 밤 9시 50분에 끝났으니, 14일 하루를 온전히 이 영화에 쏟은 셈이다.
내가 이 영화에 끌린 이유는 단 하나, 긴 상영시간 때문이었다. TV 드라마가 아직 제대로 태동하지 못했던 시기의 "연속극으로서의 영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랄까? (그러고 보면 나란 “인간”은 참 단순하다.) 물론 긴 상영시간의 영화는 다수 존재하지만, "거대 자본이 들어간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에피소드별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호흡으로 길게 꾸려가는 경우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제외하고는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영화는 지난 "3K 기획전(지금 하는 것은 앙코르다!)"에서 본 <사무라이 반란>이 처음이었다. 액션 활극의 쾌감을 버리고, 봉건 시대의 억압에 맞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몇 몇 군상들의 처절한 드라마는, 솔직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그 울림만큼은 정말 굉장했었다. 시대의 아이러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주제 - 이 영화는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 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렘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화의 내용은, 기나긴 이야기를 단 몇 줄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인공인 가지(나카다이 타츠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부) 1943년, 남만주. 식민지를 착취해 부를 이룬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가지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미치코와 함께 광산에 가 군대에 납품할 광물들을 생산하는 일을 맡는다. "인간애"로 똘똘 뭉친 가지는 그곳에서 일본인에게 당하는 중국 노동자들의 생활개선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온 중국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본군과 광산의 다른 간부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본군에 눈 밖에 나 징집을 당한다. (3, 4부) 이등병이 된 가지는 매번 군대의 부조리한 상황에 반항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선임 신조에게 끌린다. 신조의 탈영을 돕다 부상을 당한 가지는 의무대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단게 일병을 만나 마음의 위안을 가진다. 퇴원 후, 능력 있는 신지는 상병으로 진급되고 신병들을 훈련하는 직책을 맡는다. 옛 친구인 신임 소대장 가케야마의 도움을 통해 신병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훈련시키게 되지만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선임들에게 매번 당하고 지내지만,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대패를 하게 되고 가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군을 죽인다. 그는 살인의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5, 6부) 전쟁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가지는 한 무리의 병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선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난민들 무리를 만나며 그들까지 자신의 무리에 받아들여 목적지까지 향한다. 그들은 여행 중 여기저기에 있는 중국군과 소련군들의 공격을 받지만, 가지는 자신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랑스러운 부인 미치코를 생각하며 힘든 걸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결국 가지의 무리는 소련군에 잡혀 포로가 된다. 한 때 일본군이었지만 소련 포로수용소 안에서 포로관리인이 된 옛 동료의 억압을 참지 못해 가지는 그를 살해하고 소련 포로수용소를 탈출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향한다.
가지는 이상주의자다. 이 "이상주의(理想主義)"라는 말은 영화 내내 상대에 따라서 "공산주의(共産主義)" 혹은 "사회주의(社會主義)"로 불리기도 한다. 생산량을 극대화하기위해 착취를 일삼는 것이 목표인 식민주의 시대에, 가지는 피지배민들이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애쓴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일본인 감독관들에게, 가지의 행동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처음부터 가지가 “휴머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하기 보다는, 주어진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할 뿐이다. 잘못된 세계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하지만, 가지의 행위는 그런 모순율조차 이루지 못한다. 애초에 전제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다 문득 모골이 송연해졌던 순간이 있다. 가지의 “휴머니스트”적인 행동들은 종종 답답함을 불러일으킨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적당히 녹아들지.”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의 국민이 비인간적인 식민정책을 옹호하다니.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그 현실이 이렇게도 끔찍할지라도.
가지의 행위는 인간적이지만, 수용소에 갇혀있는 중국인 포로들은 가지를 믿지 않는다. 한 개인의 “믿음”이 전체 일본인의 “불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전기가 흐르는 수용소 안에 갇혀 지내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위안부 여성들에게 짐승처럼 배설을 하며 서서히 동물처럼 길들여지는 이런 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길리는 만무하다. 자유를 갈구하는 피지배민들, 자유를 억압하는 지배자들 사이에서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가지의 행동은 그 둘 어느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시스템”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탐색은 중단되고, 그는 징집되어 군대에 간다.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군대-라기 보다는 내무 생활-의 부조리는 결국 가지의 “휴머니즘”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을 보여준다.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전체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이 무시무시한 연대의식. 그리고 선임과 후임 사이의 끔찍한 상명하복과 그에 따른 구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군대”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지 개인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가지는 보통의 인간이라면 포기하고 말았을, 초인적인 의지와 집념으로 조금씩 군대를 바꾸어 나가지만, 그 또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전쟁은 가지에게 남아있던 조금의 “휴머니즘”조차도 앗아가 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그는 살기 위해 적을 죽이고, 심지어 전우를 죽인다. 하지만, 가지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적응해나간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인은 피할 수 없다. 전쟁이란 (내가) 죽거나 (상대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 중, 인간성을 말살하는 가장 끔찍한 “시스템”이다. 전쟁 안에서 “인간”에 대한 물음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시스템이 인간을 규정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 또한 인간이 만든 것임을 가지는 포로수용소에서 깨닫는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억압하는, 옛 동료였던 포로 관리인을 살인한다. 그의 휴머니즘은 먼 길을 경유해 전혀 다른 지점에 도착했다.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규정짓는 조건은 “이기심”과 “이타심”이다. “이타심”을 “휴머니즘” 또는 “사랑”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테니까. 가지가 자신의 휴머니즘을 버리고 “의도적인” 살인을 행한 것은, 그 포로 관리인에게선 “이기심”은 있어도 “이타심”은 발견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그 살인으로, 가지 역시 부처나 예수가 아닌, 불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 이기심이 결국 “휴머니즘”의 포기를 부른 것이 아니었을까?
영화는 2.35:1 시네마스코프 비율에 흑백이다.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가 상황과 배우에 맞게 적절하게 나와 현실성을 배가시켜준다. 단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음악의 사용이다. 당시의 대작 할리우드 영화들처럼, 감성에 치우친 "좀 뻔한" 음악들의 사용은 이 영화의 유일한 "옥에 티"랄까. 하지만, “인간”과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도 <인간의 조건>은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체험”이었다. 10여 시간의 상영 시간은 몸이 피로했을망정,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이런 위대한 작가를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을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 복잡한 심정이다. 영화는 길긴 했지만, 한 휴머니스트가 “인간”과 “시스템”으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고 본다.
영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나아가려고 했던 가지의 모습이 환영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무엇으로 불리길 원했을까? 이상주의자, 휴머니스트, 빨갱이, 사회주의자... 그 어떤 단어로도 그를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단어들 조차 인간들이 "분류"를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니까.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중 하나로 그를 규정해야 한다면, "인간" 이외의 단어를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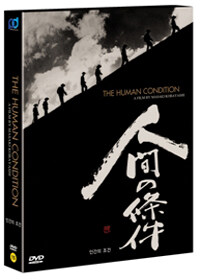
피디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그리고 지금 알라딘에서도 팔고 있는 <인간의 조건>DVD는, 정말 뻔뻔하게도 크라이테리언의 DVD를 그대로 복사한 제품이다. 제작한지 50년이 지나 판권이 풀린 영화이지만, 이 DVD는 누군가가 힘들게 작업한 것을 그대로 훔쳐온 것이다. 책으로 따지자면, 김화영 교수가 번역한 알베르 카뮈의 작품들을 그대로 복사해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우와 같다.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키지 않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절대 동조하시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