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꿀템 토스터와 참외 껍질의 진로와 이데올로기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그냥 구운 식빵인데 왜 꿀맛이 나는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오늘도 식빵을 구웠다. 일단 굽고, 먹으면서 읽으면서 또 굽고. 그걸 먹으면서 읽으면서 또 굽고. 정신을 차려보니 식빵을 10장이나 먹었네? 아, 이런 식빵...... 그렇게 먹어도 식빵 꿀맛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지 못하다니. 분하다. 내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식빵아.
쉬지 않고 참외를 하나 깎았다. 혼자 먹는 데 격식 따윈 필요 없지. 목 따고 엉덩이 따고 노란 겉옷만 벗긴 다음, 길게 세워 들고 통째 먹었다. 햄스터 아몬드 먹듯이. 코를 박고 먹었더니 자꾸만 씨가 코로 들이쳤다. 이런 씨, 이런 씨앗놈...... 참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꼽아 보자면, 저 달콤한 씨를 다 발라내고 민숭맨숭 과육만 먹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참 신비롭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외 껍질의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참외 껍질을 우리 엄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데, 임선생(여친입니다)은 일반쓰레기 수거 봉투에 버린다. ”자기야, 엄마가 참외 껍질 음식물 쓰레기래.“ ”정신 차려, 남친 놈아. 벌금 때려 맞고 싶니?“ ”엄마, 임선생은 그거 일반쓰레기라던데?” “아들. 음식물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냐.” 이것은 고부갈등의 프리퀄일까? 불초 아들/남친은 니 편도 내 편도 들지 못하고 결국 껍질을 칼로 잘게 썬 다음 변기에 내려 보낸다.
낮잠 좀 자볼까 하여 침대에 누워서 스기타 아쓰시杉田敦의『권력』을 읽었는데, 몇 쪽 읽고 계획대로 잠에 빠졌다. 잠들기 직전에 읽은 글들이 얕은 잠 속으로 침입해 자동으로 무한 반복 재생되는 기적이 임했다. 이건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냐. 아, 이런 식빵. 식빵 십장.

스기타는 스티븐 루크스Steven Lukes의 말을 빌려 세 차원의 권력관을 제시한다. 1차원적 권력이 A에게 주어지면 A는 B에게 물도 안 주고 억지로 식빵 10장을 먹일 수 있다. B는 저기 보이는 저 참외가 먹고 싶은데도. B가 발견하기 전에 A가 참외를 치워버리고 도리가 없다는 듯이 식빵 10장을 먹이는 것이 2차원적 권력이다. B는, 참외를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참외가 없네, 싶다. 3차원적 권력의 현장에서도 역시 A가 B에게 식빵 10장을 먹인다. 무서운 것은, B로 하여금 식빵 10장을 물도 없이 컥컥 거리면서 먹는 것이야말로 오랜 꿈이었다고, 아무리 먹을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참외를 먹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3차원적 권력을 이르는 유서 깊은 용어가 있다.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용례에만 한정해 생각해 보건대, 이데올로기는 내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하는 즉시 내게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아니게 된다. 즉,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상태에서는 이데올로기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증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아니라 말처럼 생긴 방구다. ‘네 이데올로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누구는 누구를 적폐라 부르고 또 누구는 누구를 종북이라 부른다. ‘진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영 논리’라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세상에서 ‘진영 논리’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진영의 축대를 쌓고 그 안에 엎드려 적의 식빵과 참외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진영 논리’라는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느 ‘진영’의 이데올로기에 조종되는 바가 있음을 (진심으로는)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나 보니 사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데올로기에 청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식빵, 오직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자, 참외 껍질을 어느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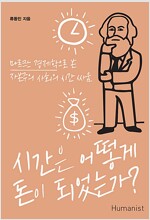


헤겔은 "자유는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온갖 방식들을 두루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일에서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기 시작하리라는 뜻이다. (여기에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일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바로 그 힘들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_ 버텔 올먼, 『마르크스와 A 함께 학점을』
시장은 신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비시장적 삶으로부터는 격리되어 있을까? 만약 전자가 진실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비시장적 삶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소비 주체의 자율성은 바로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시장과 비시장적 삶,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엄격하게 구별하려는 시도가 어쩔 수 없이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대상이 되는 까닭이다. 과감하게 단순화하면, 성장 vs. 분배, 효율 vs. 공평, 비정규직 노동, 민영화, 대학 개혁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싸움은 시장(경제) 논리와 비시장 논리의 싸움이다.
_ 류동민,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자각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이다. 최소한 다른 서사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한나 아렌트가 묘사하는 '전체주의화' 도식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_ 나카마사 마사키,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내 감각과 생각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으면 세상은 단순하고 쉽다. "클래식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양이 없어." "아침형 인간이 생산적이지." "여자가 똑똑하면 밉상이야." "게임은 정신을 좀먹는 마약." 등등. 절대적 가치라는 환상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우매함을 뜯어고치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국의 열정으로 뭉쳐 어버이 연합이 되고, 인터넷을 잘해서 일베충이 된다. 세상 모두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무슨 전쟁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_ 이지원, 『명치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