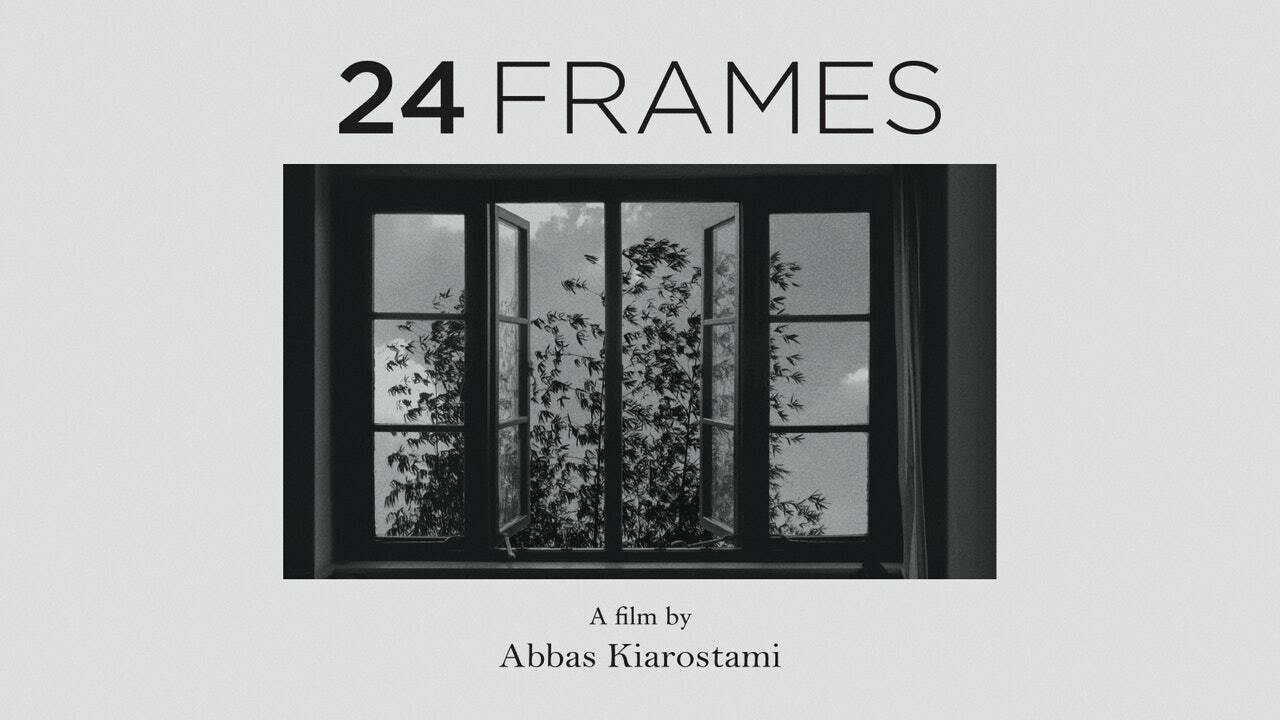'동숭 시네마텍', 참 그리운 이름이다. 1995년에 그 영화관이 문 열었을 때, 마치 새로운 영화 세계가 열린 것 같았다. 동숭 시네마텍의 구조가 관객 친화적이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비좁은 외벽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그곳에 갔던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영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직도 거기에서 본 테오 앙겔로풀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1988)'을 잊지 못한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가 머릿속에 담고 갈 영화일 것이다. 그리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7)'도 그곳에서 만났다. 그때 상영관 좌석은 거의 매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주인공 꼬마 아마드가 달려가는 갈지자(之)
모양의 산길,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공책에 살포시 꽂혀있는 작은 풀꽃. 진짜 그 두 장면이 다였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떴을 때, 굉장히 허탈하고 사기 당한 기분이 들었다. 뭐 저딴 영화가 다 있냐, 하면서 영화관을 나섰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으로 키아로스타미는 그 후로도 불호 감독이었다. 이 양반은 예술 영화를 표방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기술이 있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와 '체리 향기(1997)'를 챙겨서 보기는 했으나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의 장면 장면들이 가끔씩 생각나곤 했다. 나는 그 영화가 가진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쩌면 그 영화는 '세월의 힘'이 필요한 텍스트인지도 모른다. 젊은 나이에는 그런 느린, 매우 심심한 영화를 밀쳐두기 마련이다. 아마도 그의 유작이 된 '24 Frames(2017)'도 나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일 것이다.
영화는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1527-1569)의 '눈 속의 사냥꾼' 그림에서부터 시작한다. 풍경화를 통해 당시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주었던 브뤼겔의 이 그림이 '24 프레임'의 첫 프레임을 장식한다. 키아로스타미는 그림과 사진 같은 정지된 이미지가 순간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 그 전과 후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을 매혹시킨 그림을 비롯해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연속된 장면을 구성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키아로스타미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 쓰인 도구는 최첨단 영상 기술이었다. 첫 번째 프레임의 '눈 속의 사냥꾼'을 응시하던 관객은 그림의 중경에 위치한 집 굴뚝에서 연기가 점차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그와 함께 근경에 자리한 사냥꾼 옆의 나무 위 까마귀가 우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뭐지?'하는 당혹스러움 속에 그렇게 첫 프레임이 지나간다. 영화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24개의 짧은 영상들을 엮었다.
24개의 프레임은 대부분 숲과 나무,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Frame'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대상을 고정된 카메라로 찍은 단일한 롱쇼트가 화면을 채운다. 각각의 프레임에서 무엇이 재료가 된 원본인지 구분해내기는 어렵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프레임은 15번째로 다리에서 파리의 에펠탑을 바라보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나온다. 어둑해지는 저녁 풍광 속에서 아마도 가족으로 보이는 그들은 관객에게 등을 보이며 서있다. 에펠탑에는 불이 켜지고, 그들 뒤로 거리의 악사와 다른 행인이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응시한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에펠탑의 풍경에 매혹된 그들은 멈춰진 시간 속에 머문다. 무슬림, 이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에게 이미지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었다. 그렇게 15번째 프레임에서 나는 영화 감독 키아로스타미의 정체성을 엿본다.
그는 이 영화를 편집하던 중에 세상을 떴다. 남은 작업을 마무리한 것은 아들 아흐마드였다. 키아로스타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니었음에도, '24 Frames' 곳곳에서 죽음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까마귀'의 존재이다. 첫 번째 프레임인 브뤼겔의 그림 속에 있던 까마귀들은 이후 여러 프레임에서 출몰하며, 그들이 내는 소리는 영화 전체를 지배한다. 사냥감의 사체를 뜯어먹는 눈 속의 늑대들, 총 소리와 함께 해변가에 떨어지는 갈매기, 전기톱 소리에 프레임에서 사라지는 두 그루의 나무, 그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죽음'과 이어져 있다.
예외적으로 9번째 프레임에서는 짝짓기 하는 사자 한 쌍이 나온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요란한 풍광 속에서도 무심한듯 생식행위에 몰두하는 이 사자들은 생명의 한 장면을 묘사한다. 그런가 하면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달아나던 사슴 무리에서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숫사슴도 있다. 5번째 프레임의 숫사슴은 도망치는 무리를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그 사슴이 기다리던 또 다른 사슴이 마침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둘은 무리가 떠난 방향으로 함께 떠난다. 16번째 프레임에서는 낯선 타자와의 만남이 그려진다. 들오리는 철망으로 둘러쳐진 집오리 농장을 계속해서 기웃거린다. 집오리와 들오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탐색한다. 그러나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의 존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야생 동물과 가축의 세계를 나눈다.
영화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어두운 창가의 책상에 켜진 노트북 컴퓨터가 중앙에 자리한다. 컴퓨터 화면에는 편집 프로그램이 떠있고, 윌리엄 와일러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1946)' 남녀 주인공들의 키스신이 재생되고 있다. 아주 느린 배속으로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는 주인공들과 함께 서서히 날이 밝아온다. 이 프레임에서 흐르는 노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Love Never Dies'이다. 책상에서 잠든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 앞의 여성은 가끔씩 팔과 머리를 들썩인다. 24번째 마지막 프레임의 모든 것은 부자연스럽다. 뚝뚝 끊기며 결국 키스신에 도달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비롯해 밤에서 아침에 이르는 긴 시간의 밝기 변화는 수 분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는 그러한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가공된 이미지들이다. 오늘날의 관객들은 더이상 영화에서 '현실'과 '가상'의 이미지들을 구분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키아로스타미는 정지된 스틸 컷들의 환상적인 CGI 변환 작업을 통한 결과물을 '24 Frames'로 남겼다. 생의 끝자락에 서있던 노감독은 '영화'라는 매체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영화'의 본질은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매혹에 있음을, 그 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노래한다.
3번째 프레임에서 해변가에 죽은 것처럼 쓰러진 소 옆에 까마귀가 한두 마리씩 날아든다. 파도가 들이치는 가운데 소떼가 드러누운 소 옆을 지나가고, 관객들은 그 장면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됨을 본다. 그러나 파도와 모래에 파묻힐 것처럼 보였던 그 소는 마지막에 벌떡 일어난다. 까마귀는 놀라 날아간다. 누워있는 소의 정지된 하나의 이미지만을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당 24개의 연속된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영화라는 이 요술 상자에서는 기이한 마법이 펼쳐진다. 나 또한 그 마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멀리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스러져 가는 생의 뒤안길에서 영원을 노래하는 이 영화에서 나는 뜻밖의 충만함를 발견했다.
*사진 출처: wikipedia.org 피터 브뤼겔 '눈 속의 사냥꾼',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criterionchann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