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세이>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에세이>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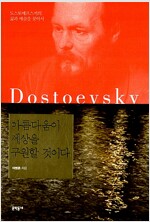
1.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 이병훈, 문학동네
작가들의 삶과 작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은 언제나 흥미롭다. 게다가 도스또예프스끼의 생애, 작품, 예술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서라니 왜 진작 이런 책이 없었는지, 혹은 찾아볼 생각을 안했는지 스스로 의아할 지경이다. 이 책을 읽고나서 한번도 완독하지 못한 도스또예프스끼의 작품들에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2. 파리는 날마다 축제 -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숲
표지와 제목만 봐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지만,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회고록이라고 한다. 역시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으리란 점에서 관심이 가며, 특히 '셰익스피어 & 컴퍼니' 서점과 스콧 피츠제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궁금하다.

3.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 - 소노 아야코, 리수
특정 나이대를 앞세운 이런 류의 책들 이젠 질릴 법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저자는 그 중 원조격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작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는 충분히 좋았으니까 이번 책에서는 또 얼마나 풍성해진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본다.

4. 밀어 - 김경주, 문학동네
제목과 작가에서 한번, 표지 사진에서 또 한번, 목차에서 다시 한번 군침을 삼키게 된다. 나중에 리뷰라도 쓰게 되면 골치아프겠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기대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