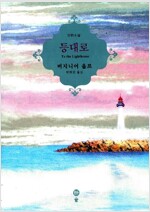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읽기 시작했다.
얼마 전 <올랜도>를 읽겠다고 펼쳤다가 이내 덮어버렸던 기억이 있다. 아 이래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지 싶었었는데 오늘 <등대로> 첫부분을 읽으니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한참을 읽다가 그가 누군지 그녀가 램지 부인인지 릴리인지 헷갈려 되짚어 확인을 해야 하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를 잘 분간해야 하며 그래서 지금 화자가 길을 걷고 있는지 구름 속을 헤매고 있는지 그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머릿속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처음 나오는 어린 아들 이야기에 아이가 있구나 하다가 '여덟 명의 아이'에 놀라 나가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있나 싶게 각자의 생각도 이러구러 달라 당장은 캐릭터의 성격에 집중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생각이라 해서 그것이 대체로 일관적이지도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란 무릇 그런 것이지, 하게 된다.
울프의 인물 묘사가 직설화법인지 패러디인지 구분하는 일이 흥미로울 듯하다. 2004년에 나온 구판과 2019년에 나온 개정판의 번역이 거의 다를 것이 없이 똑같고 좀은 구시대(?)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단어들의 사용이 거슬리기는 한다. 울프의 표현 중에도 "눈은 중국 여자의 눈처럼 조그맣고(구판 36)" 이런 부분 딱 싫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께요. 끙.
그래도! 한마디로 울프는,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이제 겨우 40여 쪽을 읽었을 뿐이고("부인은 간간이 단어들만 주워들을 수 있을 뿐 전체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문장은 흡사 내 마음. ㅎㅎㅎ) 앞으로도 계속 울프의 말솜씨와 번역이라는 2차 난제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일단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단조롭게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 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녀의 생각에 박자를 맞추고 위로를 안겨주는 소리이고, 애들을 데리고 앉아있을 때는 자연이 속삭여주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라는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듣던 자장가 단어들을 다정하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 갑자기, 그러고 의외로, 특히 그녀의 생각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서 약간 떨어져나갈 때는 그와 같은 친절한 의미는 사라지고 마치 유령이 북을 두들기듯이 무자비하게 인생의 박자를 맞추고, 섬이 파열되어 바다에 삼켜지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인생은 무지개와도 같이 덧없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닌게 아니라 그녀의 하루는 이일 저일 서둘러 하는 사이에 덧없이 지나갔다. 파도 소리는 다른 소리들 밑으로 희미해지고 사그라졌다가 갑자기 귀에 쩡쩡 울렸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서 시선을 들어올렸다." (구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