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쓰키 아오이의 [애거사 크리스티 완전공략]을 보다가 아니, 이런 책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다니, 놀라고 있는 중이다.
존 커랜의 [애거사 크리스티 비밀노트 Agatha Christi 's Secret Notebooks]라는 책인데 크리스티의 창작노트 73권(지금까지 발견된)을 조사분석하여 엮은 책, 말이다.
1930년대 이후 작품 창작과정시 만들어놓은 노트들을 참고한 것이다.
존 커랜은 크리스티 공식 뉴스레터 편집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크리스티의 오랜팬으로서 덕후질이 이런 책을 낼 정도로 발전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아오이에 따르면 크리스티가 작품을 구성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트릭'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건데 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크리스티는 작품의 등장인물과 속성을 열거한 메모를 많이 남겼다고 한다.
일단 열명 전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그들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중에서 누군가가 죽는다. 거기서부터 작품을 다듬어나가는 방식. 그러고 나서 복선과 단서를 깔 장면의 윤곽을 그리며 구성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작으로는 [백주의 악마] [죽음과의 약속]을 들 수 있다.



크리스티가 작품구성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게 된 전환점은 1930년대 초에 발표된 [엔드하우스의 비극], [에지웨어경의 죽음]이라고 본다.
그 이전의 작품은 독창적인 '트릭'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언급한 두 작품에서는 그런 트릭이 없다. 작품전체의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행동과 거짓말, 서술의 기교등이 조합되어야 비로소 충격을 발휘하는 유형의 장치들이 주요한 구성으로 떠오른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으로 크리스티는 자신의 추리소설 걸작들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아오이가 뽑는 걸작들, [나일강의 죽음] [다섯마리 아기돼지] [할로저택의 비극]등의 걸작, [죽음과의 약속] 등.
모두 등장인물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걸 창작노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구성하면서 정작 크리스티 자신도 누가 범인인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인간집단'을 규정하고 '피해자'를 결정한 후 인간관계를 채워 넣으면서 범인을 찾아간다.
연극을 좋아했던 크리스티의 특징, 무대위에 모든 인간과 관계를 올려놓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관찰하게 하고,
범인을 찾아가게 하는 스타일을 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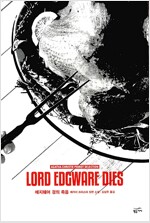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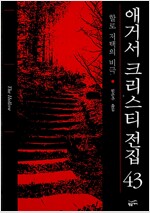
황금가지에서는 전 79권으로 크리스티 전집 완전판을 발간했다. 66편의 장편과 150편의 중단편을 실었다.
정식계약을 맺고 출판한 거라서 국내에서는 이 버전이 유일하다고 봐야한다.
전집 편집자의 초이스로 열권을 따로 뽑기도 하고 푸아로가 활약하는 작품중 베스트를 따로 뽑기도 하는 등 선집도 다양하게 만든 듯하다.
존 커랜의 책에서는 크리스티의 작품 창작의 비밀만이 아니라 작품에 따른 당대 어쩌면 라이벌이었을지 모를 다른 작가의 작품에 대항(?)하는 작품을 구상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본다든지 크리스티가 고심한 트릭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았다고 하는데 왜 이 저작을 번역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 작품들은 황금가지가 번역한 전체 작품중 몇권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읽었으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꺼내놓고 보니 포스트잇도 붙어있고, 앞뒤 빈페이지에도 메모들이 적혀있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나의 뇌는 너무나 순백해. ...
크리스티는 코난도일과 다르게 단편보다 장편에 강했다고 하는데 내게 크리스티가 강렬하게 다가왔던 건 우연히 본 단편에서였을 것이다. 아직도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시에는 수준을 장담할 수 없는 번역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크리스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살인에 쓰인 방법만이 또렷이 기억에 있는데, 바로 백합향이었다.
아마도 불륜, 질투에 의한 복수 혹은 원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살인이었던 거 같은데 아내를 죽이기 위한 정부의 완전범죄시도였을 것이다.
마플이었을까, 마플이 바로 그 범죄를 관통하고 있는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를 눈치챘을 것이고, 밀폐된 방에 놓아둔 백합꽃에 주목했을 것이다. 백합향의 독성을 이용한 살인이었다.
어린 마음에 백합향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백합은 잘 알고 있는 꽃이 아닌가.
그꽃이 그렇게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크리스티를 처음 만났고 나는 그녀가 전설적인 추리작가인줄 몰랐다. 그뒤로 만나게 된 크리스티의 작품들에 나는 얼마쯤 싫증을 냈던 것 같다. 아오이가 지적하듯이 '시골,, 정원, 오후 티타임, 마을 사람들의 인간관계, 뜨개질을 하면서 뛰어난 추리를 펼치는 할머니.... 느긋함, 온화함, 유상상속.. '이런 코드들이 나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듯했다.
귀족이나 부유한 저택에서 벌어지는 좁고좁은 관계들.
나는 아직 크리스티를 알지 못한다. 읽은 것보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이 더 많다.
우선 여기서 언급된 작품부터 시작해야겠다. [나일강의 죽음] 정도를 읽은 것 같다.
요즘 부쩍 여성작가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눈먼암살자]와 비슷한 서술전략을 구사하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답답하리만큼 화자를 구심점으로 그 근처만을 조금씩 드러내주는 반면 화자의 꿈, 과거회상, 생각을 넘나들면서 도무지 화자너머의 세계가 언제끔 드러날지 성급한 마음만 앞서게 한다. 퍼즐들의 조각들이 흩뿌려지고 우리는 언제쯤 그 퍼즐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보게될지 인내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화자는 믿을 수 있나. [눈먼암살자]에서 맛본 배신(?)이 여전히 인상깊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화자인 주인공 '나'를 믿지 않고 읽어가고 있다.
애트우드 작품을 많이 읽고 싶은데 이 작가의 작품 읽다가 담걸리기 딱 좋다.
여성작가들과 내가 별로 친하지 않는데 어째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 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