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짓 안하려했다.
가지고 있는 책도 못읽는 처지에(이런 류의 엄살 정말 싫다..지 사정이지, 왜 징징거리는건지.) 새로나오는 책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침 질질 흘린다.
새로나온 책,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데 분에 넘치는 돈을 쓰고 있다, 노인연금도 일반연금도 받으려면 아직도, 아직도 멀었는데 ㅅㅂ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책에 펑펑(내 수준에는 펑펑쓰는 거나 마찬가지ㅠ) 쓰고 있는데, 아, 이런,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새책 순례를 통해 또 갖고 싶은 책이 생기고 말았다.
금정연의 [실패를 모르는 문장들].
금정연과 정지돈의 [문학의 기쁨]도 다 읽지 못했는데 그 사이 금정연의 새책이 나왔다.
그가 말하길, 이책은 문장론이나 문장 잘 쓰는 법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서평가로서, 매문가로서,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문장들에 대해 얘기한다고 한다.
생각을 몰고 오는 문장들. 금정연의 경우는 어떠한지 들여다보고 싶고, 나 또한 그런 문장들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생전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이사르에 대한 소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꿈은 오랜 소망이었다고 한다. 마르케스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감독도 카이사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역사속 인물인 카이사르는 왠지 신화속 영웅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
콜린 매컬로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가늠할 수 없지만 평들이 좋아서 언젠가는 읽어야지 벼르고만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여자들]에 이어 어느새 [카이사르]까지 나와버렸다.
이쯤되면 [카이사르의 여자들]을 읽어야 할지 판단이 안선다.
예약판매중이다.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6월 19일 예정)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카이사르 편 두권은 사두었는데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런 꿈들이 있다. 유치할 수도 있지만 평생 빠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혹은 한 인물을 갖는 것.
역사속 인물이든, 신화속 인물이든, 소설 속 인물이든, 누구든.
미친 듯 빠져들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안달하는 빠순이의 느낌을 가져보고 싶다.
어쩌면 내 남은 나날은 그런 인물 하나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 가끔 생각해본다.
나는 빠순이가 되고 싶다, 되고 말껴.. 뭐 이런... 좀 어이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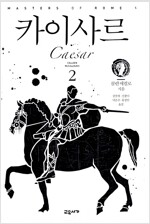




근심어린 독서.
빡빡한 책 읽다 머리가 더이상 안돌아갈 지경이 되면 만만한 글을 찾아 읽는데, 새로 다시 읽기 시작한 소설은 존 르카레의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이다. (3부쟉 중 2부에 해당하는 오너러블 스쿨보이는 도대체 나오는 거야, 마는거야.)
카를라 3부작 얘기를 꺼냈다가 생각난 김에 꺼내다 놓은 책인데 오래전 처음 읽을 때보다 훨씬 쉽다.
존 르 카레의 정치적 색깔이 내가 지지할만한 건 아닌데 소설은 그와 무관하게 읽힌다. 그게 근심이다. 아니, 무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관하고 싶어진다.
영국 첩보당국, 일명 서커스에서 냉전의 최고조 시기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달린 세계 곳곳에서 첩보질을 하며 그 나라의 독립이나 민주화투쟁에 관여해왔다. 고쳐말하면 영국의 이해에 반하면 해당 나라의 민족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척살해왔다고 할 수 있다.
책에도 나오듯이 '스캘프헌터'라는 암살, 납치, 협박, 회유 등 소규모 부대로 운영하는 조직을 두었다. 조지 스마일리 역시 이 공작원들의 선출, 교육 등을 맡아왔다.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의 끄나풀이 될 리키 타르의 진술이 초반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다. 탁 걸렸다.
"그는(리키 타르) ......케냐의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현상금을 노리고 마우마우를 쫓는 일을 했다."(60)
그런데 문제는 각주였다. 역자인 이종인은 '마우마우'에 대한 각주 딱 한 줄 "케냐의 흑인 비밀 결사"라고만 달았다.
케냐는 영국령이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마우마우는 케냐의 민족운동세력이었다. 탄압과 학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우마우는 끝내 영국으로부터 케냐의 독립을 이끌어 냈고 마우마우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케냐, 지금의 케냐의 정치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1963년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마우마우는 '흑인 비밀결사'라고만 알아서는 안되는 저항조직이었다.
조선의용대를 조선인들로 이뤄진 비밀결사 이렇게 알아선 안되듯이 말이다.
.......... 그럼에도 나는 존 르 카레의 소설들을 읽을 것이고 싫어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바그너의 오페라에 대한 바디우와 지젝의 새로운 해석들에서 유의미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홀로코스트의 경험 이후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바그너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바그너의 음악을 즐긴다면, 이로 인해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공모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인가요?" (지젝의 발문에서)
바디우와 지젝의 근심과 미학적 해석이 바그너에 대한 오래된 생각들,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의 화신이라는 생각들에 어떤 미학적, 정치적 해석을 부여하고 있을지 독서를 재촉하는데........ 역시 지젝의 글들은 중반 이후부터 사정없이 꼬여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따라 잡기 힘들다.
사이 사이 존 르 카레의 소설도 읽어가면서 오늘 배송될 금정연의 자꾸 '옆길로 새는'(김중혁의 말에 의하면) 문장들도 보면서 즐거운 근심거리 독서를 해나갈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문장들이 너무 흔하지 않나? 갈수록 뭔 혹할만한 생각들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여튼 초반은 너무 흔해빠진 문장들이라 손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