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리는 토요일.
김영하의 [읽다]를 읽고, 가장 먼저 읽고 싶어진 책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다.
나는 펭귄판 책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 보니 2부 7장 시작되는 곳(184)에 책갈피가 끼워져 있다.
완독한 경우 책갈피는 제거된다. 책갈피가 아직 거기 있는 건 완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곳까지 읽으면서 몇번을 그만 읽어야겠다고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 소설이었다. 플로베르의 의도가 뭥미, 했던 기억.
도대체 핵심은 언제 나오는거야, 왜 변죽만 울리듯이 주변의 디테일에 이렇게 장황해지는거지를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이걸 계속 읽어야해 말아야해, 했었던 기억. 그러다 결국 저 지점에서 책을 덮었을 것이다.
몇년전의 일이다.
그리하여 소설의 줄거리는 다 알지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는 그야말로 '고전'으로 계속 남아있을 뻔 했다.
이번에 김영하의 책을 읽으면서 재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독자들과 끝까지 게임을 벌이는 플로베르.
독자들은 지름길로 '감춰진 중심부'에 도달하려 애쓰고, 플로베르는 쉽게 도달할 수 없도록 독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합니다. (김영하, 읽다, 98)
1차전에서 나는 플로베르가 깔아놓은 미로에서 멈췄고, 후퇴했다.
고전은, 아니 책은 이런 저런 얘기들을 주워듣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직접 읽어야 한다.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비오고 바람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하는 일이다.
자꾸 책에 관한 책, 책을 읽는다는 것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외곽만 돌고 있는 꼴이기도 해서,
그보다는 바로 그 소설을 읽자.
서평가라는 직업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잘은 모르지만) 금정연의 책이 새로 나왔다.
[난폭한 독서]가 제목인데 고전 중에서도 소설의 시원을 얘기할 때 언급되는 책들과 사람들이 많이 읽지는 않는 소설을 선택해 소개한다.
서평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고싶게끔 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해도, 서평가 금정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택한 소설들이 녹록치 않은 책들이라, 과연 직접 읽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흠. 카프카의 [성]과 [소송]은 반드시 읽을 책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다른 책들, 프랑수아 라블레(쿤데라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을 통해 익히 들어온)의 [가르강튀아/팡타그뤼엘]. 볼테르의 [미크로메가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드니 디드로의 [운명론자 자크], 로렌스 스턴의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인생과 생각 이야기],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의 [방랑아 이야기], 그리고 금정연이 읽지 않는 게 좋다고 소개한 플로베르의 [부바르와 페퀴세]. 이 책들을 내가 읽을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책(많지도 않은데..;;)을 둘러보며, 내 남은 평생 이 책들을 다 읽고 떠날 수 있나,.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사를 앞두고 책이 고스란히 짐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책을 갖고 싶다는(읽고 싶다 보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드는 건 아,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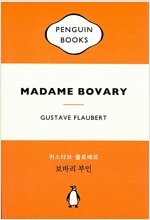


아, 쓰바, ... 탑밴드 보느라 아침이 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