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는 손석희 뉴스룸만 보는데, 지난 월요일 앵커브리핑 제목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였다.
국정원 불법해킹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인냥 대처하는 국정원과 정치권, 그리고 우리의 처지까지를 진단했다.
손석희는 A.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인용했다.
뉴스 보다말고 책을 찾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다.
황금가지판을 가지고 있는데, .... 읽었던 책이다.
기억나는 거라곤 열명의 인디언 어쩌고 해서 차례차례 죽어나갔던 내용.. 정도 외엔 참으로 고맙게도 전혀 생각나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완전 새책, 안 읽은 책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기가막히게 재밌는 이야기다. 구성은 가히 천재적이다. 어쩜 이토록 놀랍도록 뛰어난 소설을, 읽어도 읽어도 언제나 새롭게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미스터리다.
이건 그야말로 상상력의 소산이다.
범행을 재연한다면, 범인은 들키지 않고 재연해 낼 수가 없다. 반드시 들킬 수밖에 없는 행위들일 것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쓰바.
하나 예를 들면, 다섯번째 희생자로 에밀리 브렌트라는 65세의 독선적인 여성이 살해된다.
키워드는 '벌'이고, 정작 살해수단은 청산가리 주사였다. 범인은 아침 식사시간 언젠가 틈을 봐서(범인을 제외하고 아직 4명이나 서로를 의심하며 신경을 집중해서 살피던 상황이었다) 일단 찻잔에 소량의 수면제를 타서 에밀리가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혼자 식당에 남는 (혹은 그 무렵 언젠가) 어느 시점에 움직여 그녀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찔렀다.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에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응접실에 모여 있는 상황, 누군가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을 리 없는데 게다가 그 노래대로 집행하기 위해 '벌'까지 날려주시는, 센스 넘치나 고단하고 위험한 범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밖에 주사기를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 도구들을 훔치고, 감췄다, 사용하기까지 아, 아무리 'a red herring'(훈제청어)가 힌트라지만 ... 글쎄요, 이 번잡하고 고난도 살인 행위를 들키지 않고 의심받지 않으며 행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야말로 크리스티의 재미난 착안과 탄탄한 구성력, 설득력 있는 인물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약간만 삐딱하게 보면 ...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 식이 된다.
들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에도 이번에 읽으면서는 단서가 눈에 띄었다. 주목한 점은 각 인물들이 지닌 과거 범죄 사연에서 드러난 '목격자' 혹은 '인지자' 의 존재다. 자신들은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그 범죄에 목격자가 있거나 그(혹은 그녀)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지하는 자들이 있었다.
난 이 점이 이번에 읽으며 크리스티가 정말 대단한 추리작가임을 인정하게 된 큰 발견이었다. 예전에 읽을 때도 그랬는지... 기억에 전혀 없다.
문제는 이 단서들을 종합하여 추론한 뒤 누가 범인이군, 같은 어떤 결론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개의 추리소설, 특히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은 아마 뛰어난 두뇌를 가졌더라도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에서는 걸릴 대목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에는 미스 마플이나, 포와로, 혹은 홈즈 같은 탐정이 나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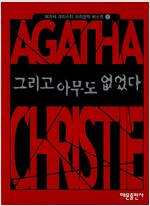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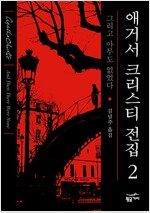
열명이 한명씩 살해되고 자기들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남은 사람들의 공포.
때문에 네 명이 남게 됐을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 공포를 더 조일 수 있을지, 미스터리의 긴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독자를 사로잡을 플롯이 중요해지는데 크리스티는 이런 면에서도 과연 여왕답다.
크리스티 자신이 이 소설의 플롯을 '실현 불가능한 플롯'이라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