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보고 싶은 책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날씨에 책읽으며 보내는 건 나무에 꽃에 미안하잖은가. 그것들을 더 많이 봐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에 겐자부로의 2009년작 -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다 - [익사].
『익사』의 주인공은 이미 오에 겐자부로의 예전 작품들에 여러 번 등장했던 작가의 페르소나 조코 코기토다. 그에게는 유년 시절 강에서 아버지가 탄 배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가 있다. 군인들과 궐기를 준비하던 아버지가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강에 배를 띄웠다가 죽은 일은, 코기토에게는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그는 육십 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장면을 꿈에서 보곤 한다.
소설가인 주인공은 결국 계속 실패해왔던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의 이야기를 쓰게 된다는 것인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천착해서 들려주는 얘기가 뭘지 대단히 궁금하다. 만년에 아버지를 돌아본다는 것, 어떤 문학적 사유를 보여줄지를 들여다보고 싶다.
제목 '익사',... 우리에겐 아, 너무 아픈 단어인데....
얼마전 <삼시세끼> 만재도 편의 한 에피소드를 우연히 보다가, 만재도 앞바다의 회색같은 날과 만났다.
이번 만재도 편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지나가다 하필 그 장면을 봤다.
뭔지는 모르지만, 유해진이 바위 비탈에 앉아 고기잡이하는 장면이었다. 바다는 그야말로 폭풍이 오기 전처럼 '부풀대로 부풀'어 올라 거대한 장막이 술렁이듯 파도는 두껍게 몰려왔다 가곤 하는데, 날은 곧 비라도 올듯이 캄캄해져가는 그런 장면.
만재도 앞바다는 강렬했다. 순식간에 품어줄 수 있을 듯해 보였다. 어떻게 그런 때에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 .... [익사]에서의 아버지가 배를 띄운 곳은 강이다.
게다가 역자 박유하는 최근 뜨겁게 오르내리는 인물 중 하나인 모양이다.

레이먼드 카버의 [풋내기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카버 원본을 되살린 책이다.
편집자였던 고든 리시가 손대기 전 카버의 것. 다만,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목으로 뽑은 기획편집자의 한수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읽었던 단편들이지만 예전과 전혀 다른 거 아니겠는가. 첫편 <춤추지 않을래?> 하나 읽었다. 좋다. 카버의 단편은 언제 읽어도 스릴이 있다. 일상이란 때론 스릴러 못지 않게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최근에 본 영화 <버드맨>에 이 소설이 주요하게 쓰여졌다. 환갑을 맞은 옛 헐리우드배우 '버드맨'이 연극판으로 돌아와 첫 제작자이자 주연으로 손댄 작품이 바로 레이먼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혼났다. 요즘 내가 시도때도 없이 울다보니, 그러나 영화, 좋았다. 어쨌든 초라한 자기의 존재증명을 해야 하는 인생 이야기로 봤다. 더구나 한물 간 배우, 예술가로서 겨우겨우 존재증명해 나가며 버티는 이야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가엾은 인생이 떠올라 주체하기 힘들었다. 연극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피로와 공허를 채울 순 없을 것이다. 아, 씨바.
주인공은 대학시절 연극무대를 찾은 레이먼드 카버가 자신에게 건네준 냅킨(!)을 평생 간직해왔다. 연극으로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준 메모. 그것이 그렇게 단 한순간에 변할 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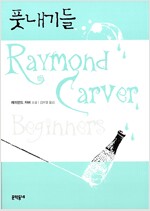
그리고 기형도.
기형도는 두번째 시집을 준비중이었고, 아마 시집 제목을 [내 인생의 중세]로 지을 것이라고 마음 먹었을지도.
이제는 그대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요
너무 오래되어 어슴프레한 이야기
미루나무 숲을 통과하던 새벽을
맑은 연못에 몇 방울 푸른 잉크를 떨어뜨리고
들판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나그네가 있었지요
생각이 많은 별들만 남아있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무들은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내 느린 걸음 때문에 몇 번이나 앞서가다 되돌아오던
착한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나그네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지요
요한 하위징아의 [중세의 가을]을 탐독하고 있던 때라서였는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난, 아직도 이 책을 읽지 못했기에 읽어보려 한다. '내 인생의 중세'라,,,,,,, 어미 '-지요'를 고른 것도 시인답다.

책장에서 꺼내진지 오래지만 여전히 읽다 말다 하고 있는 책들....
쿤데라는 왜 불멸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불멸은 죽음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걸 말하고자 한 것이었을까.
어서 어서 읽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