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우스나 율리시스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동동 떠다닌다.
원래 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고 소재일 수 있는데, 마음에 두자 더 눈에 띄는 것이다.
몇년 전에 구입해서 그냥 모셔두고 있는 책 중에 맬컴 라우리의 [화산 아래서]를 우연히 발견.
한 알코올 중독자의 초현실적인 하루에 비친
20세기 가치들의 충돌과 몰락
[율리시스]에 비견되는,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소설!
'천재적인 작품'이라는 찬사가 줄을 잇는데,
1년에 단 한 번, 죽은 자들의 영혼이 현세에 머무른다는 멕시코의 전통적 축일 '죽은 자의 날 Day of the Dead' 단 12시간 동안의 이야기로, 주인공의 의식을 통해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멕시코 사회의 비극적 상황과 스페인 내전으로 위기에 빠진 유럽의 모습까지 그리고 있다. 환상과 환상으로 점철되는 의식의 흐름,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평, 삶의 닻을 내릴 자리를 찾아 헤매는 멈출 수 없는 여정... 20세기라는 거대한 괴물의 시대 앞에 무력했지만, 투쟁했던, 한 알코올 중독자의 초현실적인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본문만 541쪽이야. .......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오디세이아]. 책소개.
12년 동안 일곱 번이나 개작을 한 끝에, 마침내 1938년 가을 <오디세이아>가 세상에 선을 보이자 문단은 즉각적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떠올리며 '호메로스 이후 가장 치밀한 오디세우스의 초상이요, 현대의 혼란과 열망에 대한 보기 드물게 포괄적인 상징'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두 작품 모두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을 다루었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골격을 빌려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잔차키스는 '호메로스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과거의 서사시를 현대에 맞게 각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에서 주인공의 성품과 모험담을 빌려다 쓰기는 했지만,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작가가 평생 동안 천착했던 세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인식이다. 초기작들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카잔차키스의 '투쟁하는 인간'상이 이곳에 와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과 '투쟁하는 인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장장 세권에 걸친 서사시를 또 어느 세월에 읽을 수 있겠는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하는거라는 건데... 평생을 엉거주춤 사는 사람에겐 뼈아픈 말일 수 있다.
기억나는 대사가 있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불꽃>에서, "당신은 평생 바지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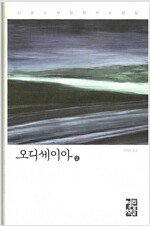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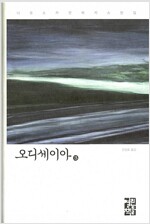
[눈먼 암살자]의 마거릿 애트우드, [패널로피아드].
아, [눈먼 암살자]는 다시 한번 읽고 싶다. 애인을 기다리며 소설을 쓰는 여자. 소설 속의 소설, 기억과 오욕... 늘 다시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나중에. .................
[패널로피아드]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이야기다.
전세계 31개국 33개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되는 <세계신화총서>.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 생성된 신화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쓰는 출판 프로젝트로, 1999년 기획되어 2005년 10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중략)
<페넬로피아드>는 페넬로페와 교수형 당한 열두 명의 시녀들의 관점에서 <오디세이아>를 새롭게 쓴 작품이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특유의 위트와 기백, 그리고 그녀의 명성을 실감케 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한껏 발휘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 오디세우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역마살과 여성편력, 영웅 콤플렉스를 견디며 평생을 정숙한 아내로 살아야 했던 페넬로페의 숨겨진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오디세우스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하는 페넬로페의 목소리가 1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작품을 이끈다. 여기에 열두 명의 시녀들이 등장해 동요, 비가, 목가, 뱃노래, 민요, 연극,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한 재판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한다. 오디세우스와 그 주변 인물들을 비꼬고 놀림거리로 삼고 비밀을 폭로하는 이 시녀들은 수시로 그 목소리와 가면을 바꿔쓰는데, 그때마다 글의 형식도 변화한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와 페넬로페의 (구혼자들과 놀아났다는)시녀 열두명을 처형한다는 건 호메로스의 원작에 나온다.
아시다시피 조이스의 [율리시스] 마지막은 몰리(페넬로페)의 "Yes"로 끝난다. 역시 다시 돌아온 남편을 맞으며.
애트우드는 그 뒤, 돌아온 남편이 행한 일들에 대해 뒷담화를 까는 건가? 재미는 있겠지만 ... 내 취향은 아닐듯.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다.
[전쟁과 평화]는 1권 1편 읽기를 마쳤다.
1편의 마지막은 전장으로 떠나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의 가족과의 이별 장면이다.
드라마다.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리 만무...할까?
율리시스와 다른 얘기지만, 데이비드 하버트 로렌스의 [사랑에 빠진 여인들] 번역판이 새로 나왔다.
데이비드 로지의 [소설의 기교], '상징성'을 다루는 항목에서 보고 궁금했던 소설이다.
로렌스와 토마스 하디 작품은 꼼꼼히 봐둘만하다는 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다.
이 책도 쪽수가 장난아니다. 본문만 아마 8백 쪽이 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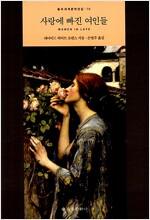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다. .... 그래도 이건 읽어보고 싶다...
나도 여자긴 한데... 내가 봐도 여자가 좀 신기해야 말이쥐.
... 나는 여자들의 장지갑이 정말 신기하다. 여튼 여자들이 쓰다듬곤 하는 물건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죄다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