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았다는 보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 33~35%대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생각했는데, 40% 정도가 콘크리트 지지율인 듯 싶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선. 아, 무섭다. 그리고 별로 기대할만한 세상이 못된다는 걸 다시 확인한다.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 중 하나가 이 사회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미국같은 나라의 보수당과 같은가?
일제시대, 해방후, 이승만의 한독당, 박정희의 자유당,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이 뿌리를 인정하라고?
그들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가 30%를 훌쩍 넘고 40%에 이르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미안하지만 늘 이 정도 수준에서 맴돌거라 생각한다. 이게 내가 사는 나라다. 어쩌겠나? 난 떠나고 싶은 마음 없다. 떠날 수도 없고.
5월 독서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잡아봤지만 ... 풋, 언제나 그렇듯, 잡아놓은 고기 밥 안주듯, 챙겨놓고는, 다른 책들을 보고 있다.
책을 구입한지 좀 됐지만, 이제야 떠들어 보고 있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서간집,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대실해밋과 레이먼드 챈들러의 스타일이 좋다. 지난 달, 조금씩 조금씩 읽으며 몸 떨리게 좋았던 대실해밋의 중단편집, [중국여인들의 죽음]
이미 발간된 그의 전집을 구입해 읽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의 작품을 대하며 내가 그의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다.
짧고 간결한 문장, 얼척없는 비유를 통한 유머, 알짤없는 도약, 세상사에 대한 참혹하지만 별일아니듯 주어삼킬 수 있는 쓸쓸하면서도 담백한 냉소, 낭만적인 인물들까지.
대실(1894~1961)은 환갑이 넘어,
"내가 자기 복제를 하는 것 같아서 글쓰기를 관뒀다.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한 순간,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1956)
라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를 절망케 한 것이라니, 비극이다.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진, '챈들러 스타일'.
자신은 '영감을 기다리는 편'이라며,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생명력을 지닌 글이라는데,
'전업작가라면 적어도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는 글쓰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글을 쓰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저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초보작가는 따를 만하지 않나 싶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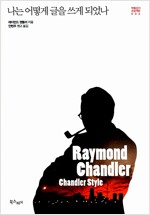

[보바리부인]은 거의 5년 여에 걸쳐 작업됐는데, 1851년에 '나는 어젯밤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문체의 어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로 편지를 쓰며 알린 지 5년 뒤, 플로베르는 1856년, 오랜 지인이자 <라 르뷔 드 파리> 편집자인 뒤 캉에게 원고를 보낸다.
뒤 캉은 너무나 상세한 묘사들 때문에 '평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별로 흥미롭지 못한 문체의 복잡한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할 권리를 달라고 보챈다.
물론 플로베르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보바리부인]은 풍기문란을 이유로 법정 소송도 당하고 잡지에는 삭제된 채 대신 이유가 들어선 연재를 겪는 등, 난리 법석을 겪은 후 별다른 수정없이 출간하게 된다.
플로베르의 문체에 대한 과도한 근심은 꽤나 유명한 모양이다.
'자신의 필체를 보기만해도 구역질이 날 때까지 수정을 계속'해대는 작가였다.
작가의 팔자도 참. ...
여튼 그런 작업 방식을 지닌 플로베르의 [보바리부인]이니, 정말 세심하게 읽어야 하지 않겠나.
샤를과 엠마가 결혼 후 엠마의 권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읽은 후 나의 독서는 멈춰있다.
이번에 읽을 땐 달리 보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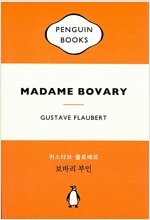

줄리안 반즈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는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난다. 다시 읽어봐야할 책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자서전도 도서관에서 빌려다놨는데, 읽을만 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비슷한 것]도. ... 자서전, 자서전 비슷한 것, ...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은 어떤가.
그런데... 다들 오래전 사람들이다.
악필인 작가들도 있는 걸로 알지만, 대개는 정서가 정연한 작가들이 많은 듯하다.
출력된 인쇄물이아니라, 글씨로 저마다의 성품을 보여주며 쓰여진 원고나, 수정고들을 보노라면, 늘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쨌든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살다 간 것이니까.
당일배송으로 어제 왔어야 하는 책이 여태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건 딱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