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연, 전 알라딘 인문MD의 [서서비행]도 최근 읽었다. 나, 아주 바쁘다, 흐흐.
새로운 글쓰기의 개척이랄까. 이걸 뭐라 규정해야 할지 모른다. 책에 대한 아주 나~이브한 에세이라고 할까. '매문'의 새로운 차원. 재밌게 봤다.
제임스 우드의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가장 재밌는 글은 <젠틀 매드니스, 점잖게 미치기>.
첫 문장, "정말 넌 책을 그만 읽어야 돼."
짧은 글인데 정말 재밌다. 현실 없는 책서치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그래도 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이에게, 특히 이 얘기에 나오는 그 친구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절대 책을 권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을 정도로 눈치를 가동할 줄은 아니까. 금정연 작가의 소설도 기대해볼만 하다.
<이것은 김사과다 : '테러의 시'>. 김사과의 W.G 제발트에 대한 글을 다시 보게 한 것.
아니, 처음 접하게 한 것. 프레시안 Books 65호에 나온 김사과의 "소설에서 '윤리'를 찾는 나르시스트에게 고함"(2011년 11월 11일)이라는 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의 첫 책은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였다.
이렇게 다시 올 초의 첫 책과 다시 만나게 되다니. [토성의 고리]는 결국 반 정도 읽다가 멈췄는데, 김사과의 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면 새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금정연에게, 김사과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다시 [토성의 고리]군.
이 시대 '문학의 윤리'가 문학에 대한 '세련된 알리바이'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김사과의 말은 잘은 모르지만, 금정연의 '매문'에 대한 자의식과도 통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모든 매문하는 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는. 그냥그런 느낌, 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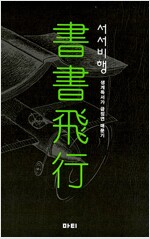



김사과의 글 좀 보자니, 막 이런 책들까지 한꺼번에 언급된다. 읽은 게 없다. 아, 보스헤스의 [픽션들]은 황병하 번역판으로 읽었다. 민음사에서 나온 송병선 번역은 아직 보지 못했다. 새로운 번역인데 금정연에 따르면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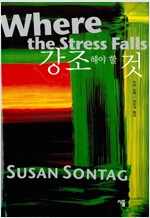



미셸 우엘벡의 [지도와 영토]
수전 손택의 [강조해야 할 것]
보스헤스 [픽션들]
루이 페르디낭 셀린느 [밤 끝으로의 여행]
수전 손택의 [강조해야 할 것]은 로쟈님의 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상당수 다루고 있어', '예술에 대한 안목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맥락을 알 수 없기에 헤맬 수도 있'단다.
책들을 읽고 살지만 최근 내가 읽는 책들이 더해주는 '허함'이 있다. 충족되지 않는 책읽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현실을 더 팽팽히 당겨주는 그런 책읽기가 필요한 것 같다. 책을 읽는데도 허기가 느껴진다면 삶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가... 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