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D 맥도널드의 [푸른 작별]의 원제 - The Deep Blue Good-by
원제가 훨씬 감성적으로도 와닿는 제목이다, '푸른 작별' 보다는.
트레비스 맥기는 전설적 캐릭터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니, 이건 뭐 여자를 구조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캐릭터인 듯 느껴졌다.
깨지기 쉬운 여자들이 온통 가득하다. 그와중에 맥기는 때론 그 순진무구함 '들'에 안타까워 차라리 분노하고,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에 참으려 애쓰지만 결국 여자 품에서 오열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박하지 못한 채 자신의 거처, '나의 집'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버스티드 플러시(포커에서 같은 모양의 카드 다섯 장을 모아 플러시를 만들 수 있었으나 한 장이 모자라는 패를 가리키는 용어)'를 몰고 또 다시 떠난다, 새로운 '구조'를 위해.
그래서인지 번역자 송기철의 번역이 우리의 번역 풍토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얼마나 그런 인식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특히 맥기와 여자들의 대화에서 지금 이 대사가 누구의 대사인지 언뜻 구분이 잘 안가, 하나하나 이건 여자, 이건 맥기... 하면서 보게 된다. 나는 그랬다.
여자는 존대, 남자는 거의 무조건 반말, 이게 우리의 번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식아니었나? 처음엔 서로 비슷하다가도 섹스 한번 한 후에는 여지없이 반말 모드가 되는 남자 캐릭터들이 수두룩한 우리의 세계에서 이번 번역은 그 낯섬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이거 너무 의식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단히 하드한 장르인데다 번역이 그러하니 독자 역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지는 않는다. 맥기의 '순정' 보다는 그래도 필립 말로의 냉소적이면서도 마른 분노와 뒤를 봐줘야 하는 여자에게는 철저히 뒤를 봐주는 심성(달리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텐데)이 나는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허나 맥기와는 고작 첫 만남이었을 뿐이다.
시리즈의 첫 책인데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 끝까지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 맥기가 더 보고 싶다!!!!
하드보일드와 관련해서는, 나아가 범죄소설과 관련해서 김용언의 [범죄소설]도 함께 보면 생각할 거리가 있을 듯도 싶다.
특히, 레이먼드 챈들러의 [안녕 내사랑]이나 [하이윈도] 등에 대한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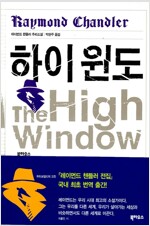
어제 대선 TV토론을 기대않고 봤는데 와, 놀랐다. 그러나 내가 더 놀란 건 다카키 마사오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점이다. 토론에 대한 댓글이나 트위터 반응을 보면서 무척 놀랐다. 잉? 이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렇구나........ 공중파든 종편 뉴스채널이든 가리지 않고 TV토론에 대해 보도나 패널 진단, 토론을 보니 이 정도로 잘 '정제'된 보도를 하는구나, 언론환경에 진저리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