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참으로 대단했다.
십 수년 만의 혹서. 그래도 난 여름에 강한 여자.
베란다 창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생전 처음 태풍에 무서워 떨었다. 살아본 중 제일 높은 곳에서 살다보니..., 후폭풍이 뭔지를 확실히 느낀 태풍이었던 것 같다. 겁이 많아졌나. 아, 무서웠다니까.
그러고 문득 한밤중에 깨어나 밖을 내려다보면 너무 청명해서 쓸쓸해질 지경이다. 밤에 깨는 게 점점 두려워지는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 베란다에서 멀리 바라보면 큰 길가 신호등이 보이는데 한밤중에 그저 빨강과 녹색등이 번갈아 켜지기만 할뿐, 아무도 건너지 않는 횡단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텅빈 거리만큼이나 머리 속도 마음도 훵해진다. 그런게 두려워.
알라딘 서재를 하면서 느는 거라곤 책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 뿐인 것 같다. 물론 지식이나 정보도 얻지만 그 보다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책 바라기를 하는 것 같다. 좋지 않아.
어제는 정민 교수의 '삼국유사 깊이 읽기' [불국토를 꿈꾼 그들]과 엘러리 퀸의 [스페인 곶 미스터리]가 왔다. 더불어 <프레시안 북 리뷰>신문판과 <추리신문 Vol.1>이 함께 왔다.


오랫만에 정민 교수의 책을 읽는다. 한때 정민 교수의 책을 열심히 읽었고 좋아했는데, 그 동안 격조했다.
사실 [삼국유사]를 읽을 때 글자야 아는 글자라서 읽을 수는 있으나 이게 도대체 뭔 얘긴진 모르는 해독 불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가. 정민 교수는 그 이유가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잃어버린 코드, 숨겨진 비밀의 코드를 찾아주는 정민 교수는 탐험가이면서 이야기꾼이기도 하겠다. 늘 이런 책이 나와주길 바래왔다.
정말 오랫만에 삼국시대로 간다. 책은 사진 때문인지 무거운 종이를 써서 전체적으로 무겁다. 정좌한 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엘러리 퀸의 국명 시리즈는 뭐 그렇게 대단한건가 그러면서도 한권 한권 사다보니 이건 뭐 빠뜨리면 안될것 같은 은근한 집착증이 생겨버렸다. 정작 읽은 건 로마,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4권 뿐이다. 그리스관은 뒷부분을 채 읽지 못했고, 샴 쌍둥이도 절반 정도 읽다가 뒀고, 이집트, 미국, 프랑스는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다. 엘러리 퀸 뿐이랴, 사놓고 머리말도 읽어보지 못한 책도 많다. 그런데도 오늘 당일배송이 가능한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도 올 예정이다. 이건 주말에 읽어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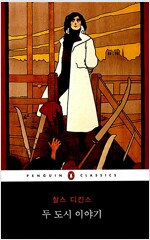
야심차게 기획한 계획도 있다. 하고 싶었던 공부이기도 하다. 9월에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 근현대사 관련 책읽기도 책만 쌓아두고 있고, ......... 9월에 부디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란다.
그런데 어제 받은 두 가지 신문을 읽으며 또 다시 보고 싶은 책들을 체크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걸까.
먼저, 마쓰모토 세이초의 소설들과 논픽션. 미야베 미유키의 미처 읽지 못한 책들.
권혁태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소개한 마쓰모토 세이초의 [일본의 검은 안개]는 사회파 추리 소설가로서 마쓰모토 세이초가 1945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로 풀 수 있다고 '추리'한 사건들을 선보인다고 한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서 일본을 함께 생각하는 중인데, 마침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로
존 다우어의 [패배를 껴안고] 권혁태의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도요시타 나라히코의 [히로히토와 맥아더] 야마구치 지로의 [일본 전후 정치사]까지 소개했다.
보관함에 담겨 있던 책들인데 구입까지해서 소장해야 하나 망설였던 책들이기도 하나 이제는 우리 근현대사와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되기도 했다. 뭐,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
또한 최근에 나온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읽어볼만 하겠다.





우시다 타츠로의 [일본변경론]은 100여 페이지 정도 읽다 뒀는데 ........'교묘한 무지' 전략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았다. 끝까지 읽어봐야겠지만 생각보다 교묘하게 변명조가 많은 듯하여 기분이 나빠지는 대목이 있었다. 진정 무지한 건지 교묘하게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저자의 진정성을 잘 모르겠더라. 이 백여 페이지도 읽은지가 좀 되다보니 가물가물하다. 흑.

김기원의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의 정치력'을 돌아본다는 1부가 궁금하다.

기타 등등.
제목 땜에 궁금해서 순전히 혹시나 하고 산 책이 [철학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돕는가]다.
절대로 구입하지 않는 책들 중 하나가 이런 책인데 철학과 정리정돈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지 그게 또 무척 궁금하더란 말이지. 독일 대학에서 문화학을 전공,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철학상담실'(우리에게는 철학상담소가 있지 않나? 허긴 요새는 타로가 대센가?, '실'과 '소'의 다른듯 같은 맛, 훗)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나 슈미트라는 여자의 철학적 실용서 정도 되는 듯하다. 물론, 사놓고 몇 페이지 읽다 뒀다.
책상을 정리하고 버릴 걸 버리는 것을 넘어서 머리 속을 정리하는 데 철학을 동원했다는 건데 얼마나 쓸만한 건지 읽어볼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