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에서도 날이 밝고 해가 진다. 모처럼 긴 휴가(안식년도 있음 좋겠네, 년까진 아니더라도 달이라도)였지만 1초도 멈추지 않고 가는 시간인지라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오고 있다. 원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을 계획이었는데 전권 구입해 열맞춰 꽂아놓았을 뿐, 정작 읽고 있는 건 강준만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시리즈이다.
근현대사를 통독하는 건 대학 이후 아마도 처음이지 싶은데 역시나 다시 봐도 화딱지나고 절망스러울 뿐이다.
또다시 19세기 말이나 전후 세계정세와 같은 격동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조선의 멸망도, 해방도, 해방 후 전선도 우리 힘으로 결정한 바 없다. 뼈아픈 것이다. 우리는 늘 잊고 산다. 외세와 편먹기만 따지다보니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느니, 씨바, 얼마나 근본을 세우지 못했으면 친일파들이 지들 재산 돌려달라고 소송따위를 할 수 있냐? 올림픽이 한창이다. 개막식 장면에서였던가 언뜻 문대성 '의원'의 얼굴이 잡혔다. 내 참. 한국 스포츠외교의 현주소도 그 모양이다. 경제사범이든 뭐든 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면받아 외교 현장에 가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묻지마 투표로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다. 이분과 이분들의 측근들이란 어찌나 꼼꼼하고 성실하신지(얼마나 적절한 말인가)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이들도 살뜰히도 보살펴주신다. 컨텍터스라는 용역경비업체 소식에 모골이 송골해질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시위와 노조분쟁의 해결사'를 자처한다는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대테러나 국제분쟁사태에 민간군사용역업체가 투입되는 문제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거니와 자국내에 공권력 영역까지 민간업체를 허용하는 틈을 준다면 이는 곧 백색테러가 난무하게 되는 꼴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절대로 안된다. 정말이지 저들의 꼼꼼함과 성실함에는 늘 놀랄 수밖에 없다.
휴, 우울한 책들만 보다보니 마음이 어둡다. 한동안 빠져있다 눈을 떠 돌아보니 새 책들이 또 유혹한다. 가지고 있는 책들도 읽지 못하고 있는 판에 또 다시 곁눈질을 하는 게 어리석지만 일단 보관함에 챙겨놓고 보자.
우치다 다츠루의 [일본 변경론]. 소개된 몇 구절들만 보아도 하, 이상하고도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변경성'이 '숙명'이고 '불행'이라는 관점에 선 저자가 '변경성이라는 숙명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해도 팽팽한 승부를 벌일 수는 있'다고 썼다는데(15페이지) 이건 또 어쩌면 이다지도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 닮았는지. 몇 페이지 인용된 문장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느낌은, 같은 생각 다른 역사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심해가면서 읽어야할 것이다. 일본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는데 우리로서는 일본은 때만 맞춰지면 포문 하나라도 걸치려 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 일본의 지식인들, 국민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딴나라 사람들일 뿐. 새길만한 게 있을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한동안 소설도 뜸했는데, 신간들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나와주신다.
일본작가들, 또 일본이네 ....... .
히가시노 게이고가 작가생활 25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들 중 하나라는데 새로운 캐릭터도 런칭한 모양이다. 몇 주년 기념 사은품이나 기념품도 아니고 작가생활 몇 주년 기념하는 의미로 작품이 나온다는게 탐탁치 않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이고의 깔끔한 신공을 구경하는 맛이 있으니까 피해갈 수는 없겠다. 가장 최근작은 [나미야잡화점의 기적]이라는데 이 역시 곧 번역되겠지? 호텔과 잡화점, 이 두 가지 장소, 키워드로 어떤 얘기와 사람들을 만들어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지난번 [신참자]도 아주 재밌게 읽었다. 구성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본격추리물과 작별한지 오랜지라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맛은 없지만 말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공식 가이드]에 의하면 독자들의 인기투표 결과 발표작품 77편 중 [신참자]가 4위이군.
하루키의 에세이집들이 나온다는데 다 구입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도 읽지 못했지만 이번에 나온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은 읽어보고 싶다. '챈들러방식'이 궁금하니까. 올 봄이었나, [양을 쫓는 모험]을 다시 읽었는데 심하게 언짢아졌었다. '어쩔 수 없음'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력해보였고 비겁해보이기까지 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3년의 핀볼] 그리고 [양을 쫓는 모험] 3부작을 완성했지만 [양을 쫓는 모험]([양을 둘러싼 모험])이 미흡하게 느껴져 속편으로 쓴 게 [댄스댄스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댄스댄스댄스]에서는 저항했던 거 같다. 댄스댄스댄스이지만. [댄스댄스댄스]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은 [양을 쫓는 모험]부터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시기의 에세이들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도 맞네.




헤밍웨이의 소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까지 나온 모양이다. 문학동네는 헤밍웨이 작품을 더이상 내지 않는다하고, 민음사(김욱동)와 열린책들(이종인)에서 나란히 나왔는데 두 권 분권된 책이라 두 출판사꺼 모두를 살 수도 없고 난감하다.
[무기여 잘 있거라]를 열린책들판으로 샀는데 좋았다.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감성을 자극하는 짠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민음사판을 사야할까?




아니 열린책들이 좋겠다.
열린책들 얘기가 나와서, 얼마전 문화사회학자 김정운 교수가 이 책을 읽고 사표를 던졌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도대체 '이 책'이 뭔지를 따라가봤더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였다. 책은 열린책들이 아니라 더클래식 세계문학컬렉션으로 나온 거였지만 예전부터 이윤기 번역의 열린책들판을 보관함에 담아두고 있던 터였다. 마치 자유인의 표상처럼 얘기되는 조르바를 나는 어렸을 적 앤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 <희랍인 조르바>로 만났을 뿐이다.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자유'란 도대체 뭔지, 이제 늙고 좀더 늙고 아주 늙을 날만 남겨둔 나이에 자유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 좀 정리가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라도 좀 읽어봐야겠다.

그밖에 '회사 3부작'을 완성한 임성순의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모아두긴 하는데 아직 한권도 읽어보지 못한 필립 K 딕 전집의 최근 번역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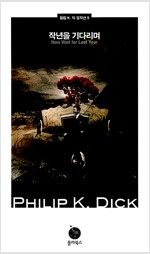


'카뮈와 사르트르의 정치사상' [폭력에서 전체주의로]도 궁금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