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폭풍독서라 할만하다. 정말 오랫만에 맛보는 진공상태로의 몰입. 여튼 정신없이 읽으며 보냈는데 그렇다고 리뷰라든지 좀더 상세한 독후감은 쓸 수가 없다. 요즘 묘하게 중독되는 김어준 총수의 말투를 흉내내 말하자면, 리뷰쓰기 '싫다!', 더 정확하게는 '못해!' 쓸 능력이 안돼!
책 첫 페이지에 작년 10월 25일 날짜가 쓰여 있다. 이 날짜가 책을 이 날 받았다는 건지, 이 때 읽기 시작했다는 건지, 내가 써놓고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찾아보면 둘 중 하나의 날짜일텐데,... 귀찮다!
어쨌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다. 일개 상품에 '문화적 무게감'을 실리게 한 시대의 인물을 다루는 무게를 감당할만한 저자의 솜씨도 좋다. '당신의 아이팟에 담긴 음악이 당신을 말해준다'. 취향과 스타일의 시대.
히가시노 게이고의 초기작 [마구].

게이고의 소설은 늘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깔끔하달까, 군더더기가 없다.

반면에 노나미 아사의 [얼어붙은 송곳니]는 군데군데 장황스러워진다. 이 소설은 유하 감독의 도시 3부작 중 마지막이 될 영화 <하울링>의 원작이라고 한다. 원작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형사와 경력 많은 남자 형사 캐릭터 간의 충돌과 변화, 늑대개에 의한 연쇄 살인, 그리고 마지막에 늑대개와 그 뒤를 쫓는 여형사의 오토바이 추격신 등 영화화해 볼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는 듯했다. 이나영과 송강호가 주연이다. 유하 감독이 두 캐릭터에 원작과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 궁금해진다. 진부하지 않기를.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는 읽는 중이다. 잡스 때문에 밀려났다. 재미없는 건 아니다. 5장은 영국 사우스월드 지방에 도챡해 우연히 보다 잠이 든 다큐멘터리를 빌미로 재구성된 인물과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비교적 선명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흥미로웠다. 1916년 런던 감옥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한 로저 케이스먼트를 추적해가면서 영국인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착취(여기서는 콩고)에 대한 실상을 언급한다. 이 얘기의 매개 인물은 조셉 콘래드이다.
제발트 때문에 배수아를 다시 떠들어봤다. 지난 7일자 프레시안 BOOKS에 실린 소설가 김사과의 글 때문이었는데, 김사과는 제발트가 배수아에게 각별한 영향을 끼친 작가라고 알려준다.
"제발트의 글쓰기와 배수아의 글쓰기가 갈라지는 지점은 히스테리의 유무, 그것이 제발트 보다 배수아의 글이 더 흥미로운 이유다. 히스테리가 없는 제발트의 글쓰기는 유려하지만, 균열이 없고 매끈하게 봉합되어 있다. 배수아의 글쓰기는 균질적이지 않고 과잉되어 있다. 그래서 제발트의 글쓰기가 꿈처럼 독자들을 마비시킨다면, 배수아의 히스테릭한 글쓰기는 독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 제발트가 유럽의 종말적 풍경에 압도되어 보르헤스적인 꿈의 세계를 어슬렁거렸던 것처럼, 카프카가 자신의 현실의 곤경을 재료삼아 관료들로 이루어진 악몽의 세계를 설계했던 것처럼, 배수아는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현실의 압력을 재료삼아 길을 잃은 목소리들이 떠다니는 꿈의 세계를 짓고 있다."


배수아의 책은 [올빼미의 없음]을 한 권 구입해 놓고 그 세계가 궁금해서 들여다봤지만 잘 모르겠다. 그의 소설에서 뭘 봐야 하는건지. 아주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낯선 것만은 분명하다. 새로 나온 소설집 [서울의 낮은 언덕들]도 낯선 세계, 낯선 취향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읽어볼 예정이다.
지젝의 [폭력이란 무엇인가]도 끝을 내야겠기에 나머지를 읽었는데, 제발트의 소설이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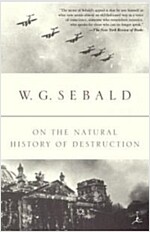
[On the Natural History of Destruction]
지젝의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읽다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뮤스가의 살인]도 궁금해졌다.

[뮤스가의 살인]은 초기 단편 중 하나라는데, 푸아로는 자살처럼 보이는 사건을 만난다. 자살인가, 자살처럼 보이게 서툴게 위장된 살인인가, 지젝은 푸아로의 해결이 애거서 크리스티 작품에서 최고중 하나라고 한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읽고 있는 책은 홍기빈의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다. 지젝의 [폭력이란 무엇인가]도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싶은데, 두 책이 주는 의미가 분명 있을 것이다. 둘 다 어려운 책이다.

그리고 헤밍웨이, 아득히 먼 옛날 읽었던 책들.




헤밍웨이와 피츠제랄드 사이는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이인데, 김영하가 [위대한 개츠비] 해설에서 썼듯이 개츠비가 인생을 걸고 사랑한 여성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이었던가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읽으며 떠올린다.
이제 100여 페이지를 읽고 있는데 헤밍웨이의 문체며 스타일을 느끼기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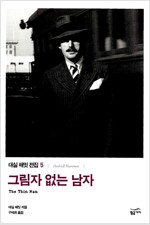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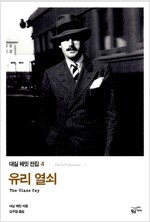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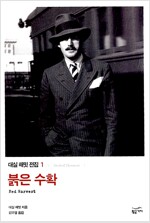

[몰타의 매] 정도를 빼고는 구입해야 할 것 같다.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피의 수확]은 절반쯤 읽고 말았다.
대실 헤밋은 잘 모르겠다. [몰타의 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화 <말타의 매>는 느와르 영화의 고전이 됐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심플 아트 오브 머더]를 참고하면서 해밋을 만나는 거다.
"해밋은 초창기부터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삶에 대해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얘기를 썼다.
그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으니까. 폭력에 이미 익숙했기에 쉽게 좌절하지도 않았다.
해밋은 단순히 시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로 살인하는 사람들 손에 살인을 돌려주었다."

헤밍웨이의 영향을 받은 대실 헤밋이 비슷한 시기에 저작권 만료를 만나면서 전집을 갖게 됐는데, 덕분에 때아닌 하드보일드 월드를 헤매게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