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책들은 못읽는데 심농 책들 놓기 힘드네. 지난 연휴 마지막날 저녁에야 비로소 시리즈 첫 권 [수상한 라트비아인]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에 [갈레씨, 홀로죽다] 완독. 오늘 저녁엔 세번째 권을 들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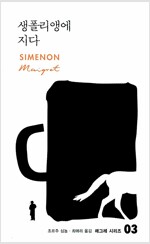
[사나이의 목]과 [황색의 개]를 읽을 때는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이렇게 연속으로 선보이는 그의 작품들을 하나씩 보는 건 전혀 다른 독서의 맛을 준다. 왜 그렇게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칭찬을 하는지 수긍이 간다고 할까. 심농 이후 범죄소설은 심농의 작품을 길게 늘였다해도 크게 틀리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언뜻 스쳐지나갈 정도.
[갈레씨, 홀로죽다]는 한 인물이 죽은 후, '살해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죽은 인물 자체, 그리고 그와 여러 사연으로 얽힌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범죄소설의 기본적인 매력, 죽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개인사를 둘러싼 갖가지 인간 삶의 단면들이 속속 드러나는 그 비밀, 미스터리를 밝혀나간다는 매력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만약 아프리카 우림에서 비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면, 심농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대처법은 없다. 그와 함께라면 난 비가 얼마나 오래 오든 상관 안 할 것이다. (헤밍웨이)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 보자면, 심농은 젊은이, 특히 배운 건 많지만 가난한 혹은 가난하지만 많은 걸 배운, 거기다 병을 앓고 있기까지 한다면 더욱, 혹은 병까지 앓게 하는 식으로, 그런 젊은이를 왜 그렇게도 냉담하게 대하는지 좀 의아한 면이 있다.
심농의 버즈북 [심농, 매그레반장 삶을 수사하다]를 보면, 심농은 매그레시리즈를 쓸 때 늘 파리의 지도를 옆에 놓고 참고하며 썼다고 한다. 아마 수사과정을 따라 파리의 실제 장소를 바탕으로 창작작업을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 심농 시리즈 표지를 펼치면 1959년 파리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장식'한 것 같다. 아, 제길, 지역이름이며 도로명 한 번 찾아보려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 꼭 한 번만이라도, 속 시원히, 작품에 나온 지명들 따라 쭉 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