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장,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스터리'라 하니 모른채 할 수 있겠는가? 책 한 권이 더 늘게 생겼다.

(뒤늦게 로쟈님 추천사도 기억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분신](누멘에서 박형규 번역으로 나온 [이중인격])에 대한 나보코프의 도전작이었다고.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스터리'가 혹하는 광고문구이지만 도스토예프스키와 그 작품을 두고 쓴 소설이라면 재미 두배겠다. 도스토예프스키 책들 역시 언젠가 부름받길 기다리며 방치되고 있지만, [이중인격] 주문했다. 뭐, 어찌되겠지. 일단 도토리 주워놓듯이 봄날에 쌓아둔다.)


책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방치하고 있다. 읽고 싶은 신간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졌단 말인가.
얼마전에 한국소설 좀 읽어야겠다고 계획한 바 있지만 떠들어볼 수가 없었다. 난중에... .
필립 딕, 심농의 신간들과 김석희 번역판 [모비딕](범우사판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건만 떠들어보지도 못했다), [라인업], [느낌의 공동체], [자유], 이 정도도 언제 볼 수 있을런지 아득하다. 이제 오늘 밤, 내일, 그리고 일요일, 집중적으로 읽을 생각으로 쬐끔 들떠있긴 하다. 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내일 날씨 너무 좋으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답 안나오네. 무턱대고 사놓기만 했지 무엇부터 읽고 싶은지 솔직히 정하지 못했다. 쬐끔씩 다 펼쳐봤지만 한 권을 집중해서 집지 못했다. 일도 많고 그러다보니 마음이 책을 읽을만큼 쏠리지 못한다. 이번 주말엔 잠시 다 잊고 책에 몰두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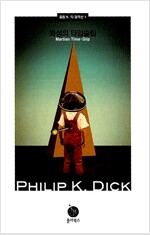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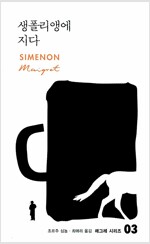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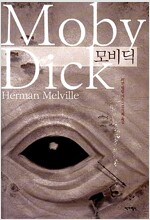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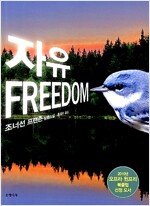


이 책들은 구입해놓고 그냥 놔둔 책들이고,
시간나는대로 몇 페이지라도 보려고 애쓰고 있던 책들은 존 르 카레의 [영원한 친구]와 최재봉의 [언젠가 그대가 머물 시간들]이다. [영원한 친구]는 박현주의 번역인데, 르 카레의 작품 색깔이 바뀐 건지 그 전에 보았던 그의 소설들과 조금 다른 느낌에 낯설어하고 있다. 시대 차이가 있긴 하지만([영원한 친구]는 2003년도에 출간된 작품이다.), 대화는 확실히 '어려졌다'고 할까, 물론, 책의 1/3 정도 읽은 지금은 주인공의 회상으로 '68을 겪는 혈기방장한 젊은 시절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확실히 그 이전에 읽었던 그의 작품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쫌 가볍고 치기어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나는 왜 그의 소설들을 계속 읽으려하는지, 무얼 배우고 느끼는지, 확실히 잡히지 않는 모호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읽긴 읽는데 이 사람의 소설은 이렇다라는 딱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모호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독서를 해도 괜찮은 걸까?

최재봉의 [언젠가 그대가 머물 시간들]은 신형철의 [느낌의 공동체]와 더불어 읽어보려고 선택한 책인데, 기획이 돋보이는 글쓰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학이 그린 서른 두 개의 사랑풍경'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사랑'이라는 테마하에 한국소설들을 시대 가리지 않고 뽑아서 사랑의 다양한 방식, 정황을 들려준다. 남들의 사랑 얘기는 언제들어도 아릿하지 않는가. 사랑이라는 범주 아래, 매혹, 순정, 욕망, 아득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은 왜 사랑이 아니..라고 할텐가, 등속의 양태들이 변사같은 최재봉의 글솜씨에 줄줄이 꿰어져 나온다. 이제 절반쯤 읽었는데, 박영한의 [우묵배미의 사랑]을 다룬 대목에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영화 때문이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흘러나오던 가요(주제곡?)도 제법 영화와 어울렸는데, 신파적 뽕필. 199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때 봤던 것 같다. 아니, 나중에 비디오로 봤나? 어쨌든 촌스럽지만 짠한 슬픔이 있었던 영화로 기억한다. 최명길 보다 지금처럼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기 전 예뻤던 유혜리가 더 인상적이었는데, 젖먹이 들쳐업고 나서서 바람난 남편(박중훈)을 찾아내 질질 끌고가던 적나라한 장면도 기억에 새롭다. 허긴 지금이야 너무나 많은 TV 드라마에서 다뤄지고, 거의 클리셰처럼 사용되는 장면들도 허다한지라 다시 보면 예전과 다르겠지만 여튼 이상하게 슬펐던 영화다. "서울시청 건너편 삼성 본관앞에서 999번 입석버스를 타고 신촌, 수색을 거쳐 50분쯤 달려와 낭곡 종점" 근처에 있다는 우묵배미 마을의 사람들을 다룬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향수되던 그 때와 지금. 지금은 '가난', '빈곤'을 다루는 심성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지 않는가. 그게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듯 싶다.
늙어가는 중이라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며 과거를 마음이 더듬느라 눈이 자꾸 슴벅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