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는 건 그나마 어찌 해볼 수 있지만 읽은 책에 관하여 뭐라도 쓰는 건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기에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도 책만 읽고 정리는 제대로 못했다. 일에의 집중과 읽고 싶은 책으로 마음이 가는 딜레마를 달고 살았다.
올해는 소설을 손에 쥔 날이 많았다. 특히 장르소설을 많이 읽었다. 아무래도 쉽게 몰입하여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인상적인 책으로 꼽자면 쑹홍빙의 [화폐전쟁]이었는데 어쩌면 근래에 읽었기에 아직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읽는 재미를 줬지만 나름의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가라타니 고진 덕분에 오에 겐자부로와 하루키를 가까이 놓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역시 깊이 파고들 처지가 아니다. 생각 뿐이다. 오에, 하루키, 고진 세 사람은 시차를 두고 군조문학상 수상으로 인연이 있다. 최근에 번역된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와 [약속된 장소에서]는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을 하루키식 논픽션으로 응답한 프로젝트였다면 오에는 [공중제비]라는 소설을 썼다. 하루키는 [1Q84]를 내놓았다. 그 전에 오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르포르타주 [히로시마 노트](1965)-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다-를 작업한 바 있다. 오에의 시대와 개인사, 하루키의 시대와 그의 라이프스타일, 두 사람에 대해 다룬 글들이 이미 있을지도 모르고 전혀 터무니없는 비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점이 있었고, [약속된 장소에서]까지 번역되어 나온 마당에 1995년 이후의 하루키 소설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만은 하겠다고 생각했었다.







또 올해는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을 읽었다는 것이 꼽을 만한 일이다. 하루키 때문이었으니 나는 하루키의 자장에 머물고 있다. 소세키 전작을 읽지는 못했고 읽었던 책 모두 생의 미스테리를 담으면서도 담백함이 있어서 좋았다.



빌 벨린저의 소설들은 50년대 소설임에도 신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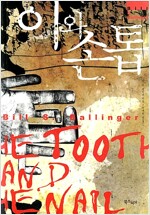
역시 50년대 소설이면서도 놀라운 구성력을 보여준 조엘 타운슬리 로저스의 [붉은 오른손]도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한 번 손에 쥐면 좀처럼 놓을 수 없었던 재미를 선사했던 책들을 꼽아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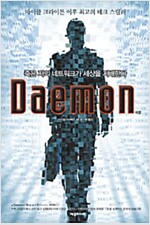
한국소설은 많이 읽지 못했는데 맘 편히 신뢰를 갖고 집어들기에 여전히 주저하게 된다. 왜 그럴까? ... 은희경의 소설도 처음 읽었지만 오래된 책인지라 올 해 나온 책 중 내가 읽은 소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최제훈의 [퀴르발 남작의 성]이었다.

SF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여전히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평소에 좀 정리를 해 두면 좋으련만 갑자기 돌아보니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 깊이 읽기와 반복해서 읽기는 잘 안되고 늘 새 책, 읽어보지 못한 책들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여 미지의 책 읽기가 더 다급하다. 쉽게 버리지 못할 습성임을 잘 안다. 수십년을 그래왔는데 갑자기 변할리가 없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년 마지막날에도 오늘처럼 이 서재에 들어와 이렇게 뭐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