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프턴 페디먼은 [평생독서계획](존 S. 메이저 공저)에서 조지 엘리엇을 말하면서
"위대한 소설들은 저마다 일정한 독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지 엘리엇의 소설(들)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카펫을 까는 것처럼 천천히 펼쳐지는" 소설들.
 가라타니 고진의 [역사와 반복]을 읽다 점 찍어둔 오에 겐자부로의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는 바로 그렇게 카펫을 펼치듯 천천히 읽어야 하는 소설 같았다. 소장하고 싶은 책이다. 좀더 매끈한(?) 번역으로 재출간되기를 기대한다. 굳이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어차피 고진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이 책들을 간략히 비교하며 언급한 것 때문에 읽었던 책이라 그 생각을 안할 순 없었다) 두 사람의 '근거지'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역사와 반복]을 읽다 점 찍어둔 오에 겐자부로의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는 바로 그렇게 카펫을 펼치듯 천천히 읽어야 하는 소설 같았다. 소장하고 싶은 책이다. 좀더 매끈한(?) 번역으로 재출간되기를 기대한다. 굳이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어차피 고진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이 책들을 간략히 비교하며 언급한 것 때문에 읽었던 책이라 그 생각을 안할 순 없었다) 두 사람의 '근거지'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는 예이츠 시의 인용구처럼 "어른들이 보금자리라 부르는 골짜기를 떠나지 않으리라던 어린 시절의 덧없는 맹세를 생각하네"라는 기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소설이었다. 작중 화자인 나 'K'가 어린 시절 고향의 숲에서 '아름다운 아이' 기이 형을 만나면서부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근거지'(K는 도쿄, 기이 형은 고향 그 곳)를 구축해가며 살아가는 동안의 평생의 교류가 이 소설의 주요 골격인데, K의 정신적 근거지는 늘 고향의 마을, 숲과 동격인 기이 형처럼 보인다. 반면,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상실의 시대)]은 사실 근거지도, 상실할 무엇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자체가 젊은이들을 자극한 상실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K가 그리운 시절로 늘 편지를 띄우겠다고 끝맺는 것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새삼 질문하며 수화기 저 편의 미도리를 부르며 끝나는 것과의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라고 아주 단순하고도 도식적인 생각 밖에 나는 못했다.
 쑹홍빙의 [화폐전쟁]은 금융 파생상품이 어떻게 토대 없는 건물을 계속 쌓아올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외에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쑹홍빙의 금본위제 회복,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 준비 등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의 견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이 책에 대한평가절하도 있는 듯하다. 음모론적 흥미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되어가는 꼴을 꼼꼼히 관찰해야 한다는 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던 책이다. 요즘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시들했던 게으름을 반성했다. ....... 장하준은 최근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첫머리에서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턱하니 적었다.
쑹홍빙의 [화폐전쟁]은 금융 파생상품이 어떻게 토대 없는 건물을 계속 쌓아올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외에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쑹홍빙의 금본위제 회복,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 준비 등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의 견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이 책에 대한평가절하도 있는 듯하다. 음모론적 흥미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되어가는 꼴을 꼼꼼히 관찰해야 한다는 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던 책이다. 요즘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시들했던 게으름을 반성했다. ....... 장하준은 최근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첫머리에서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턱하니 적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현실이란 (금융)자본가 대 전세계 '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늘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수많은 글들에 무슨 힘이 있을까, 새삼 요즘 넘쳐나는 비판적 글들의 무기력함이 눈에 밟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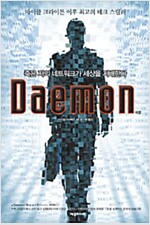
스릴러의 새로운 하위 장르로 '테크스릴러'가 심심찮게 나오는 모양인데, 전직 시스템 컨설턴트였던 다니엘 수아레즈의 이 소설은 전 세계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며 동일화되어 가는 현실을 이용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세계의 새로운 전쟁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레드퀸 가설'과 진화론으로 어떻게 자신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설파하는 대목은 작가가 출발점으로 삼은 생각이 아닌가 싶었다. 동일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치명적 결함, 약점은 세계경제가 연동되는 시대의 위험과 기회와 대체로 일치한다. 소설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데몬과 프리덤]이라는 후속편을 기다려야 한다.
 한동안 히가시노 게이고가 뜸했는데, 나왔길래 역시 지나치지 못하고 읽었다. 연습작처럼 보이는 단편 모음집이니까 가볍게 읽으면 된다. 연습작처럼 보여서인지 가끔 성긴 도약이 보이기도 하지만 머리 식힐겸 보는 것도 좋다.
한동안 히가시노 게이고가 뜸했는데, 나왔길래 역시 지나치지 못하고 읽었다. 연습작처럼 보이는 단편 모음집이니까 가볍게 읽으면 된다. 연습작처럼 보여서인지 가끔 성긴 도약이 보이기도 하지만 머리 식힐겸 보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