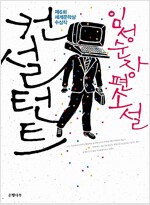[캐비닛]을 재밌게 봤는데, [설계자들] 또한 무난히 읽힌다. 장정일이 신랄하게 본 것에 비하면 나는 푹 빠져 읽었다고 할 수 있으니 장정일 식으로 말하면, 나는 "한 번도 문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 축에 속한 모양이다. 뭐, 내가 생각해도 문학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굳이 덧붙이자면, [설계자들]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오리지널리티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거. 하루키의 그늘이 짙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도서관과 도서관장 너구리영감이나 사팔뜨기 사서의 세계는 영락없이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엉뚱하게 펴져가는 이야기의 세계도 그렇고, "의아한 북극곰" 같은 얘기는 하루키가 즐겨 구사하는 허구의 인용 혹은 패러프레이즈의 환영이 어른거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초반의 집중력이 흩어져서 그저그런 범죄영화를 보는듯하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절망을 흠씬 느끼게 하는데 절묘한 재주가 있었다. 나의 센티멘탈이 이입된 것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읽는 내내 물젖은 솜처럼 기분이 무거웠으니.
작가는 주인공을 비롯한 '푸주'세계의 살수들을 '킬러' 보다는 '자객'이라고 부르고 싶은 듯하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호칭이지 않는가. 자객이라 호명함으로써 때아닌 낭만적 품격을 이들에게 부여하고 싶은 듯했다. 차마 낯간지러운 시대에 말이다. 주인공 래생을 비롯한 자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있는 것들의 치사한 짓거리 뒤치닥하는 정도의 하수의 일 뿐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하수의 똘마니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의지를 지닌 듯한 '자객'으로 죽고자 하는 인물들을 애써 그린다. 죽음의 환대라고나 할까.
그리는 세계가 그렇다보니 소설에는 죽음, 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묵직해진다. 언제 들이닥칠지는 모르지만 분명 문 밖에 있는. 살인이나 죽음과 관련된 조사도 정성스러워서 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 요즘은 이런 디테일을 제법 잘 활용하는 듯하다. 독일제 헨켈이라는 칼을 다루는 거라든지, 털보의 소각장, 화장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들의 묘사가 인상적이었다.
임성순의 [컨설턴트]에 이어 김언수의 [설계자들]까지, 폭발적으로 발전한 범죄스릴러 장르소설의 활황이 본격적으로 한국소설에도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
 |
|
|
| |
왜 도서관이었을까. 도서관은 이렇게 조용하고 이곳에 가득 쌓인 책들은 저토록 무책임한데. (p.14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