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오카 세이고의 [지식의 편집]을 대충 훑어봤다. 21세기는 주제의 시대가 아니라 '방법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렇겠다고 수긍했다. 지금의 고민이기도 하고.
세이고는 독자가 자신의 편집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내놓았는데, 그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편집연습4> 여기에 어떤 소설의 첫 부분이 쓰여 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장례식은 어디에서 할까?" 내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말했다. "그나저나 그 애 집이나 있었을까?" - 무라카미 하루키, [양을 둘러싼 모험]에서-(문학사상사에서 나온 책 제목은 [양을 쫓는 모험]이다)
도대체가 [양을 쫓는 모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가물가물한 거라.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다시 보면서 하루키의 유머러스함에 키득키득 웃기도 하면서 재미나게 보고 있다. 레이몬드 챈들러식의, 주인공 '나'가 이상한 사건에 얽혀들면서 그야말로 쫓고, 찾는 얘기가 전개되는데, 중반쯤 보고 있는 지금도 결말이 어땠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마치 처음보는 추리소설처럼 읽게 됐다.
양을 찾아, 더 정확하게는 양을 찍은 사진에 얽힌 사연을 쫓아 모험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읽는 책이 [셜록홈즈의 사건기록]이라는 책이라는데, "내 친구 와트슨의 생각은 한정된 좁은 범위의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집요한 데가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도대체 이 책은 뭐지, 하면서 또 뒤지다가 [셜록홈즈의 사건집The Case Book of Sherlock Holmes]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번 보고 싶다. 레이몬드 챈들러가 아니라 셜록홈즈라. 실제로 참고했던지 교묘하게 꼰 트릭인지 잘 모르겠다. 오랜만에 셜록홈즈도 읽을 것 같다. 


또 한 권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 책이 에바 일루즈의 [오프라 윈프리, 위대한 인생].
원제가 "Ophra Winfrey and the Glamour of Misery"이다. 번역책의 제목을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물의 관심에 기대 마치 오프라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지은 듯한데, 오프라 윈프리와 그녀의 토크쇼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서라고 할 수 있겠다.
오프라 윈프리가 다루는 주제들과 그것들을 대중들에게 펼쳐보이는 방식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대중문화에 대해 면밀하고도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서 유익하다.
"가난한 사람은 계량화될 수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은 계량화될 수 없다."
오프라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토크쇼 게스트들도 고통받는 혹은 고통받아온 사람들에 공통점을 두고 치유와 실패, 그리고 또 다시 치유에 도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형식에 주목했다. 저자는 지식인들이 감성을 드러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더욱 오프라 윈프리와 그녀의 토크쇼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의 대중들이 자아를 찾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는 하나의 사례로 좋은 책이라고 보여진다.
우리 TV의 넘쳐나는 토크쇼들과 비교해볼만 하지 않을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프라 윈프리'같은 토크쇼를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프라 윈프리와 그녀의 토크쇼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책 역시 중반쯤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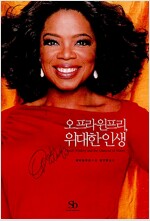
알라딘이 대형 사고를 만난 건가 보다. 때마침 사고 나기 전 외서 주문을 했다가 뭐, 이유가 일시적 절판이라 입고 시일이 더 걸린다기에 취소했다. 딴 데서 할 수밖에. 나름 급하게 보고 싶었던 건데... .... 알라딘... 작년 연말의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어째 불안해 보이는 건 괜한 걱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