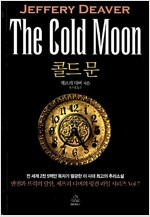
'트릭과 반전'의 대가라는 제프리 디버의 소설을 처음 접했다.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소설이었다. 캐릭터라든지 플롯의 주요한 계기를 제공해준 '시계'에 대한 지식활용, 행동심리학의 한 분과로 자리한다는 '동작학'을 구현한 캐릭터 등. 다만 '동작학' 전문가 캐스린 댄스는 점점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비약해버린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트릭과 반전의 달인이라는 작가. 독자 속여봤어? 안 속여 봤으면 말을 마슈, 라는 식으로 결말로 갈수록 다소 어이가 없어지는데, 시계공 제럴드 던컨(본명 찰스 베스파시안 헤일)이라는 희대의 사이코패스가 화자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검토해봐야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던컨으로서 얘기했던 것들과 나중에 찰스로서 본연의 '범죄'에 착수하는 것 사이에는 납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트릭같은 게 있다. 이는 얼마 전에 읽은 헤닝 만켈의 [한여름의 살인]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지는데,


범인이 화자가 되어 자신의 범죄, 심경, 방법, 심리 등을 얘기하는 것을 따라 독자는 병렬처럼 이루어지는 주인공 경찰과 범인 사이의 추리,추적과 범행, 도망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콜드문]에서는 던컨의 범죄를 던컨 자신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심정,심리'까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나중에 찰스 자신이 '진짜'로 저지르려고 했던 사건에 이르면 그것은 완전히 독자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래도 좋은 것인가?
* 애거서 크리스티의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서 애거서는 '나' 세퍼드가 전화를 받고 살인현장으로 달려가는 장면에 셰퍼드의 어떠한 심정적, 심리적 묘사도 하지 않았다.
이 껄쩍찌근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쩌면 실마리를 풀어줄 책을 로쟈님의 서재에서 발견했다. 피에르 바야르의 [누가 로저 애크로이드를 죽였는가].

우선 애거서 크리스티의 [애크로이드 살인사건]도 읽지 않은터라 급하게 먼저 구입했다.

요즘 추리, 범죄 미스터리물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갖게 되는 것들은 캐릭터, 범죄의 동기들이 신선한지, 그리고 사건 해결 등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게 있는지 등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읽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은 단연 흥미로웠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판권을 구입, 캐스팅까지 완료되어 곧 촬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각색을 어떻게 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해서 시나리오 구해보라고 부탁해놨다. 어른들로부터 영혼을 뻬앗긴채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고단함이 안쓰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아마노 세츠코의 [얼음꽃]은 자신의 범죄 이면에 도사린 음모를 또한 상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다만 '재판'의 형식을 이용해 변호사가 줄줄이 말하는 방식은 다 소화하지 못해서 뭉텅뭉텅으로 배설할 수밖에 없는 처리처럼 보여 아쉬웠다.
게다가 범죄 방식으로 채택된 농약의 음료수 혼입은 아무래도 미숙해보인다. 그것이 단지 '암시'된 '복선'으로부터 끌어올려졌다고 처리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