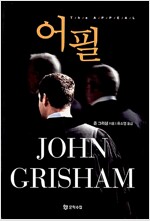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발표를 계기로 어떤 언론에서는 대통령이야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지만 검찰이나 법조계 인사에 대해서 손댈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해 답답해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즉 '그들(법조계 인사)을 도대체 어떡하면 좋으냐'는 식이다.
존 그리샴의 소설 [어필]은 마침 그에 대한 적합한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미국의 사법제도 및 인사제도에 따라서 직접 투표로 판사를 선출하는 주(州)의 경우 벌어지는 사태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부패한 자본의 무소불위의 파워를 실감하게 한다.
1인 1표가 아니라 1원(1$) 1표 식이 되는 이 끔찍한 사태 앞에서 캄캄한 절벽을 마주한 느낌을 소설 읽는 내내 받게 된다.
속수무책.
존 그리샴은 안일한 엔딩을 택하지 않는다. 독자가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결말로 위무하지도 않는다(뭐 쬐끔 그런 사건도 있긴 하지만 ... ) . 결국 정당한 평가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돈과 권력의 무지막지한 전략 날 것을 보여준다. 또, 자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너무나 안일한 인식과 대처는 이 소설에서 힘의 균형을 다소 잃게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또한 그리샴이 택한 의도일 수도 있겠다.
막장 드라마라는 분명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들을 내놓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단지 드라마만이 아니라 정치, 이 사회와 체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때론 두려울 때가 있다.
각자생존, 각개격파 그 속에서 막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