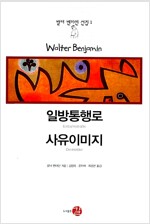
‘책과 창녀는 무척 젊게 만들어준다.’ 발터 벤야민이 한 말이다. 그의 사유집『일방통행로』의 「13 번지」소제목은 책과 창녀의 공통점에 대한 부분인데 ‘벤야민다운’ 독창적 생각으로 차 있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건 오래된 친구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난 뒤 회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벤야민의 그 말을 내 식으로 바꿔 말하면 ‘오랜 친구는 무척 젊게 만들어준다.’가 될 것이다.
나를 무척 젊게 만들어주는 ‘오랜 친구’는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어야 한다. 자주 만난 오랜 친구가 아니라 아주 오랜 만에 만난 오랜 친구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삼십 년 정도는 못 만났던 친구라야 나를 젊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랜 친구라도 자주 만나면 늙음을 공유하는 편한 사이가 되고, 오랜 친구를 삼십 년 만에 만나면 ‘젊음’을 환기시키는 설레는 자극제가 된다. 육체적 현실은 늙었으나 심적 현상은 그때 그대로 임을 확인하는 청량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동창 열댓 명이 거의 삼십 년 만에 만났다. 이것저것 다급해진 궁금증만큼 섞어 마신 술 때문에 누군가는 빨리 취했다. 민낯을 드러낸 채 싱크대 앞에서 칫솔질까지 해대는 여자 동창들의 뻔뻔함도 남자애들의 무람없는 너털웃음 속에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삼십 년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 청춘으로 돌아가 추억을 공유했다.
아내를 잃은 이도, 자식을 먼저 보낸 이도 있었다. 잘난 마누라와 착한 남편을 만난 이도, 게으른 마누라와 보수적인 남편을 거느린 이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이도, 주변부에서 겉도는 이도 있었다. 다양한 세상만큼 저마다 각양각색의 삶을 변주하고 있었다. 다 다른 사람끼리 다만 같은 이십대를 살았다는 공감대 하나만으로 웃고 떠들며 제 젊은 날을 상기했다.
그 시절이 떠오르는 음악이 담소의 배경으로 깔렸다. 평소의 나 같으면 신경이 거슬렸을 것이다. 나는 음악이 배경으로 물러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한다. 음악이면 음악이고 담소면 담소지, 담소하는 가운데 흐르는 음악은 소음공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꺼이 참을 수 있었다. 끄려고도 꺼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담소에 떼밀린, 배경으로서의 음악 또한 그 시절을 환기시키는 귀한 매개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삼십 년 시간의 강을 용케 건너온 우리는, 각자 아팠거나 느꺼웠을 그 시절을 돌아가며 풀어내었다. 앞으로 쌓아갈 나머지 삼십 년도 그렇게 과장 없이, 침잠도 없이 담담하게 맞고 싶다. 늦가을 바람에 흩어지던 낙엽비 아래서 제 젊음을 사고 싶다면, 오래 만나지 못한 청춘의 친구를 소집할 일이다. 책과 창녀 못지 않게 나를 젊게 만들어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