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즐거운 상반기 책 이야기.
기록해놓은 책이 영 적어서 (올해는 영 글을 많이 적지 못했다) 제대로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억을 더듬어 적어본다.



* 드디어 읽었다. - 마거릿 미첼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드디어 읽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게는 꼭 읽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번역을 못 만나서 읽지 못한 책이 있는데, 하나는 <여인의 초상>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다. 문장이 과거형인 이유는 그 중에 한 권은 해결되었으니 하나가 남아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로 접했을 때는 뭔가 2 %쯤 부족했는데, 읽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알아버렸으니 가령 스칼렛에게는 보니 외에도 아이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이라던지, 혹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야기와 <작은 아씨들>은 같은 남북 전쟁을 다루고 있다던지. - 도대체 어딜 봐서 같은 시대인지 난 감도 오지 않지만 - 이런 류의 놀라움을 느끼며 책을 읽어나갔다.
스칼렛이라는 캐릭터는 도도하고 당당하며 항상 의지가 충만한 인물로 나오지만, 어렸을 적 스칼렛은 그런 모습 보다는 제멋대로이고 감정적이며 멍청(?) 하기까지 하다. 이런 인물이 전쟁 한복판을 지나면서 여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레트 버틀러는 소설이 더 멋있다. 하지만 역시 영화의 아우라를 지우기는 어려운 소설.

* 기대 이상이었다. - 존 크라카우어 / 희박한 공기 속으로
올 상반기 아이폰을 쓰면서 가장 잘 했다고 느낄 때는 팟케스트를 들을 때.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갤스를 구입하고 나서 아이폰에서만 팟케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난 정말 슬펐을거다. 특히 아끼는 팟 케스트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팟케스트인데, 그의 팟케스트에서 소개하는 책을 거의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 중에서 존 크라카우어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가 단연 압권이었다.
초기의 의지의 상징이었던 에베레스트를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도움을 받아 등정하는 시대. 저자인 존 크라카우어도 원고를 위해 등반대의 일행으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게 되고, 그들의 등반은 최악의 등반 사고로 이어진다. 그 일행이었던 작가가 적은 일종의 사건 기록담인데, 굉장히 흥미롭다. 마치 등반대를 따라 히말라야 어딘가를 오르고 있는 기분을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다. 김영하의 팟케스트가 추천한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만족도가 내게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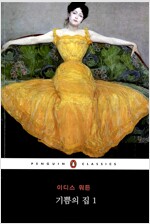
*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란. - 이디스 워튼 / 순수의 시대
아마도 책을 읽게 된건 제인 오스틴을 읽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지 싶다. 영화로는 꽤 드문드문 봤던거 같은데, 원작은 제대로 읽어볼 기회가 없어서 - <바람과 함꼐 사라지다>와 비슷하군 - 이번에야 읽었다. 책에 한 줄 코멘트라면 '이토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결말이라니' 정도랄까.
이너 서클의 사람들끼리 자신들만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자신은 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속수 무책으로 빠져드는 남자, 그 남자의 '순수'하다고 믿었던 약혼녀. 남자는 약혼녀와 헤어져 자유로운 여인에게 가고자 하지만 뜻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의외로 그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 버둥 거릴듯 하지만 평온하게 말년까지 살아간다. 소설의 결말에 부분의 마지막이 꽤나 열린 결말이라 앞 부분의 답답함을 한번에 날려줄 수 있다.
다음으로 읽은 이디스 워튼의 책은 기쁨의 집인데 ,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국내에서는 2가지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환희(?)의 집과 기쁨의 집. 어느 쪽이 나은 번역인지는 개인 취향 차이가 클듯. 아 그리고 이디스 워튼의 책을 읽으면 꼭 <위대한 게츠비>를 다시 읽고 싶더진다. 그냥 피츠 제럴드의 이야기과 그 시대의 미국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게 더 적확한지도.

*상반기 최악의 선택 - 온다 리쿠 /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이 출간된다고 하면 무조건 사들여서 읽는 작가가 나에게도 있다. 다행히 온다 리쿠는 기존에 출간된 책이 새로 출간되는 것보다 많아서 기존 책을 읽는 시간이 길었다.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공허해 하는데, 때 마침 출간된 이 책.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하자는 건가 이 책은.
이상 한마디 감상.



*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말로 감상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사실 잘 설명할 수 없는 책이나 내게 이 책들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 는 어떻게 이 책을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군. 어느 분의 추천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단편 모음집인데, 타이들 보다는 그 뒤에 있는 럼주가 등장하는 - 아 제목이 벌써 가물가물 - 이야기가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읽는 동안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을 읽는 느낌이랄까. 독자의 내공에 따라 이야기가 너무 폭이 넓게 해석될 이야기들이었다.
(여기는 수정글인데, 2011.07.12 /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소개해준 분은 다락방님이셨다!!!)
<속죄>는 드디어 읽은 이언 맥큐언의 소설. 구입한건 몇년 된 듯 한데,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읽을 수 있게 되어 버리면서 - 그렇다 100% 되어 버렸다 - 근 하루정도 만에 읽어버렸다. 한 남녀와 그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그 오해에서 파생된 잘못된 증언이 만들어낸 운명의 변화 같은 것들인데, 결말이 압권이고, 난 결말에 배신감마녀 느꼈다. 이 소설의 완성은 마지막 5페이지 내외에서 이루어진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 부터가 소설이란 말인가. 내가 읽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요시다 슈이치의 <퍼레이드> 대도시의 한복판에 우연히 모여 사는 5명이 남녀와 관계된 이야기. 함꼐 숙식을 해결할 뿐 그 무엇도 연결되지 않고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개인들. 그리고 함꼐 살고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와 사람들. 그것이 인간이다. 심지어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잇는 부인이나 남편, 어쩌면 부모 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읽는 내내 조금은 착잡하다고 할까. 요시다 슈이치 특유의 조금은 공백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사실 이 책들 말고도 쓰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 이 이상은 쓰지 못하겠다. 북 스피어에서 나온 미야베 미유키의 에도시대 시리즈는 대박이었다는 것도 못 쓰겠고, 고등학교 때 (아마 대학인지도) 읽었던 이영도의 <폴리리스 랩소디>를 다시 읽었는데 충격 받았다는 것도 못 쓰겠고,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는 공직을 맡은 후의 본인의 '이런 공직이야기' 담인거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역시 이도저도 아닐 때는 하루키의 에세이가 최고라며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는 이야기도 못 쓰겠다. 그리고보면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나 기록을 하고 무언가 남길 수 있는 법인가보다. 더 이상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