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소설집 나왔다.
좀 튕길 수 있으면 좋으려만, 솔직히 말해, 너무 기쁘다! 사심 없이, 마냥.

표지 이미지에 고양이를 제안하며 떠올렸던 그림은 피카소의 데생 두 점. '엎드린 개 자세'를 취하는 고양이, 그냥 멍 때리는 것 같은 고양이.


지금의 표지, 전체적인 모양, 양감과 질감, 모두 다 마음에 든다. 10여년 전 <현대문학>에 실었던 단편 하나를, 모 평론가 선생님의 충고대로, 뺀 것은 무척 잘한 일인 듯하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작가 프로필 사진. 좀 더 밝고 경쾌한 사진이 쓰이길 바랐는데, 좀 진중하고 가라앉은(?), 떫은(?) 표정의 사진이 들어갔다. 그날,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중 마음에 들었던 것을 올려 본다.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니 제일 젊고 제일 예쁠 때(그게 바로 지금이다!) 찍어두자.

집 근처 구청과 일반 주택 사이를 오가며 찍었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등단 20년(이 숫자에, 헉, 했다!), 조촐하지만 목록을 한 번 만들어 본다.
삼십대에 쓴 것. <고양이의 이중생활>은 200?년도 한겨레문학상 본심에 떨어진 소설이다.


이십대에 쓴 것. 정말 안 팔렸지만 <그러니 내가 어찌 나를...>은 참 아끼는 소설이다.



어째 삼십대가 더 부실하냐?? 네가 면죄부가 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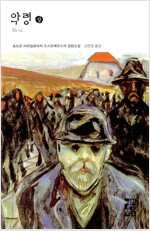
이미지 넣다 보니 <악령>은 이십대 중반, 유학 가기 전에 했던 번역이다. 이후 번역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듯한데 소설은 뭐냐. 계속 전락한 셈이 됐지만, 나는 나의 소설이 무척 성실하게 시간을 좀먹어 그 나름의 진화(퇴화 역시 진화다!)를 거듭하고 있다고 믿는다. 쓰는 것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