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끌리는 박물관 - 모든 시간이 머무는 곳
매기 퍼거슨 엮음, 김한영 옮김 / 예경 / 2017년 6월
평점 :




위대한 작가들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을까.
작품 탄생의 비화라든지 작품에 묻어나오는 작가의 가치관은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영감의 원천 중 하나가 박물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도시의 유명 박물관보다는 소박하고 작은 박물관이 대부분이고요.
<모든 시간이 머무는 곳, 끌리는 박물관>은 세계 문학상을 휩쓴 유명 작가들이 박물관에서 느낀 성찰을 담은 책입니다. 짧고 개인적인 글이지만 박물관이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경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총 38명의 저명한 작가들이 살아오면서 인상 깊었던 박물관을 다시 찾아갔고, 자신에게 영감을 준 박물관에 대해 썼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자매지 <인텔리전트 라이프>에 '박물관의 저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던 글 중 24편을 묶은 책 <끌리는 박물관>. 건물 자체보다 작품과 그들의 관계를 다룹니다.

박물관 이야기라고 해서 약간은 따분한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작가의 글은 딱히 끌리지 않을 거야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유명 작가 타이틀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어서 제각각 개성 있는 문체와 매끄러운 필력을 선보여 독자 입장에서는 읽는 맛도 무척 좋았습니다. 유머와 감동은 기본입니다. 자기만 알고 싶은 박물관이라는 티를 은근 내비치는 마음을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젠 나도 안다!) 흔한 여행 책에서는 접하기 힘든, 특이하고 재미있는 박물관 목록이 하나씩 늘어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끌리는 박물관>에 등장한 박물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과 남유럽 등 세계 곳곳의 작은 박물관이고, 주제도 참 다양합니다. 주택 박물관, 두레 공방, 실연 박물관 등 별의별 박물관이 다 나옵니다. 편당 글이 길지는 않아서 작가별로 한 편씩 끊어읽기 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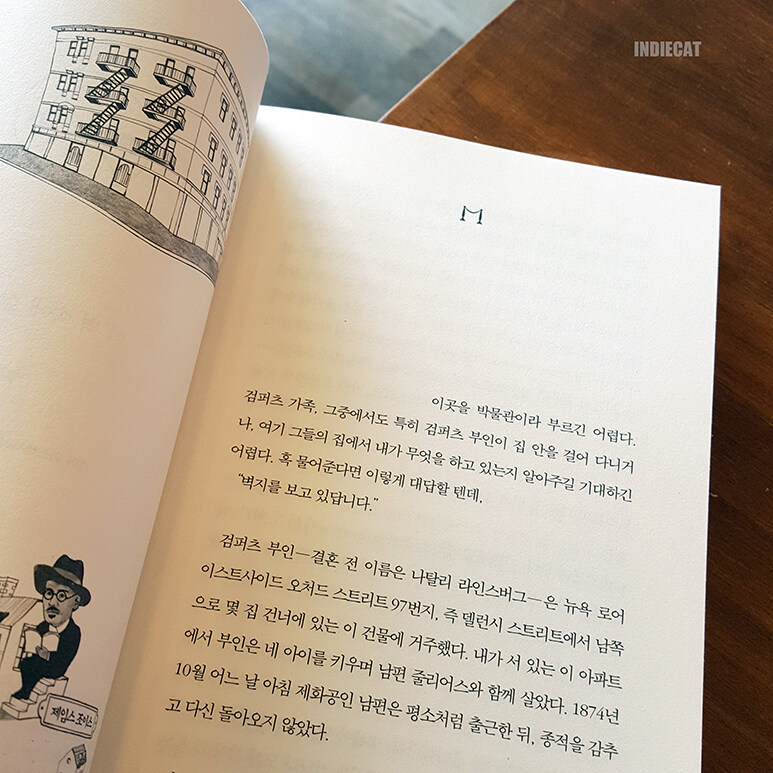
15년 만에 세 번째 발길을 한 로디 도일 작가의 주택 박물관 탐방기.
그곳은 유명인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이 되었을 만큼 사연이 깃든 곳입니다. 그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도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5층짜리 공동주택이었던 이곳은 겹겹이 붙여진 벽지와 칠 벗겨진 페인트 벽에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헤밍웨이도 살았던 쿠바의 낡은 도시 아바나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주택입니다. 이름은 주택 박물관이지만 이곳은 삶이 깃든 흔적입니다.
이곳에는 방치에 딱 들어맞는 이유, 심지어 사람을 매혹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이건 결코 방치가 아니다. 존경이다. 여기 사람이 살았다. 여기 사람의 삶이 있다. - 책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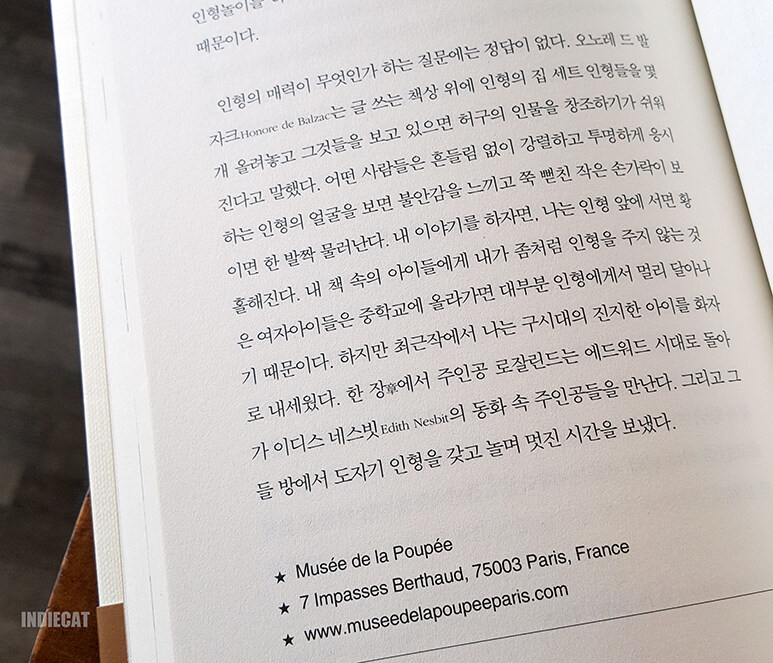
앤티크 인형 덕후 작가의 인형 박물관 탐방기는 잔잔한 향수를 불러옵니다.
가족 대대로 인형을 사랑해 이번에도 모녀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재클린 윌슨 작가에게 인형 박물관은 작은 안식처입니다. 작가 발자크는 인형의 집 세트의 인형들을 몇 개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기 쉬워진다고 말했을 정도라죠.
나는 빅토리아 시대의 동화책 속으로 들어간다. - 책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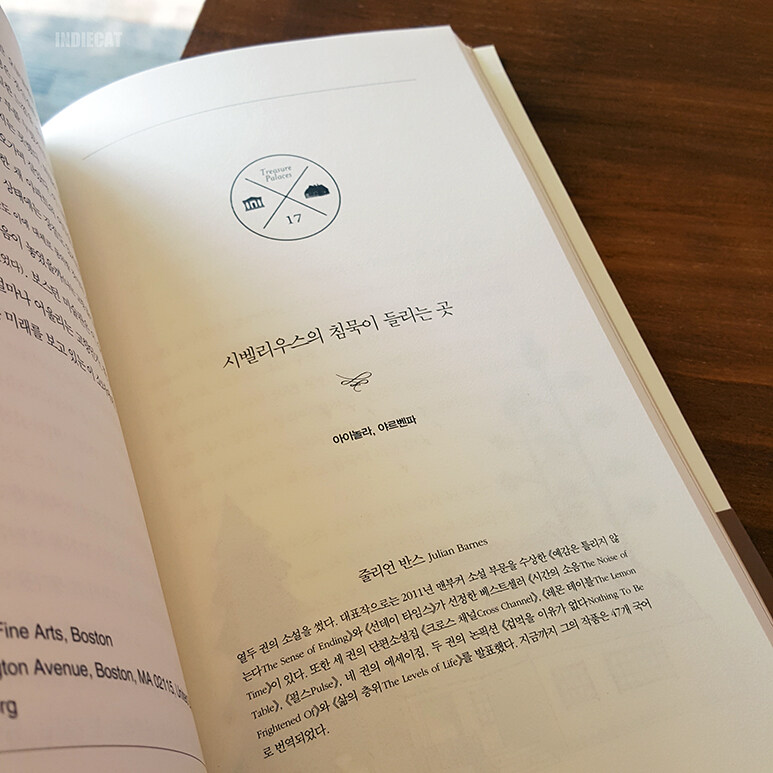
맨부커 상 수상작가, 줄리언 반스는 특이하게도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줄리언 반스 작품을 읽을 때 배경으로 음악이 흐르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역시. 줄리언 반스 특유의 분위기를 여기서 고스란히 맛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내 이름을 딴 '아이놀라'로 명명한 시벨리우스의 집을 방문한 줄리언 반스는 그곳에서 순수예술과 현실의 삶을 음미합니다.
나에게 그곳은 언제나 이중의 엇갈린 평판, 창조와 파괴, 음악과 침묵의 장소다. - 책 속에서

박물관은 내게 낯선 도시에서 숨 쉬고 존재할 초점과 요점을 제공했다. - 책 속에서
유년기에 부모님 손에 끌려 지루하게 박물관을 방문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존 란체스터 작가의 글은 빵 터질 정도로 웃음 코드가 가득합니다. 예술은 18금이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작품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고문 장소였던 박물관이 어떻게 경탄의 연속인 나날로 지속할 수 있게 바뀌었는지, 내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작품들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작가들도 첫 숨에 박물관에 매혹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근원적인 감정들이 모인 박물관의 매력을 그들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영화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원작 소설가 앨리슨 피어슨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음 깨달은 곳으로 파리의 로댕 미술관의 한 작품을 선택했고, 영화 <밀리언즈> 원작 소설가 프랭크 코트렐-보이스는 약탈과 보물이 아닌 인종과 민족성을 컬렉션한 피트리버스 박물관 전시물들을 보며 물건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은 독창적인 생각 그 자체에 매료됩니다.
알리 스미스 작가는 관람객이 전시물 주위에서 인간적이 되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박물관으로 절벽 끝에 지어진 악셀 문테 박물관을 손꼽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든 <워 호스>를 쓴 아동작가 마이클 모퍼고는 벨기에 플랑드르 필즈 박물관에 전시된 말 덕분에 이 작품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작품 배경이 된 스토리, 작가들의 영감의 원천을 담은 <모든 시간이 머무는 곳, 끌리는 박물관>.
그들이 소개한 박물관은 핫플레이스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에 끌렸던 걸까요. 공개적인 공간이면서 사적인 이야기가 맞물린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쓱 훑고 넘기는 흔한 박물관 탐방이 아닌, 그 속에 깃든 삶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물 같은 작은 박물관에서 작가의 스토리가 얽혀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읽으며, 내 사유가 더해진 나만의 박물관을 찾고 싶은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