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샤이닝
욘 포세 지음, 손화수 옮김 / 문학동네 / 2024년 3월
평점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라는 이력은 살짝 부담스러운 지적 자극을 일으킬 것만 같은 선입견이 있었지만, 본문이 80여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의 얇은 소설이라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전할 수 있었던 욘 포세 Jon Fosse 작가의 장편소설 <샤이닝 Kvitleik>.
제목만으로는 스티븐 킹 원작소설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의 잔상이 밀려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샤이닝과 이 샤이닝의 온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읽고 나서는 미묘하게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원제 Kvitleik는 순백색을 뜻합니다. 영어판 제목은 A Shining입니다. 눈이 부신 반짝이는 흰빛을 상상하면 됩니다. 한국어판 표지는 숲속을 배경으로 흰빛의 잔상이 반짝이며 표현되어 있어 제목의 의미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특이합니다. 문단 구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페이지를 펼쳤을 때의 첫인상은 답답해 보이지만 읽어나갈 땐 놀랍습니다. 가독성이 기가 막힙니다. 단문이거든요. 술술 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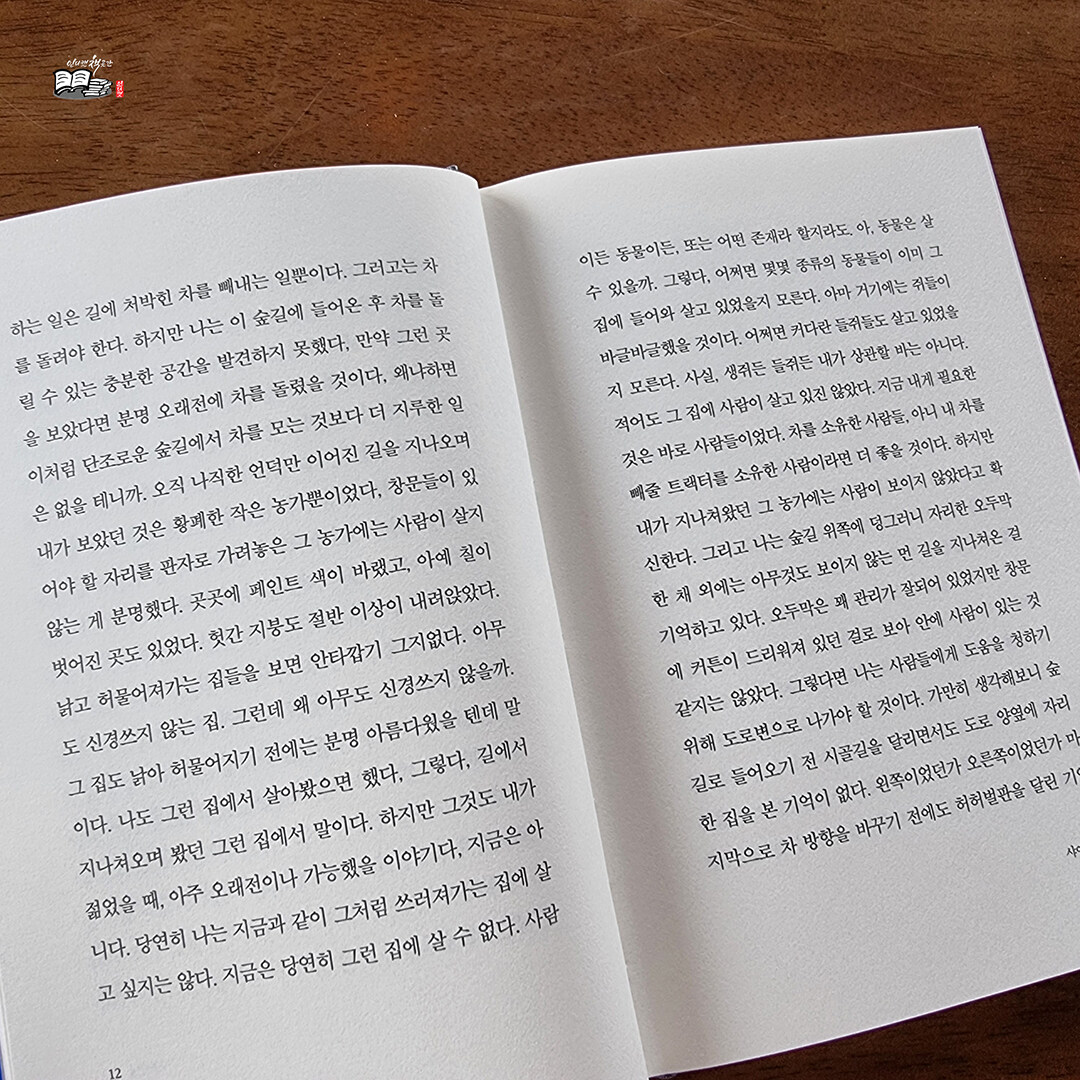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나온 나. 그러다 숲길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하면서 지금 내 행동과 심리를 서술됩니다. 지루함을 벗어내고자 달렸지만 길에 처박힌 차 안에 있는 지금은 공허함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아니 오히려 약간은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문득 눈이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 틀고 하얀 눈이 쌓이는 장면을 멍하니 보다가 이내 얼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에 집을 본 기억도 없고 되돌아 도로변까지 찾아가는 것도 막막합니다. 결국 길을 나섭니다. 오솔길로. 오히려 숲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숲속은 이내 어두워져버리고 추워집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두려움 속에서 숲속을 걷습니다. 그러다 반짝이는 순백색의 형체를 발견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빛나지만 눈이 아프진 않습니다. 처음엔 사람인가 싶었는데 하얗고 선명한 공간에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환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저 빛의 정체는 뭘까요. 그러다 사라집니다. "당신 지금 여기 있습니까." 하니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고, 여기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도 지금 이 상황은 미친 느낌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 속의 장면일까요. 결국 다시 사람을 찾아 나서며 발걸음을 옮기지만 길을 찾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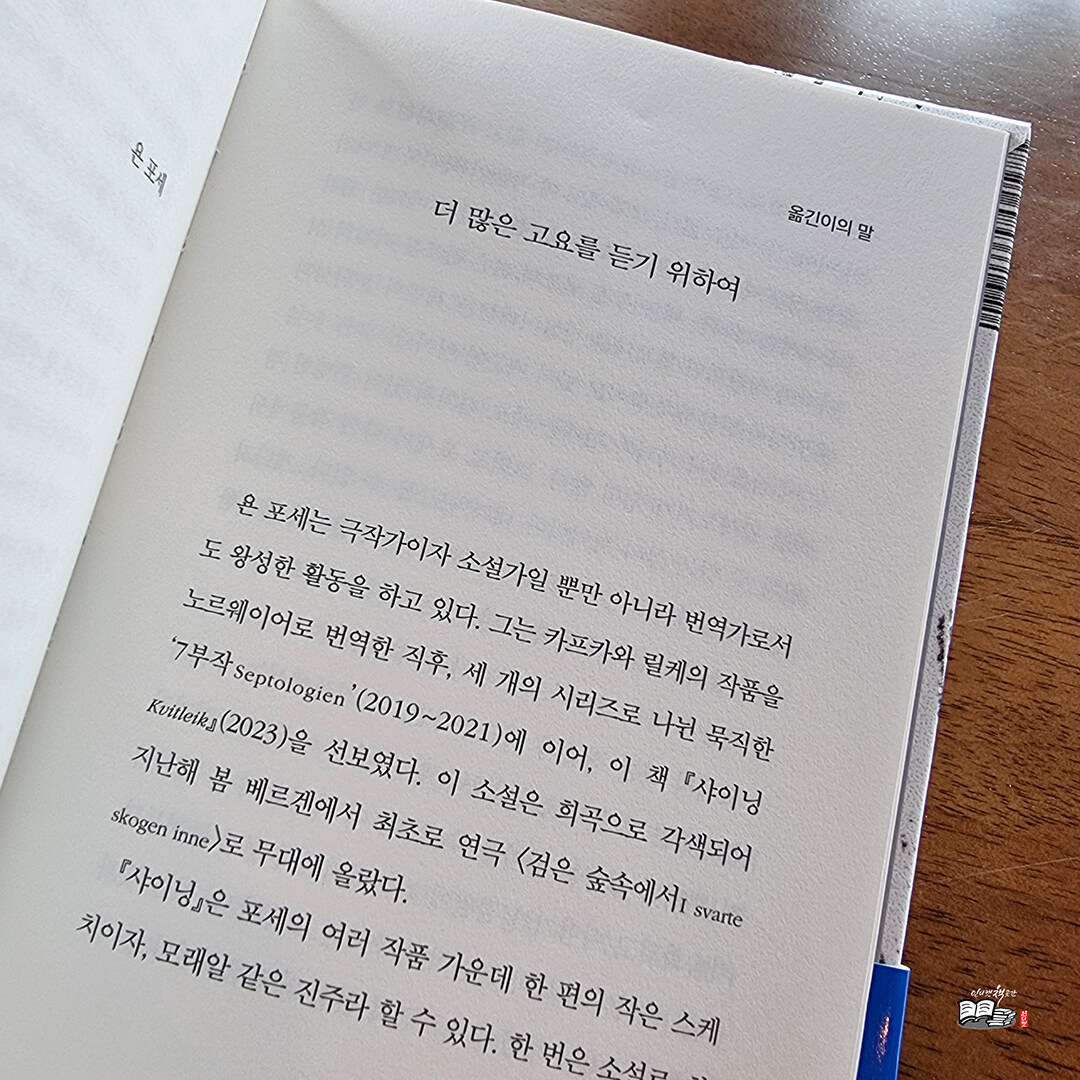
소설의 중반을 지날 때쯤이면 혹시... 하는 낌새가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한편으론 결말까지 와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둥둥 떠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얼른 해설을 펼쳐봅니다.
해설을 읽으며 내가 이 소설의 포인트를 놓치진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긴가민가 싶었던 장면들이 불쑥 튀어나오며 결국 다시 한번 소설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읽은 <샤이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쓰고 싶었다고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연설문에서 고백한 욘 포세의 특징이 잘 드러난 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침묵의 발화에 말글을 내주고 싶습니다.”라고 한 욘 포세 작가. <샤이닝>은 침묵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샤이닝>은 물음표가 없습니다. 질문형의 문장에도요. 왜냐하면 이 글은 명상이자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샤이닝>을 각색한 희곡 <검은 숲속에서>가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묘사하는 방식이 독백극으로 꽤나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침묵이 독자에게 다가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욘 포세 작가의 문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n차 독서를 할수록 <샤이닝>의 숨은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