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가 흐르는 곳에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 황금가지 / 2021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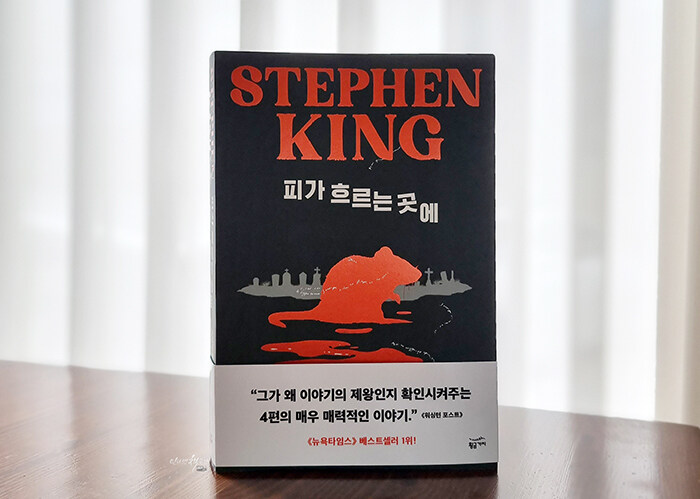
오싹 스릴감 넘치는 초자연 미스터리 공포와 힐링의 빛이 온몸을 휘감는듯한 따스함까지, 스티븐 킹 작가의 팔색조 매력이 담긴 소설 네 편을 만날 수 있는 <피가 흐르는 곳에>.
묘지에서 전화벨이 울린다는 설정의 <해리건 씨의 전화기>. 스티븐 킹이 어린 시절에 했던 상상이라는데 정말 기막히게 뽑아냈습니다. 한때 통신사, 영화관을 소유했던 갑부 해리스 씨가 은퇴 후 이제는 노트북도 TV도 없이 지냅니다. 해리스 씨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하며 푼돈을 받는 '나'는 그가 보내준 즉석복권이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고, 아이폰을 선물합니다. 새로운 여행길에 나선 노년의 탐험가처럼 신문명을 맛본 해리스 씨.
왜 신문기사와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없는지 해리스 씨는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곧 내 이메일 주소가 돌아다니고 내가 뭘 검색하는지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세상이 올지 그 본질을 간파하는 예리함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1세대 아이폰 시절의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신기했어요.
무던한 성장소설처럼 흘러가던 소설은 해리슨 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미스터리하게 전개됩니다. 해리슨 씨의 장례식에서 그의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어둔 '나'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해리슨 씨의 번호로 기이한 문자가 옵니다. 게다가 몇 년이 지나도 배터리가 꺼지지 않고 연결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후 기이한 사건들은 솔직히 상상만으로도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막 고마웠어요, 척!으로 시작해 2막 길거리 공연, 1막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설정으로 진행하는 <척의 일생>. 인터넷도 끊기고 전기도 곧 끊기면서 종말을 앞둔듯한 세상. 그런데 온갖 광고판에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이라는 구절과 함께 손등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가진 남자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대체 누구길래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걸까요. 세계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스티븐 킹이 척을 주인공으로 두 편의 단편 3막과 2막을 먼저 쓰고 나서 1년 후 이 모든 걸 하나의 내러티브로 묶는 세 번째 이야기 1막을 썼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소설의 결말이 의미하는 바가 안개처럼 뿌옇긴 하지만, 라라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와 설정이 마음에 들어 스티븐 킹 소설 중 잊지 못할 소설로 자리 잡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온 세상이 무너진다고 본다. 그 사람이 알았고 믿어온 세상이." - 척의 일생
스티븐 킹의 첫 탐정소설 <메르세데스> 3부작에 단역으로 등장했던 홀리 기브니는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후 <아웃사이더>에도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홀리를 주인공으로 한 경장편 소설의 탄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작 <아웃사이더>에서 이방인이라 지칭했던 미지의 괴물이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더 우리 주변에 파고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재난이 닥친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해 특종을 보도하는 기자로 말이죠. 생존자와 유족의 고통, 상심, 두려움, 슬픔을 먹는 그것. 사람의 감정을 먹는다는 설정이 흡혈귀를 떠올리게 합니다. '피가 흐르는 곳에 특종이 있다'는 뉴스업계의 오랜 정설이 초자연 미스터리와 접목되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싶어 놀라웠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 얼굴을 바꿔가며 기자 행세를 하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동안은 특별히 해로울 게 없는 존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대학살을 직접 유도합니다. 홀리 기브니의 편집증적 의심이 발휘되면서 그것의 정체를 쫓는 홀리. 이번에도 홀리식 희망은 이뤄질까요.
<아웃사이더>에서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이방인의 정체가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와닿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려는 스티븐 킹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유독 조회수 높은 비극 사건 영상처럼 호기심처럼 비극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 말이지요.
마지막 단편소설 <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가라는 소재가 흥미롭습니다. 창작의 고뇌를 이토록 오싹하게 다루다니요. 읽다 보면 신경과민 노이로제에 걸리는 기분입니다. 매번 장편을 쓰지 못하고 단편만 써온 소설가 드류는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장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거의 받아쓰기에 가깝다고 장담할 만큼 플롯이 탄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몇 주 정도 숲속 통나무집에 머물며 집필하기로 합니다.
처음엔 술술 잘 풀렸지만 이내 독감 증상을 보이며 해롱대는 드류. 폭풍까지 들이닥쳐 떠나지도 못한 채 비몽사몽합니다. 폭풍으로 난장판이 된 창고에서 죽어가던 쥐를 발견한 드류는 집안 난로 앞에 두고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세상에, 쥐가 말을 하네요. 게다가 보은하는 쥐인가요? 소원을 들어주겠답니다. 하지만 소원에는 언제나 대가가 필요하죠.
스티븐 킹도 드류처럼 창작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럴 때면 원고를 끝내고 싶다는 소원을 지니가 이뤄주는 동화 같은 꿈을 꿀까요. 대가도 감내할 만큼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쥐>까지,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과 꿈을 다룬 소설 네 편은 스티븐 킹 특유의 호러 미스터리가 강약 자유자재로 깔리면서 '역시 킹옹'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력을 듬뿍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