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죽음을 배우다
리디아 더그데일 지음, 김한슬기 옮김 / 현대지성 / 2021년 6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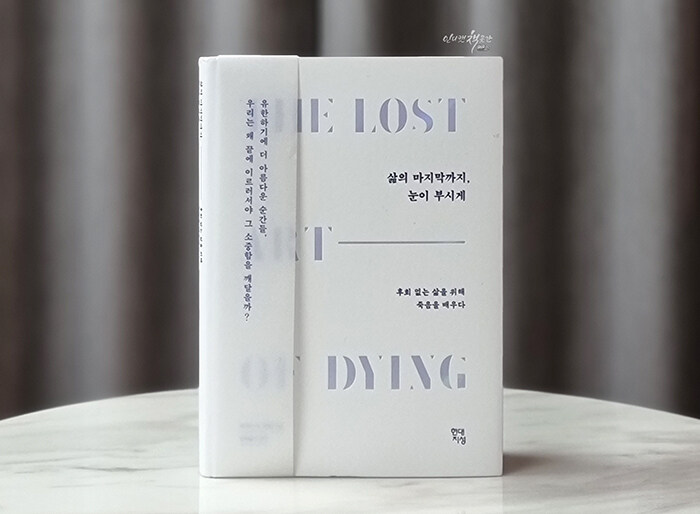
컬럼비아대학교 의과 대학 임상 의료 윤리센터 소장이자 의과 대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리디아 더그데일이 의사로 근무하며 목격한 형편없는 죽음.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책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나는 후회한다. 그때 왜 터너 씨를 살렸을까." 첫 문장부터 강렬합니다. 무슨 일이길래 의사로서 한 사람을 살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암 병동의 코드블루 상황에서 만난 터너 씨. 이미 심장이 멈춘 터너 씨를 간신히 살려냅니다. 심폐소생 과정에서 약해져있던 갈비뼈는 이미 부러졌습니다. 다시 심장이 멈출 경우 심폐소생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족들. 그날 밤에만 두 번의 심폐소생을 했던 터너 씨는 연이어 세 번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느라 생명이 지닌 유한성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가 환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어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도 암을 치료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적극적인 생명 유지를 선택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잘 죽는 데 실패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환자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온 상품처럼 취급된다." - 책 속에서
의학계 효율도 공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컨베이어 벨트일 뿐이라는 걸 짚어줍니다. 죽음을 피하고 미루려는 노력은 무조건 옳을까.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는 환자가 현명하게 죽을 기회를 빼앗는 현대 의료 시스템을 화두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500년 전 중세 유럽의 라틴어 소책자 『아르스 모리엔디』(죽음의 기술)에서 실마리를 얻습니다. 흑사병 한가운데서 태어난 책입니다. 좋은 죽음과 좋은 삶에 대한 실용적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흑사병의 참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한 이 책 덕분에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관련 책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잘 죽는 법에 대해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20세기 이후 멈췄습니다. 잘 죽을 방법을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20세기부터는 '삶의 기술'이 대신합니다. 죽음을 외면한 거죠.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획기적인 의학 발전으로 죽음을 뺀 나머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인은 제대로 죽는 법을 모른다." - 책 속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피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는 잘 죽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과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죽음을 일깨우는 '메멘토 모리'의 대표 사례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낸 정물화 바니타스 회화입니다. 보통 해골, 모래시계, 튤립 같은 물건이 등장하지요.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외로운 죽음을 피하려면 공동체의 중요성도 인지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공동체를 형성할 순 없습니다. 사는 동안 꾸준히 건강한 관계를 맺어둬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완화 치료에는 아르스 모리엔디가 제안하는 조언과 비슷한 것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할게, 용서해 줘, 고마워, 사랑해, 안녕."이라는 말이 가진 힘은 관계를 바로잡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자는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의학공동체로 분류해 죽음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험적 치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장단점을 통해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짚어줍니다. 현대 병원이 가진 장례 의식의 문제점도 짚어주며 의미 있는 의례를 고민하게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는 병원이 아픈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급성 질환자를 위한 기관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입원치료를 포기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단순히 나이만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쇠약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합니다. 입원이 건강을 무조건 개선하지는 않음을, 헛된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판단을 내리도록 조언합니다.
매일 공동체 속에서 유한함을 인식한 채 사는 삶. 매일 삶에서 함양해나가야 할 덕목들을 짚어주는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 현실적인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지 못한 터너 씨 가족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건 곧,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목도한 의사의 목소리로 더 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