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글을 자주 만났다. 우리가 지루한 일상이라고 말하는 하루하루가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와 싸웠던 하루도, 깔깔거리며 웃었던 하루도, 함께라는 것 때문에
즐거웠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나 보다. 그 시간들을 다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들을. 지난 주말에 병원에서 엄마를 뵙고 오는데, 지난 주말 뿐만 아니라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게,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이다. 지금 같으면 함께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닐텐데, 하는.
글이든 시든 읽고 있는 그 시기의 감정에 따라 북받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건조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 내가 이 글들을 읽는 때는 회한의 감정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시간을 자주 기억하는 때가 많은데, 아마도 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나 보다. 내가 살아왔던 젊은 날, 다시 갈 수 없기에 애틋하고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물론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이는 건 당연하다. 삶의 한 자락에 마음을 적시는 시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다시 나를 찾는 일이었다.
영시는 주로 학교다닐 때 많이 읽었고, 세계문학전집에 따로 수록되어 있는 시집들을 주로 읽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 S. 엘리엇, 롱펠로우, 엘리자베스 배릿 브라우닝, 로버트 브라우닝, 에밀리 디킨슨,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애드거
앨런 포 등의 시인들. 이름만 들어도 친근할 정도다. 아마 이 시인들의 이름이 친근하게 여겨지는 건 나 뿐만이 아닐테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고, 여전히 읽히는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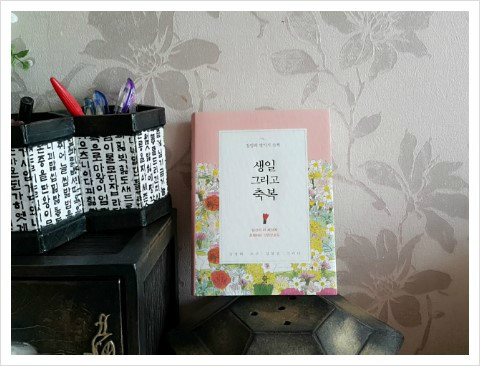
The Waste
Land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만 유지했으니.
(T. S. 엘리엇 「황무지」)
4월하면 잔인한 달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너무도 유명한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다.433행에
달하는 장시의 시작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곧 4월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가장
아름다운 달인 4월을 기다리는 마음이 크다. 봄꽃을 많이 키우는 달이기 때문일까. 그 어느 달보다 4월을 기다리게 된다. 엘리엇이 잔인한 달이라
일컬었어도 아름답기만 한 달인 걸.

사진에서처럼 이 시집은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생일』과 『축복』의 합본이다. 장영희 작가가
조선일보에 기고 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시집으로, 화가 김점선이 그림을 그려 시집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었다. 시 한 편에 작가의 짧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영시들을 고르고 그때의 마음을 짧게 표현한 글들인데, 다른 산문들처럼 작가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글들이었다. W. H.
데이비스의 「여유」 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파란 하늘 한 번 쳐다보는 여유, 투명한 햇살 속에 반짝이는
별꽃 한 번 바라보는 여유, 작지만 큰 여유입니다.' 라고 했다.
삶을 거대한 그림 퍼즐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메워가는 일입니다. 무슨 그림이든 붓 터치 한 번으로 대작을 그릴 수는 없지요. 하루에 조금씩, 작으면 작은 대로의
예쁜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오늘이라는 내 인생의 한 조각을 예쁘게 칠하면 그 그림은 작지만 나름대로 완벽할 수
있으니까요. (311페이지)
장애를 가진 작가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작가였다. 작가가 가고 없는
지금 그가 추린 시를 읽고 있노라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고심해서 골랐을 시들과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한 줌의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을
그 마음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읽었던 시들은 마음의 자양분이 된다. 더불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하나의 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이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단다.
변화하는
것들 사이를 지난 실. 하지만 그 실은 변치
않는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
한다.
(중략)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너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도 고통 받고
늙어간다.
네가 무얼 해도 시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실을 꼭 잡고 놓지 말아라.
(윌리엄 스태퍼드)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이
아닐까. 삶이 힘들어 누구에게 손 내밀고 싶을 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어느새 외롭고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그림과 함께 글과 그림에 시선이 머물게 된다. 묻혀 두었던 감성을 깨우는 일, 시를 읽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