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절은 노래하듯이
오하나 지음 / 창비 / 2022년 4월
평점 :




동화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노래!
2021년 1월 소한부터 2021년 12월 동지까지 꼬박 일 년 동안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모은 푸르고 고운 것들을 글로 꿰어 전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며 일으키는 계절과 바람의 리듬에 맞춰서 세세하게 움직이는 만물의 순간을 포착하며 제가 얻은 건 밝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연이 늘 환하고 다정해서가 아니라 때론 매섭고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가차없더라도 모든 순간이 진실한 데 있는 듯합니다. 「작가의 말」, 214~215쪽
『계절은 노래하듯이』는 음악 하는 남편, 반려견 보현, 귤 나무와 함께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 시인 오하나가 1년 24절기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절기에 맞춰 농사일을 했다. 그녀 역시 절기에 맞춰 귤 나무를 가꾸고 계절을 보내고 있다.
강병수 할아버지의 성탄 카드로 시작하는 이 책. 그 성탄 카드 덕분에 나는 음악 하는 남편과 시인 오하나의 정체를 단숨에 눈치챌 수 있었다. 일부러 감춘 것인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체를 알고 나자 이 책을 읽는 내내 나긋나긋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다. 심지어 책 속 남편의 목소리는 음성지원까지 되는듯했다. 아마도 나처럼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까 봐 드러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나처럼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의 음악과, 그녀의 글과 꼭 닮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동화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농사일에 동화 같은 에피소드가 있을 수는 없는데, 자연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녀는 귤 나무를 귤 선생이라 불렀고, 농사일을 귤 선생의 수업이라 말했다. 절기 소설(小雪)에 쓴 「소설」은 그 자체가 한 편의 동화였다.
다가올 일 년이라는 빈 노트를 나는 무엇으로 채울까.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보는 일. 바람을 타고 여행 중인 씨앗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일.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늘의 색과 구름 모양, 바람의 냄새를 눈치채는 일. 새를 바라보는 일. 나무와 함께 흔들리는 일. 감추어져 있지 않으나 작고 가만해서 지나치기도, 없다고 착각하기도 쉬운 것에, 하지만 각자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높고 위대하게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그들과 둘도 없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일. 그런 일들로 채워진 노트는 훗날 나 자신에게 살아갈 힘으로 반드시 되돌아오리라. 17쪽
나는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즈음에 태어났다. 내가 유일하게 챙기고 있는 절기인데, 일 년 동안 나는 이 계절을 얼마나 다채롭게 채우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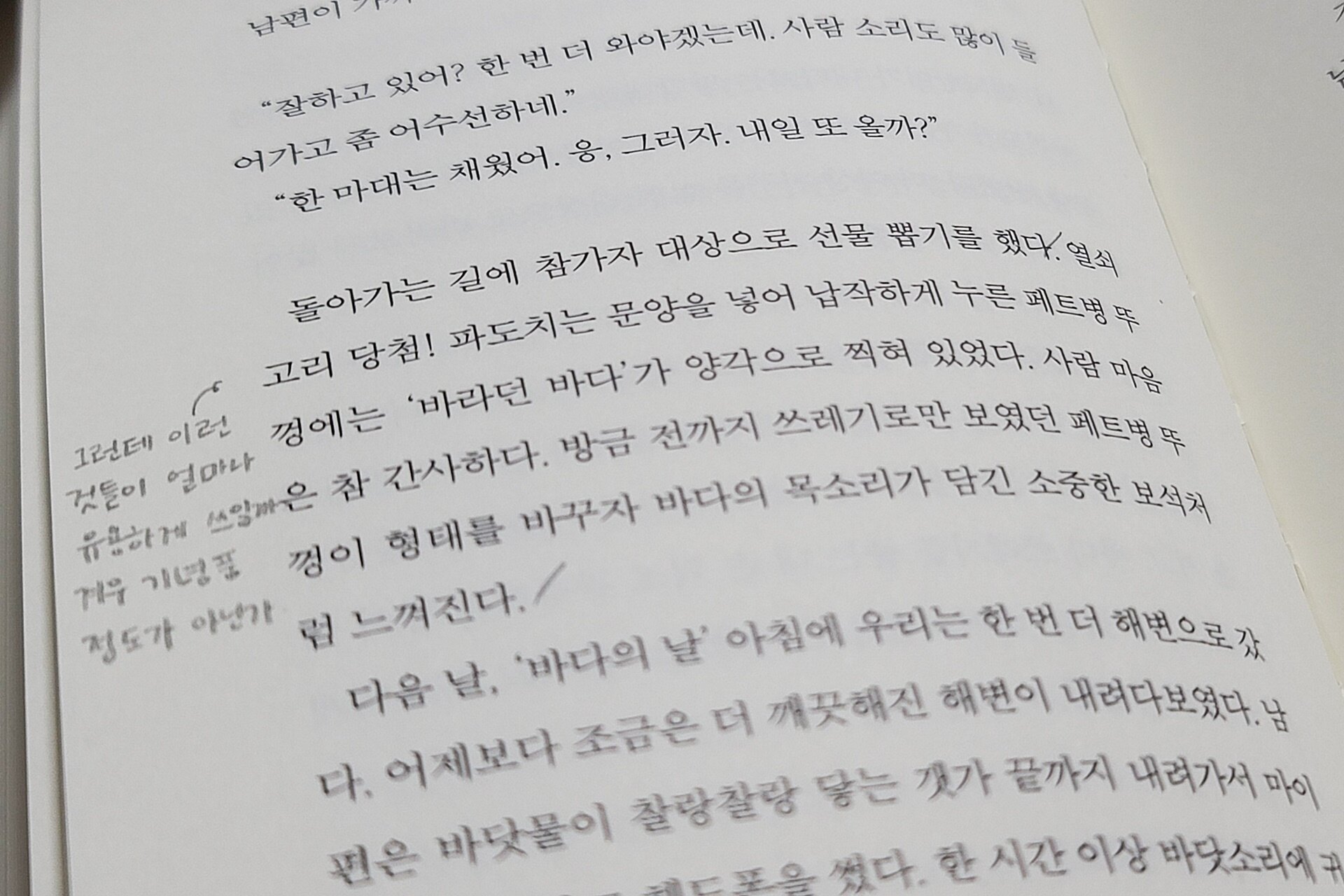
덧. 이렇게 리사이클링 된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게 될까? 겨우 기념품 정도인데,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리사이클링한 의미가 있을까.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분명 페트병 뚜껑에 무언가 더해진 것이 있을텐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나란 사람의 빈틈을 누군가가 감싸주며 받아들인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나는 전보다 겸허한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이의 모자람과 불완전함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나아가 세상 사는, 누군가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여 지탱되고 잇는지도 모르겠다. 21쪽
남편은 이 무렵에 태어났다. 그래서일까, 남편은 밤과 낮을 절반씩(어쩌면 밤을 조금 더) 품고 있는 사람 같다. 감성적이면서 이성적이고, 늘 꿈꾸면서 현실감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무모한 사랑을 신중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준 이도 남편이다. 56쪽
몸으로 삶의 춤을 추던 시간을 글로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글로 써보지 않으면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삶의 진실 또는 의미라는 게 있는 듯하다. 89쪽
사랑하는 자연과 한데 뒤섞여 살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서 자연을 배려하고 위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물으면 생각보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정도? 손수건과 텀블러,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는 정도일까? 그마저도 바쁘면 잊고 만다. 92쪽
내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지금 여기 있든 앞으로 사라지든 상관없이, 세상은 늘 모든 존재에게 활짝 열려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이어간다고. 이런 생각이 오늘따라 내게 안식을 줬다. 133쪽
예전엔 어른이 되는 일이 더 강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나약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새로운 어둠을, 절망을 알게 되는 과정. 153~1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