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지스 형제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7년 11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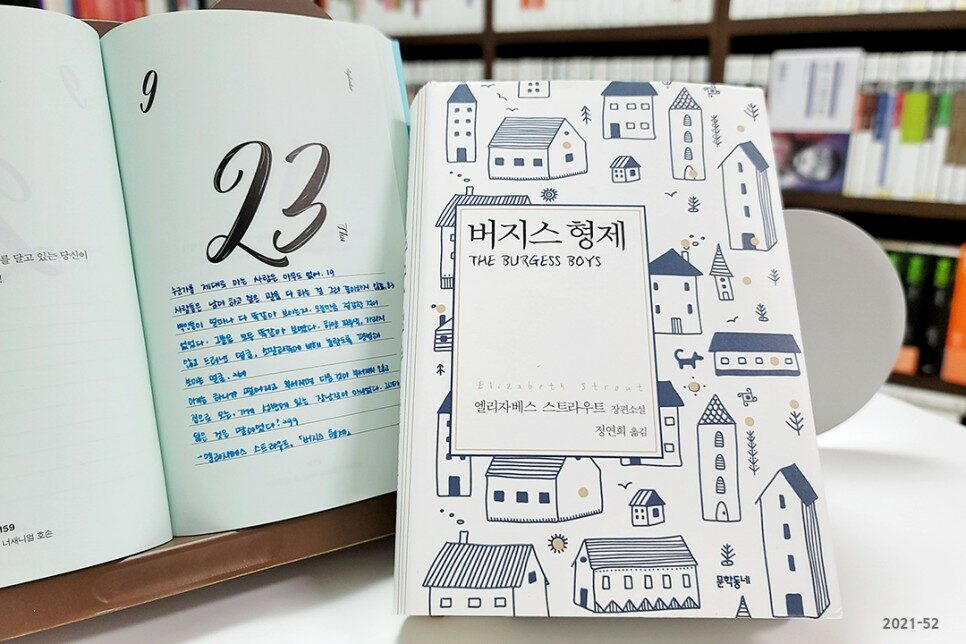
이토록 공감되게 '인생'을 그려내는 작가라니!
최근에 '인생 작가'가 생겼다. 요즘 내가 가장 애정 하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다. 소설 한 권을 읽고 흠뻑 빠져버려서 멈출 수가 없었고, 『버지스 형제』를 마지막으로 결국 그녀의 모든 작품을 읽고 말았다. 여러 권을 읽다 보면 어딘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그녀의 작품은 모두 좋았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루시 바턴과 그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엄마와 나는 버지스네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다."(9쪽) 그 이야기들이 유일하게 엄마와 나를 연결해 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었으니까.
버지스네 아이들은 모두 셋이다.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된 큰아들 짐과 한때 형사 전문 변호사였던 밥, 그리고 그의 쌍둥이 여동생 수전. 그들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 밥이 4살 때 자동차 기어를 만지며 놀다가 차가 굴러가 자기 아버지를 치여 죽게 했고, 밥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밥은 형처럼 성공한 삶(흔히 정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로는 술을 벗 삼아 살고 있는데, 그나마 가까이 형과 형수가 있어서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때 수전의 아들 재커리(잭)가 메인 주에 정착한 난민 소말리족을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저질러 고향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수전은 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미 휴가 계획이 잡혀 있던 존 대신 밥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밥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잭의 웃는 얼굴이 신문 1면에 나오게 만들었다. 심지어 소말리족 여자를 차로 칠 뻔해서 짐의 차를 메인 주에 두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짐은 이런 밥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다. 왜냐하면 짐은 메인 주를 빛낸 인물이었고, 장차 정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더 크게 거론되게 만든 것이다.
짐은 난민과 관련된 평화 집회에서 자신이 연설을 하면 잭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밥과 함께 메인 주로 간다. 오히려 그 연설 때문에 잭의 사건은 더 꼬여버리고, 심지어 잭이 집을 나가버린다. 잭이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잭이 전화를 걸었던 사람도 짐이었지만 짐은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자괴감에 빠진 짐은 밥에게 고백한다. 사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8살이었던 자신이라고. 아마도 짐은 그 사건 때문에 평생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살았던 것이고, 자신 때문에 또한 명의 가족이 사라지자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늘 형과 함께 했던 밥은 형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해버린다. 심지어 형과 형수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버지스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것"(439쪽) 이었다.
이때 짐에게 성희롱 고소 협박 사건이 발생해 직장을 잃고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된다. 짐은 예전의 짐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시골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짐의 소식을 들은 밥이 짐을 데리러 간다. 짐과 밥은 메인으로 돌아간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곳이 고향이니까.
이쯤 되면 제목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왜 제목이 '버지스 남매들'이 아니라 『버지스 형제』인 걸까? 사실 수전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어머니는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고, 언제나 수전에게만 화를 냈다. 그래서 수전은 아버지를 죽인 것이 밥이 아니라 자신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다. 두 형제는 뉴욕에 살지만 여전히 고향에 머물러 있는 수전, 그녀는 형제로부터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심지어 수전은 난민이 된 소말리아인들 보다 더 외로웠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며 돕고 있다는 걸 내세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지인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친구들은 늘 서로에게 관심 있는 척했고, 그게 사회가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321쪽
어떻게 보면 밥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밥에게는 몇 초 만에 타인의 작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밥에게서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혼한 전 부인(심지어 재혼해서 생긴 아이들에게까지)까지 스스럼없이 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정도다. 어떻게 보면 짐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밥이 있어서 이 가족들이 여전히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 내내 서로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주인공들이 가족애를 나누며 훈훈하게 끝나서 흡족스러웠던 소설이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그려내는 '세상'은 소소하고 잔잔하다. 가끔씩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이웃의 이야기니까. 뉴스 속에서나 볼법한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작가. 그래서 '인생 작가'가 되었다. 이토록 공감되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또 있을까. 그녀의 작품이 겨우 여섯 권뿐이라니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