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반 일리치의 죽음 ㅣ 펭귄클래식 28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박은정 옮김, 앤서니 브릭스 서문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09년 3월
평점 :

절판

삶과 죽음은 상치되는 걸까. 인류 고전사(사상사)를 새로 쓴 위대한 사색가들은 삶과 죽음이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것임을 일갈해왔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출구에서 볼 때 너무 짧다"라고 했고 헤르만 헤세는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 걸어야 한다"라고 했다. 부처는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삶의 종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게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 삶을 강렬히 추구함으로써 죽음에 도달하며 결국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사에서 삶과 죽음을 치열하게 성찰한 작가가 있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천착했다. 그의 모든 작품이 이 테마를 관통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삶의 예찬보다 죽음의 성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톨스토이 문학의 특징이다. 장편만을 보자면 『전쟁과 평화』는 삶을 긍정하는 웅대한 걸작이며 『안나 카레니나』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천착한 예술작품이다. 『부활』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고뇌하는 후기 톨스토이의 원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기차역에서 객사한 그의 죽음 또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이색적인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 죽음을 다룬 가장 탁월한 작품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인생 후반부에 쓴 짤막한 분량의 중편소설이다. 병상과 죽음에 관한 소설로는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독자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몰입력을 선사하는데 일단 첫 장을 넘기면 도중에 정지할 수가 없다. 한달음에 달려 소설 말미에 도착한다. 소설의 3인칭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한 인간의 죽어가는 과정을 고요하면서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소설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부패한 러시아 관료사회에서 승진과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판사이다.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고 그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으며 상류층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결혼하였다. 남부러울 것 없이 뭐든 착착 해내는 인물이었기에 별다른 걱정과 근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찾아든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간다. 육체적 질고에 의한 극심한 고통은 그답지 않은 고성과 울부짖음을 통해 밖으로 표출된다. 가족들은 경악한다. 그는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진정 즐거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은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덧없고 의심스러웠으며 하루 살면 하루 더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를 추적해가는 주인공 자신의 독백과 이를 묘사하는 작가의 3인칭 서술이 압권이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의 죽음이 자신과 다른 동료들의 승진이나 인사 발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산하느라 바쁘다. 동료의 죽음에 겸허히 슬퍼하기보다 어떤 득실이 있을지를 먼저 챙기는 그들의 세속적인 모습이 악랄해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내재된 인간 본성의 진실한 민낯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악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소설 속 인물 중 주인공의 하인과 어린 아들은 선한 영혼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두 명만이 올바른 영혼의 소유자인 점은 이채롭다. 인간 됨의 본질과 원형은 부와 지위와는 무관한 것임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은 결말을 먼저 알려준 뒤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목에서부터 결론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반전이 있을 리 없고 이야기의 뒤틀림이나 전환도 없다. 한 남자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뻔한 내용이고 결론으로서도 역시 뻔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중편 분량으로 몰입감 있게 풀어낸다는 게 놀랍다.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읽을수록 감탄스럽다. 책의 막장을 덮었을 때는 가슴속에 무언가의 싱숭생숭함이 남을 정도다. 가장 큰 여운은 나와 죽음 사이의 간극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아니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며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 과연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심정은 어떤 색깔일까. 여러 사유가 샘솟는다. 불변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다.
독자마다 이 소설에 대한 감상은 가지각색이다. 혹자는 이 소설에 대해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라 톨스토이가 후세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이반 일리치는 초반에 출세욕만 가득 찬 인물로 그려지지만 병마와 씨름하면서 점차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과거의 삶이 더 선하고 아름다웠음을 깨닫는다. 그가 되새기는 유년의 빛나는 기억은 찬란하다.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산 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신의 존재에 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병세가 깊어지며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치렀음에도 자신의 현재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의 코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회한다. 죽음의 직면에서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객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인간 유한성의 처연한 한계를 엿본다. 삶이란 그저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일깨우는 것이다.
해외문학은 항시 번역의 문제에 봉착한다. 시중에 여러 번역본이 나와 있다. 어느 출판사 어떤 역자도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서점에서 대략 대여섯 개의 번역본을 훑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읽혔다. 톨스토이의 중·단편은 서사의 힘이 강하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번역의 변수를 뚫는 힘이 있다. 번역의 질에 따라 작품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대개 중·단편은 여러 작품이 함께 실리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함께 실린 소설이 다르긴 하지만 번역 자체가 문제 될 만한 번역본은 찾지 못했다. 중고서점에서 눈에 띄는 것 아무거나 골라잡아도 죽음에 관한 톨스토이의 혜안을 느끼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톨스토이의 웅장한 장편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없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비록 120쪽 남짓한 작은 분량이지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여느 장편에서도 느끼기 힘든 삶과 죽음에 관한 걸쭉한 사유가 담겨 있다.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독백(3인칭 서술)만으로 이렇게 웅숭깊고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역시 톨스토이다. 이 소설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고 삶이 무료할 때마다 꺼내 읽어야 하는 작품이다. 죽음의 과정을 다룬 듯 보이지만 실상 삶의 희망을 맹렬히 추적한 소설이다. 고전에도 품격이 있다. 아직 안 읽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구독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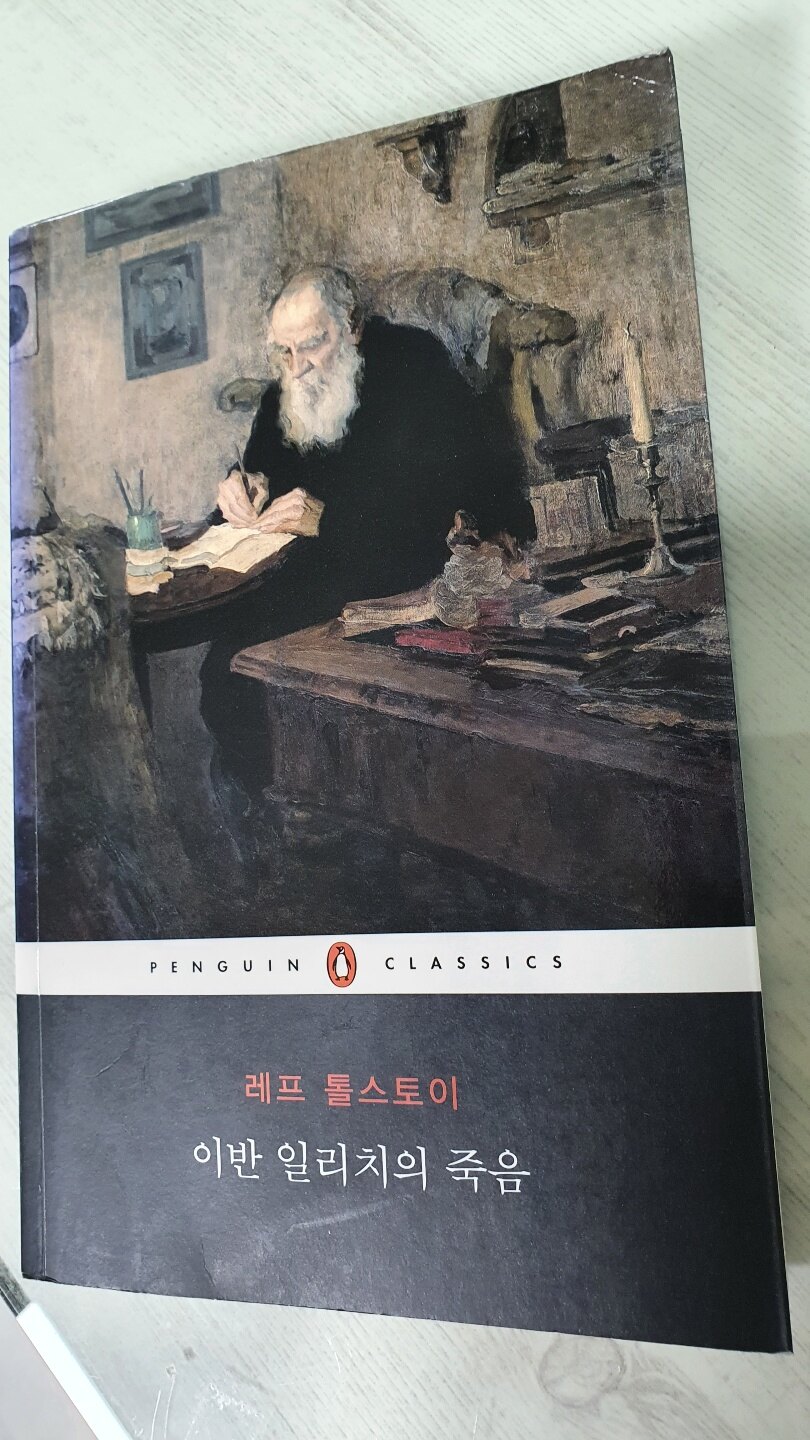
http://blog.naver.com/gil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