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가스 요사의 <나쁜 소녀의 짖궂음>은 유쾌하다. 남미 작가들의 글은 비극이면서 희극이고, 신화적이면서 현세적이다. 신화적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훌쩍 넘어서는 비의적인 것이 두드러진다는 것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은 욕망의 질서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매혹의 대상이었던 여인을 평생 사랑했던 한 남자와 그 남자를 둘러싼 여인의 행장기. 여자는 기다리는 존재이고, 남자는 방랑자라는 롤랑 바르트의 고전적 정의를 뒤집어 여자는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남자 주변을 맴돌고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흠모하며 떠나지 못한다. 요사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되, 지리멸렬으로 사랑했던 소설가임이 분명하다. 하기야, 남미 소설가 놈들치고 그렇지 않은 놈들이 어디 있으랴. 창녀촌 다락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썼던 마르께스부터가 그런 놈이었으니. 때로 우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돈다. 그 세계 밖은 없다.
바르가스 요사의 <나쁜 소녀의 짖궂음>은 유쾌하다. 남미 작가들의 글은 비극이면서 희극이고, 신화적이면서 현세적이다. 신화적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훌쩍 넘어서는 비의적인 것이 두드러진다는 것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은 욕망의 질서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매혹의 대상이었던 여인을 평생 사랑했던 한 남자와 그 남자를 둘러싼 여인의 행장기. 여자는 기다리는 존재이고, 남자는 방랑자라는 롤랑 바르트의 고전적 정의를 뒤집어 여자는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남자 주변을 맴돌고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흠모하며 떠나지 못한다. 요사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되, 지리멸렬으로 사랑했던 소설가임이 분명하다. 하기야, 남미 소설가 놈들치고 그렇지 않은 놈들이 어디 있으랴. 창녀촌 다락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썼던 마르께스부터가 그런 놈이었으니. 때로 우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돈다. 그 세계 밖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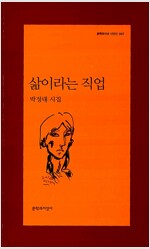 아사다 지로의 <저녁놀 천사>는 그의 다른 단편들과 유사한 에피소드들로 묶인 소설집이다. 그의 소설은 사람 사는 꼬락서니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죄다 비스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면 아프고, 즐거우면 즐겁고, 눈물나면 눈물나고, 사랑하면 사랑스럽다. 우울한 날이면 나는 만화책을 보듯이 아사다 지로의 소설을 읽는다. 한때의 박완서가 나에게 그러했고, 한때는 스탕달이 그러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 출판사들이 아사다 지로 소설을 앞다투어 번역출간해 내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아사다 지로 때문에 나는 일본어를 배울 생각을 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만화책 수준의 아사다 지로에 그냥 만족하련다.
아사다 지로의 <저녁놀 천사>는 그의 다른 단편들과 유사한 에피소드들로 묶인 소설집이다. 그의 소설은 사람 사는 꼬락서니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죄다 비스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면 아프고, 즐거우면 즐겁고, 눈물나면 눈물나고, 사랑하면 사랑스럽다. 우울한 날이면 나는 만화책을 보듯이 아사다 지로의 소설을 읽는다. 한때의 박완서가 나에게 그러했고, 한때는 스탕달이 그러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 출판사들이 아사다 지로 소설을 앞다투어 번역출간해 내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아사다 지로 때문에 나는 일본어를 배울 생각을 했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만화책 수준의 아사다 지로에 그냥 만족하련다.
민음사의 만화책 브랜드 자회사인 세미콜론 출판사의 책을 가끔 산다. 이 동네는 주로 유럽에서 나온 만화책들을 펴내는데, 가끔 마음에 꽂히는 책들이 있다. 
 <마담 보베리>도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KTX에서의 한때를 즐겁게 해준 만화-소설책.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은 줄리안 반즈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부터 여럿 패러디 소설이 존재했는데, 만화버전은 이게 처음이 아닐까 한다. 물론, 보봐리 부인이 아니라 보베리 부인이고, 스토리도 다르다. 고전의 무게와 감동은 덜하나 비교적 장거리 여행의 경우 가방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보봐리 부인의 욕망과 성격이 입체적인데 비해 보베리의 그것은 얕고 천박하다.
<마담 보베리>도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KTX에서의 한때를 즐겁게 해준 만화-소설책.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은 줄리안 반즈의 <플로베르의 앵무새>부터 여럿 패러디 소설이 존재했는데, 만화버전은 이게 처음이 아닐까 한다. 물론, 보봐리 부인이 아니라 보베리 부인이고, 스토리도 다르다. 고전의 무게와 감동은 덜하나 비교적 장거리 여행의 경우 가방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보봐리 부인의 욕망과 성격이 입체적인데 비해 보베리의 그것은 얕고 천박하다.
박정대의 <삶이라는 직업>, 심보선의 <눈 앞에 없는 사람>, 박형준의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최승자의 <물위에 씌어진>, 
 김민정의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최근 한달 동안 사고 읽은 시집들이다. 다 읽은 것도 있고, 아직 다 못 읽은 것도 있다. 시집은 그것을 읽을 마음의 준비와 배경, 언어에 대한 매혹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읽을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아직 이 시집들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없다. 눈과 머리로는 읽어 내려가고 의미를 궁구하지만, 말해야할 무엇은 아직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쯤되니 모든 시집들이 제 몫의 경험을 뒤섞고 버무리는, 제 경험의 넓이와 깊이만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다. 일상의 모든 것이 오로지 한 점으로만 회귀하는 것, 텍스트를 텍스트로 놔두자는 것은 비평가의 몫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김민정의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최근 한달 동안 사고 읽은 시집들이다. 다 읽은 것도 있고, 아직 다 못 읽은 것도 있다. 시집은 그것을 읽을 마음의 준비와 배경, 언어에 대한 매혹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읽을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아직 이 시집들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없다. 눈과 머리로는 읽어 내려가고 의미를 궁구하지만, 말해야할 무엇은 아직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쯤되니 모든 시집들이 제 몫의 경험을 뒤섞고 버무리는, 제 경험의 넓이와 깊이만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다. 일상의 모든 것이 오로지 한 점으로만 회귀하는 것, 텍스트를 텍스트로 놔두자는 것은 비평가의 몫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