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로봇과 인간이 함께 등반하는 실험에 대한 꿈을 꾸었다. 로봇은 산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도 인간과 함께 등반하려는지 중간 중간 쉬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같은 속도로 정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건 효율이 아니라 감상이 우선인가? 일요일에 요 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참 동안 청설모를 구경했는데 그게 꿈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이게 로봇이 아니라 사실은 강아지 얘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깼다. 5월이 되었는데도 새해 결심인 '일찍 일어나기'에 실패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냥 그 결심을 버려야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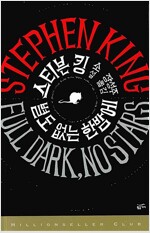

<<13.67>>은 추천하는 말에서 '일본 드라마 <파트너>가 생각나겠지만 그것보다 재미있다'고 했는데(정확한 문장은 아님), 역시 <파트너>가 생각나고 그것과 다르게 재미있었다. 추리 천재(!) 관전둬의 면면이나 그를 보는 형사들의 시선을 묘사한 대목들은 전형적이지만 사건의 짜임새가 '정성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촘촘하다. 내가 수사 드라마 팬이어서 그런지 변장/배후조종/은폐 요소는 약간 짐작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 이야기는 없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닐까. 홍콩의 역사를 날마다 적어두지 않고서는 이런 작품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회와 인간과 그것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추리물.
하늘 아래 새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스티븐 킹은 내가 이야기란 걸 난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정신 없이 몰아친다. <<별도 없는 한밤에>>는 맨앞의 소설 <1922>가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불쾌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 다음 이야기가 이 공포를 달래주리라 기대하면서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러려면 어쩌면 이번 이야기는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스스로 달래면서 읽어야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이 소설집은 작품 배열이 좋다. 불쾌하게 한다 → 무섭지만 견디게 한다 → 이상한 기분이 들게 한다 → 무섭게 한다. 그러면 나는 역시 도리가 없다. 무서워하면서 그의 책을 또 읽을 수밖에.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은 책의 체제를 이해하는데 약간 머리를 써야 했다. '스티븐 킹의 사계' 연작이 봄여름/가을겨울 두 권으로 나왔는데, 그중 봄여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책이고, 봄에 해당되는 소설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았다. 어째서 '스티븐 킹의 사계 봄-여름'을 제목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쇼생크 탈출'과 '스탠바이미'를 표지에 적기 위해서겠지. 그러고 보면 이 복잡한 체제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진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나는 30번쯤 보았다(과장이 아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라기보다, 그냥 영화로 간직하고 싶어서 일부러 소설은 읽지 않았다.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도 문제(소설은 별로네?), 영화가 못 만들어졌어도 문제(나의 30번이여...)니까. 그런데 읽고 보니 소설은 소설대로 좋고, 영화는 와! 잘 만든 거였다! 소설에서 무엇을 버리거나 바꾸고 무엇을 살려서 영화로 만들지, 아주 잘 결정된 것이었다. 함께 실린 여름편 '우등생'도 재미있게 읽었다. 밝고 건강한 웃음을 간직한 채 악을 탐하는 미국 소년이라니.
*
그러고 보니 전날에는 옛날 회사 동료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 상사에게는 깍듯하고 동료에게는 이기적이어서 싫어했던 이였는데 꿈이었으니 당연히 더했다. 상사가 그에게 전화로 귀찮은 일을 지시하는 걸 나도 뻔히 들었는데, 그는 해맑은 얼굴로 내게 일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 얼마 전에는 다시 대학에 가는 꿈도 꾸었다. 수업이 힘들어서 수강 취소하려고 컴퓨터를 찾아 온 학교를 헤맸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방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충실하게 살기'가 말만큼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사람은 왜 노력하고 살아야 하나? 꿈 없이 허송세월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많이 써버린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그래도 며칠 전에 간 삼겹살 집에서 나를 '30대 중반' 고객으로 기입해둔 것을 슬쩍 본 일은 좀 좋았다. 나 40대 초반인데.